
당번 서는 날. 새벽 5시 반에 출근을 하고 강 건너에서 있었던 일정이 저녁 9시가 돼서야 끝났다. 아이들에게는 8시 정도면 집에 갈 거라고 말해두었는데 예상외로 일이 늦어지고 있었다. "언제 오느냐", "왜 엄마는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전화에 시달리느라 배가 고픈 걸 잠시 잊고 있었다.
주차장서 운전대를 잡고서야 몰려오는 공복감. 아이들에게 저녁 9시 이후로 절대 치킨, 피자 따위 야식은 없다고 공언한 터였지만 집에 가서 밥상을 차리는 건 절대 남은 하루의 일과가 아니어야 했다.
하는 수 없다고 위안하며 신호가 걸린 틈에 재빨리 배달 앱으로 치킨을 주문하고 배달 오토바이와 거의 동시에 집에 당도했다.
아이들의 환희에 찬 표정에서 기다리던 엄마가 반가운 건지 뜻하지 않은 치킨 박스가 더 반가웠는지 대번 알아볼 수 있었다.
쿨하게 닭다리를 하나씩 양보하고 퍽퍽살과 맥주 한 캔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려는 그때.
딸이 물었다.
"엄마 회사에서 뭐 재밌는 일 있었어?"
언젠가부터 딸은 간혹 저런 질문을 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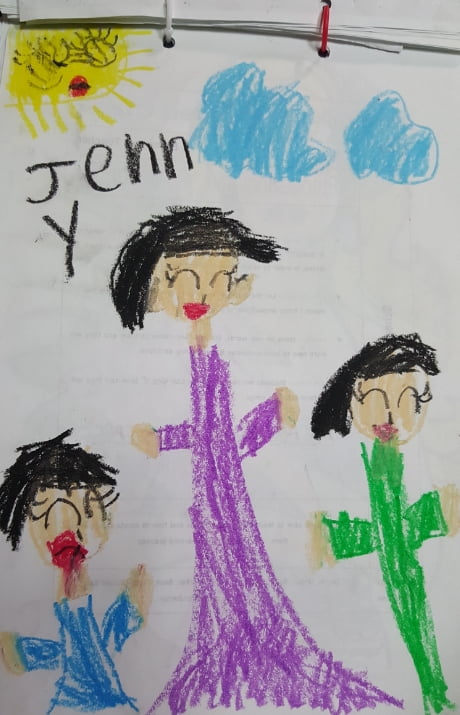
어느 육아책에서 보았던가. 아이들의 교우관계 등을 물어볼 때 심문하듯이 꼬치꼬치 "누구랑 친해? 누가 너한테 나쁜 말 한 적 있어?"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덤덤하게 "친구하고 오늘 뭐 재밌는 일 있었어?", "혹시 오늘 뭐 슬픈 일 있었어?"라고 물어야 한다는 걸 보고 그걸 따라 한답시고 몇 차례 질문했더니 어느날부턴가 그걸 역으로 내가 당하고 있다.
재밌었다고 할 만한 일이 딱히 생각나지 않아서 "오늘 졸려서 힘들었고 배가 너무 고팠고..."등등 하소연을 시작했다. 내친김에 "하...이제 나도 예전 같지가 않아. 나이 들어갈수록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너네도 엄마가 한 번 말하면 숙제도 좀 바로바로 하고 집안도 정리해 놓고 강아지 목욕도 시켜주고…"라고 잔소리 폭탄을 투하했다.
피곤을 호소하는 내 푸념이 이어지자 딸은 그만하면 됐다는 듯 뒤돌아서며 한마디 던졌다.
"괜찮아 엄마. 인생은 60부터래."
"........"
내 하소연을 쏙 들어가게 한 따끔한 딸의 한마디.
그래 위로 정말 고맙다. 이렇게 한 번 폭소를 터트리면 또 내일을 힘차게 살 힘이 충전되는 거겠지. 그래 아직 16년이나 남았으니 나는 아직 괜찮다. 정말 괜찮다 이것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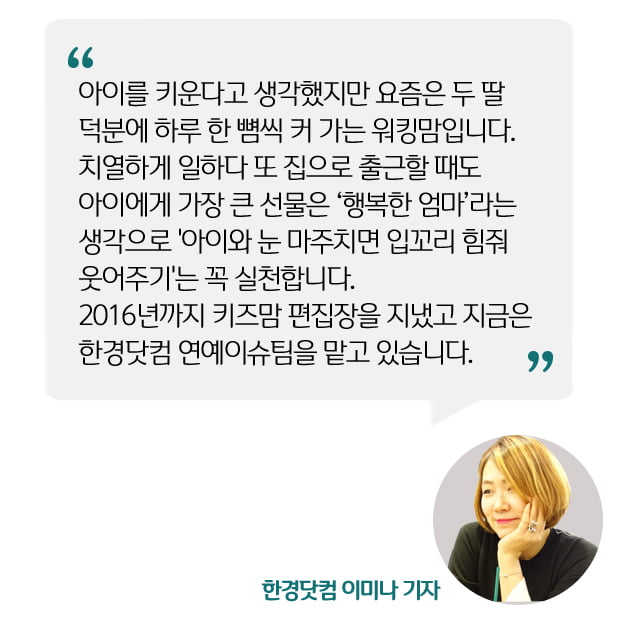
※워킹맘의 육아에세이 '못된 엄마 현실 육아'는 네이버 부모i판에도 연재되고 있습니다.
http://naver.me/GacGlVjH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