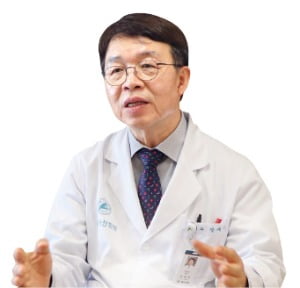 “오가노이드가 동물실험의 상당부분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겁니다. 신약 개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임상정보, 유전체 정보가 모두 포함된 오가노이드를 개발하는 게 남은 과제입니다.”
“오가노이드가 동물실험의 상당부분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겁니다. 신약 개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임상정보, 유전체 정보가 모두 포함된 오가노이드를 개발하는 게 남은 과제입니다.”세계 최초로 폐암 오가노이드 개발에 성공한 장세진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교수(사진)는 “오가노이드가 신약 개발 효율을 높이고 실험동물 사용으로 인한 윤리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했다.
오가노이드는 미니 장기다. 주로 줄기세포를 활용해 만든다. 줄기세포를 시험관에서 키워 사람의 장기 구조와 같은 조직을 구현하는 것이다. 한스 클레버 네덜란드 후브레히트연구소 교수팀이 2009년 성체 줄기세포로 장관 오가노이드를 만든 것이 시작이다. 이후 심장 위 간 피부 뇌 등을 축소한 오가노이드가 개발됐다. 사람 조직과 같은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면 신약 독성 평가 등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병에 걸린 사람에게 직접 약을 투약할 때 생기는 부작용 등도 피할 수 있다.
폐암 오가노이드는 폐암 조직을 재현한 것이다. 그동안 암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시도는 많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오가노이드를 키우는 표준법이 정상 조직을 배양하는 데 맞춰졌기 때문이다. 장 교수는 “이전에 발표된 방법은 정상조직을 수작업으로 빼내거나 특정한 약물을 첨가하는 방식”이라며 “암 오가노이드를 키우는 데 최적화된 성장인자 조합을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폐암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면 환자 맞춤형 치료제를 찾을 수 있다. 동물실험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쓰인 실험용 동물은 220만1748마리에 이른다. 그는 “실험용 동물 한 마리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라며 “맞춤 치료제를 찾으려면 환자의 암세포로 동물 모델을 여러 마리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오가노이드와 바이오칩을 활용하면 여러 약물 효과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장 교수는 살아있는 세포를 보관하는 라이브바이오뱅크도 구축했다. 대장암 간암 폐암 위암 세포를 보관한다. 그는 “기존 바이오뱅크는 암 환자 등의 남은 조직이나 혈액을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수준”이라며 “살아있는 조직을 보관하면 나중에 암이 재발했을 때 약물 테스트 등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환자가 기증한 조직으로 맞춤형 항암물질을 찾아도 실제 환자 치료에 활용할 수 없는 점은 한계다. 생명윤리법 등에 막혀 바이오뱅크에 보관하는 환자 샘플은 개인정보를 모두 지워야 하기 때문이다. 장 교수는 “병원 안에서 진료와 연계해 발생하는 임상 연구 등에는 환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