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많은 이들이 하는 말이다. 역사학자들은 ‘역사에 가정은 불필요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가정(What if)’이 없다면 역사는 박제물일 뿐,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신라가 주도한 이른바 삼국통일은 불완전했지만 의미가 크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후 전개된 역사를 살펴볼 때 고구려가 민족통일을 했다면 더 긍정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고구려에 대패한 당태종은 648년에 죽고, ‘고구려 멸망’이라는 숙명적인 중국의 과제는 고종이 이어받아 659년까지 산발적인 전투를 벌였다. 660년 음력 7월 초,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군대와 1900여 척의 함선(삼국유사)이 산동반도의 성산항을 출항했다. 서해를 횡단한 수군은 덕물도(지금의 덕적도)에서 대기하던 신라 함대 100척과 합류한 뒤 백제의 경기만과 당진·홍성·군산 등 해안에 상륙했다. 주력군은 금강하구 전투를 끝내고 수륙양면군으로 수도 사비성 공략을 시도했다. 이 무렵 5000명의 결사대를 지휘한 계백 장군은 나당 상륙군과 협공하려는 김유신의 5만 군대를 저지하다가 황산벌에서 산화했다. 백강과 탄현 방어를 간언한 성충과 흥수라는 전문가를 배척한 의자왕은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해보고 항복했다.
백제에선 바로 저항군이 결성돼 나당 연합군과 전투를 벌였고, 왜국에 도움을 청했다. 왜국은 정세 판단의 미숙과 해전 능력 부족 때문에 파병이 더뎠다. 일본 천황(이하 역사서 명칭에 따름)이 661년 2월 규슈 북부에 도착해 임시관청을 설치하다 죽고, 뒤이어 아들 덴치(훗날 천황)가 8월에 군사와 무기, 식량 등을 보냈다. 9월에는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이 5000명의 군사와 함께 귀국해 백제부흥운동을 이끈다. 남부에서는 나당 연합군과 백제·왜 동맹국 간에 전투가 벌어지고, 북부와 만주에서는 당군이 거느린 다국적군과 말갈을 동원한 고구려군 간 공방전이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계속됐다. 이렇게 한민족 전체가 동아시아 질서재편 전쟁에 휘말려 들어갔다.
백제 부흥·고구려 방어…두 개의 전선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는 육지와 해양을 활용해 고구려를 남쪽과 북·서쪽에서 협공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확보했다. 반면 고구려는 돌궐, 거란 등 북방세력과 남쪽의 백제, 왜국을 하나로 묶는 공조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당나라군은 660년 12월부터 공격을 개시해 661년 1월과 4월에 수륙군으로 고구려를 침공했다. 8월에는 서해를 횡단한 수로군이 ‘위도’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대동강 방어선을 무너뜨린 뒤 평양성을 포위했다. 9월에는 설필하력 군대가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연개소문의 아들인 연남생이 정병 수만 명으로 수비하는 압록을 공격했다. 해를 넘기면서 방효태 군대가 군선으로 남포만에 상륙작전을 시도했지만, 사수(평양 근처) 전투에서 연개소문에게 전군이 괴멸당하고, 방효태는 아들 13명과 함께 전사했다. 이후 두 나라는 소강 상태를 유지했다. 당나라의 내부 문제와 국제 환경이 복잡했지만, 실제로는 백제·왜 동맹군과 상대해야 했기 때문이다.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는 육지와 해양을 활용해 고구려를 남쪽과 북·서쪽에서 협공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확보했다. 반면 고구려는 돌궐, 거란 등 북방세력과 남쪽의 백제, 왜국을 하나로 묶는 공조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당나라군은 660년 12월부터 공격을 개시해 661년 1월과 4월에 수륙군으로 고구려를 침공했다. 8월에는 서해를 횡단한 수로군이 ‘위도’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대동강 방어선을 무너뜨린 뒤 평양성을 포위했다. 9월에는 설필하력 군대가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연개소문의 아들인 연남생이 정병 수만 명으로 수비하는 압록을 공격했다. 해를 넘기면서 방효태 군대가 군선으로 남포만에 상륙작전을 시도했지만, 사수(평양 근처) 전투에서 연개소문에게 전군이 괴멸당하고, 방효태는 아들 13명과 함께 전사했다. 이후 두 나라는 소강 상태를 유지했다. 당나라의 내부 문제와 국제 환경이 복잡했지만, 실제로는 백제·왜 동맹군과 상대해야 했기 때문이다.왜국은 662년 초 무기와 식량 등을 백제 복국군(復國軍)에 보냈고, 5월에는 군선 170여 척과 많은 병사를 파견했다. 다음해인 663년에는 2만7000명의 군사를 증파했다. 백제군은 고구려와의 공조를 모색하면서 선전했으나, 전력의 한계와 연합작전의 비효율성, 내부 권력싸움 등으로 전황이 열세로 변했다.
663년 나당 연합군은 본거지인 주류성을 점령했고, 백·왜 동맹군은 웅진강 입구에 방어책을 세웠다. 8월, 백강해전이 벌어졌다. 백강은 《일본서기》에는 백촌강이라 기록돼 있으며, 금강설·홍성설·동진강설·부안설 등도 있다. 당나라는 170척으로 진을 쳤고, 왜군은 1000척으로 백강 근처 백사에 대기하고, 백제군은 언덕에서 배를 지켰다. 탐라의 수군도 참가한 치열한 전투였지만, 백·왜 동맹군은 400여 척의 전선이 불타고, 2만7000여 명이 전사하는 참패를 당했다. 복국군 왕인 부여풍은 고구려로 도주했고, 백제 유민과 왜군은 일본열도로 탈출했다.
왜국은 나당 수군의 일본 본토 상륙을 막기 위해 664년 해안가의 임시정청을 20여㎞ 내륙인 다자이후(太宰府)로 옮겼다. 이어 가네다성, 오노성, 기이성을 필두로 대마도, 규슈, 세토 내해를 거쳐 나라 지역까지 전략적 요충지마다 해양방어체제를 갖췄다. 모두 도호?쇼(答春初) 등 망명한 백제 달솔(백제의 16관등 중 제2위 품관)들이 주도한 백제식 산성이다. 그리고 당과 화친 교섭을 시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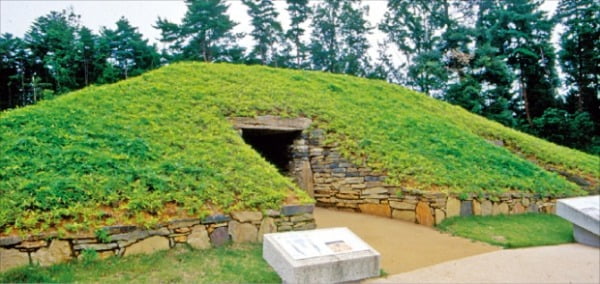
백제·고구려 유민과 이뤄낸 통일
고구려는 백·왜 동맹군과 협동작전을 시도했으며, 666년을 비롯해 전쟁 중에도 여러 번 왜국에 사신을 보냈다. 왜군은 고구려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고구려의 외교활동이 활발했다는 증거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 외곽의 아프로시압 궁전 벽화에서 발견됐다. 강국(사마르칸트) 왕에게 온 외교사절 가운데 두 명이 머리에 조우관을 쓰고 환두대도를 찬 고구려인이었다. 국제관계로 봤을 때 튀르크인이나 소그드인 상인들의 도움을 받았을 테지만 초원과 산록, 사막을 지나 무려 4000여㎞를 행군한 것이다. 구국외교에 실패한 고구려인들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
당나라는 667년 9월부터 고립무원인 고구려를 총력을 기울여 공격했다. 다음해인 668년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압록강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고, 9월 수륙양면작전과 남북 협공을 받던 평양성은 내부의 배신으로 인해 함락당했다. 그러나 압록강 이북의 40여 성은 계속 저항했으며, 안시성은 671년 7월에야 항복했다. 고구려는 700년의 역사와 자유의지를 유산으로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70년간 벌어진 대전쟁도 막을 내렸다. 하지만 동아시아 국제대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나라는 이용 가치가 떨어진 신라에 계림도독부를 설치하고, 당나라에 복속할 것을 압박했다. 신라는 당나라와의 대결을 선택했고 고구려, 백제 유민들과 손잡고 육지와 해양에서 10년 가까이 ‘나당전쟁’을 벌였다.
고구려 복국군은 한성(서울)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672년에는 신라와 연합해 백빙산 전투를 벌였지만 패배했다. 이어 673년 호로하(임진강 중류) 전투에서도 패했다. 신라군은 이런 상황들을 활용해 671년 10월 당나라의 군수선 70여 척을 격파했고, 673년에는 함선 100척을 서해에 배치해 방어했다. 675년 당군 20만 명을 매초성(경기 양주) 전투에서 궤멸하고, 676년 11월에는 기벌포(금강 하구) 해전에서 22번의 전투 끝에 당군 4000명을 괴멸시켰다. 결국 신라와 고구려, 백제 유민들은 서로 단결해 당나라군과 전쟁을 벌여 이민족을 축출하고 삼국통일을 이룩한 것이다. 동쪽 유라시아 세계에서 일어난 또 다른 질서의 재편이라는 유리한 환경도 작용했지만,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이 복수심에 불타 당나라 편에서 신라를 공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민족의 역사는 가정하기조차 싫은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 있다. 고구려와 수·당 간에 벌어진 70년 전쟁은 동아시아 종주권을 둘러싼 종족 간의 대결, 문명의 대결이었으며, 무역권 쟁탈전의 완결판이었다(윤명철, 《고구려, 역사에서 미래로》).
 한민족 미래를 밝힐 삼국통일의 교훈
한민족 미래를 밝힐 삼국통일의 교훈질문을 던진다. 안정적 강국이었던 고구려는 왜 패배했을까? 신흥강국인 수와 당의 전략적인 유연성과 넘치는 에너지, 통일을 달성한 자신감과 동아시아 패권을 향한 집념에 밀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면 고구려가 민족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부족했거나 필요성을 덜 인식했으며, 외교정책의 실패로 신라로부터 공격받고 백제나 왜의 도움을 못 받았던 탓일까?
어쨌든 고구려의 멸망으로 우리 민족은 대륙을 상실하고 해양 주도권을 일부 빼앗기면서 동아지중해의 중핵 조정 역할이 약해졌다. 거란·선비·말갈 등 방계 종족들은 훗날 우리를 압박한 강대국으로 변신했다. 한편 일본열도에는 탈출한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일본국이 탄생(670년)했으며, 이들은 신라는 물론 한민족과 영원한 적대적 관계를 고수하게 된다.
지금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중국 중심의 질서가 강요되는 현실 속에서 남북한의 적대감은 더욱 높아간다. 거기에 남남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 역사는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미래의 몫이며, 사건의 축적이 아니라 의미의 재생이 아닌가.
윤명철 < 동국대 명예교수·우즈베키스탄 국립 사마르칸트대 교수 >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