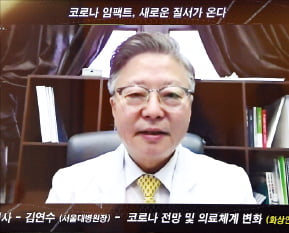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13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감염병이 닥쳐왔을 때 다시 의료진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재난에 대비할 의료시스템을 갖추려면 적절한 의사 수가 어느 정도인지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의사 수 확대를 위한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13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감염병이 닥쳐왔을 때 다시 의료진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재난에 대비할 의료시스템을 갖추려면 적절한 의사 수가 어느 정도인지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의사 수 확대를 위한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다.김 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사가 ‘코로나 사태 이후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웹세미나(webinar)에서 ‘코로나 전망 및 의료체계 혁신’ 발표를 맡았다. 그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에 대처했듯 코로나의 교훈을 토대로 의료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의료시스템을 갖추고도 원격의료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원장의 지적이다. 관련 인력 충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도쿄대학병원장이 전화를 걸어 ‘한국의 노하우가 뭐냐’고 물어볼 정도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면서도 “한국은 최고 수준의 ICT와 의료 수준을 갖췄음에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격의료가 명시적으로 규제에 묶여 있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이미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김 원장은 “상급병원이 원격의료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해 전국 의료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구조가 이상적”이라며 “대형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1·2차 의료기관이 상급병원의 중증, 희귀난치질환 노하우를 공유해 같이 치료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면 결국 환자와 국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는 비영리 의료기관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만큼 의료 민영화와 원격의료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한국 국민 1인당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보다 적지만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횟수는 세 배가량 많다”며 “1년에 3000명 정도의 의사가 배출되는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500~1000명 정도의 의대 정원 증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대 신입생 모집정원은 2007년부터 13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증원 논의가 있을 때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극심하게 반대해왔다.
김 원장은 “진료 분야뿐 아니라 디지털 의료로의 변화도 그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있다”며 “의료지식에 기술을 접목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을 필요에 따라 늘리거나 줄이면서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스페인 독감 2차 대유행은 100년 전 얘기”라며 “한국과 같이 의료체계가 갖춰져 있다면 기본적으로 2차 대유행을 막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다만 “아직 치료제 백신이 없기 때문에 최근 이태원과 같은 작은 규모의 감염과 유행은 상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의 기능 중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를 청 단위로 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입법 기능을 주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질병관리청이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