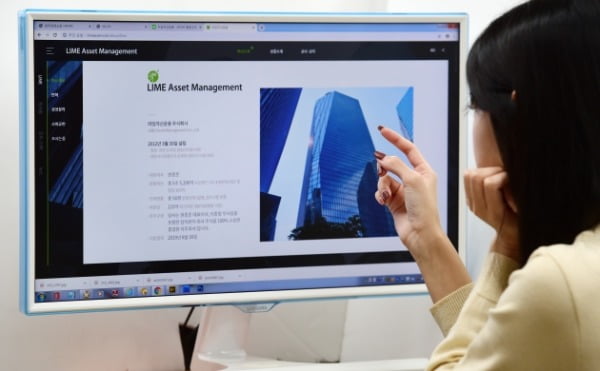
라임·옵티머스·젠투파트너스·헤리티지 등 최근 환매중단으로 논란이 된 자산운용사의 ‘부실사모펀드’들은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고수익 상품은 없었다. 예금만큼 안전한데 예금 금리보다 수익률이 높다던 상품들이었다. 초저금리 시대에 돈 굴릴 곳이 없었던 강남 자산가들은 열광했다. 한국 대표 금융회사 직원들이 권유하니 더더욱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환매 중단 소식에 다들 망연자실하고 있다.
후회막심이다. '수익과 리스크(위험)는 비례한다'는 투자의 기본 원칙만 되새겼어도 허무하게 돈을 날리지 않았을 것이란 자기반성도 나온다. 사실 사기·불완전판매 사모펀드에는 저마다 여러 징후가 있었다. 몇가지만 체크해보면 ‘부실 사모펀드’를 감별해낼 수 있다는 게 금융 전문가들 지적이다.
투자자들에게 연 5% 수익을 돌려주려면 실제로는 연 8% 가량 수익을 거둬야 한다는 점은 꽁꽁 숨겼다. 은행, 증권사들은 라임 펀드 등을 팔면서 원금에서 평균 1%가량을 선취수수료로 떼갔다.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은 2.8%나 뗐다. 운용수수료 등 각종 비용은 별도다. 글로벌 펀드에 재간접투자하는 상품은 해외 운용사 수수료, 프라임브로커(PBS) 비용, 보험료 등도 내야 한다.
한 대형 운용사 사장은 “보험을 제대로 들어 신용을 보강하면 글로벌 무역금융 기대수익률은 2%대에 불과하다”며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제안한 연 7% 수익을 돌려주려면 실제로는 12% 안팎의 성과를 내야 가능한데, 그 자체가 얼마나 투자 위험이 큰지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운용 내역을 세세하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펀드 운용전략만 대략적으로 공개하면 된다. 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 펀드 판매사들은 라임 펀드의 운용 구조는 물론 레버리지 비율조차도 몰랐다. 한 운용사 부사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처럼 구조화되고 복잡한 상품은 일단 피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수익률을 맞추려고 만기 미스매치(불일치)나 신용 미스매치 방식으로 운용을 하다가 사고가 터진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이런 ‘무늬만 사모펀드’는 뒤에 들어온 투자자 돈으로 앞서 들어온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로 변질되기 십상이다. 라임에 이은 옵티머스 펀드도 이런 구조로 인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 한 펀드 전문 변호사는 “대체투자 사모펀드가 여러 금융회사에서 공모처럼 팔리면 일단 폰지 구조가 가능한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큰돈’을 맡기면서 정작 운용사가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 금융투자협회 회원사공시시스템을 활용하면 외감법인이 아니더라도 운용사의 영업보고서를 통해 재무제표나 경영진 현황 등을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의 통합검색 기능을 활용해도 운용사의 자취를 파악할 수 있다. 옵티머스운용은 2017년부터 성지건설 등과 수상한 거래가 있었다.
증권사 프라임브로커(PBS) 계약 여부도 참고할만 하다. 사모펀드의 각종 거래를 지원하는 PBS에는 운용 감시 역할도 있다. 모든 사모펀드가 PBS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지만 운용사가 PBS 계약을 거의 맺지 않는다면 정상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옵티머스운용은 1조원 안팎의 펀드를 팔았는데 PBS 계약을 맺은 사모펀드는 1건(300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주특기’를 바꿨다가 운용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라임도 마찬가지다. 이종필 라임 전 CIO는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주식 운용을 했다가 자리를 잡지 못하자 대체투자 전문가로 탈바꿈했다. 한 운용사 대표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주식 운용 경쟁에서 밀려 대체투자로 전공을 바꾼 매니저들은 경쟁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투자하기 전에 운용사 대표와 대표 매니저의 경력과 주특기, 전문성을 따져보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