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더랜드에서는 소중한 것을 지키고, 유용한 것을 생산하고, 해로운 것을 처분하는 세 가지 과제가 문화와 시대를 아우르며 반복된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두렵기에 버리고 싶고, 사랑하기에 지키고 싶은 것들을 언더랜드로 가져갔다.”
“언더랜드에서는 소중한 것을 지키고, 유용한 것을 생산하고, 해로운 것을 처분하는 세 가지 과제가 문화와 시대를 아우르며 반복된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두렵기에 버리고 싶고, 사랑하기에 지키고 싶은 것들을 언더랜드로 가져갔다.”영국 작가 로버트 맥팔레인이 쓴 《언더랜드》의 서장에 해당하는 ‘첫 번째 방’ 마지막 대목이다. 먼저 ‘언더랜드(underland)’와 이 책의 부제인 ‘심원의 시간 여행(a deep time journey)’의 의미부터 짚어야겠다. 언더랜드는 영어 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지만 ‘땅(land) 아래(under)’라는 뜻을 헤아리긴 어렵지 않다. 저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발밑의 세상’이라고 표현했다. 심원의 시간(deep time)은 언뜻 무슨 개념인지 떠오르지 않는다. 저자는 “지구 역사가 현재에서 한없이 멀어지며 어지러울 정도로 확장된 공간”이라고 설명했고, 한국어판 옮긴 이는 “인간의 능력으로 가늠할 수 없는 아득한 지질학적 시간”으로 정의했다.
이 책은 언더랜드 탐험기이자 심원의 시간 여행기다. 저자는 ‘자연 작가’로 불린다. 그는 15년 넘게 “경관과 인간 마음의 관계에 대한 글을 써왔다”고 했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다. 경관의 대상이 땅 아래다. 저자가 탐험하는 언더랜드의 시공간은 넓고도 깊다. 인간과 자연이 만들어낸 지하 세계 경관 곳곳을 깊이 탐사하며 우주가 탄생한 순간에 형성된 암흑물질부터 언젠가 인류세에 닥칠지도 모르는 핵 미래까지 이야기한다.
저자는 서장에 밝힌 세 가지 기능, 즉 보관·생산·처리 공간으로서의 언더랜드를 파고든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신을 땅에 묻고, 동굴 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흔적을 남기는 등 기억과 물질을 언더랜드에 보관했다. 바위를 뚫고 유용한 광물을 캐내며 바다 밑에서 석유와 가스를 뽑아내고 있다. 인간 스스로 불러온 재앙을 막기 위해 지하 깊숙한 곳곳에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자연이 빚어내는 언더랜드의 경이로운 세계도 주목한다. 나무와 나무가 균사로 연결된 우드 와이드 웹, 지하 동굴을 흐르는 강, 빙하가 녹아서 생겨난 물랭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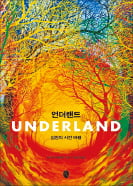 저자는 이런 고분, 광산, 숲, 도시, 바다, 빙하, 동굴 등 언더랜드 현장을 찾아 경험하고, 관련된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본다. 파리에선 ‘보이지 않는 도시’ 카타콤(지하 묘지)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서 18~19세기 광범위한 지하 채석장 공동에 수백만 구의 유골이 옮겨진 역사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탈리아 북부 카루소에선 고대 그리스·로마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망자의 강’의 지질학적 배경이 된 ‘별이 뜨지 않는 강’을 탐사하고, 슬로베니아에서는 2차 세계대전 중 자행된 포이베 대학살 현장을 찾아간다.
저자는 이런 고분, 광산, 숲, 도시, 바다, 빙하, 동굴 등 언더랜드 현장을 찾아 경험하고, 관련된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본다. 파리에선 ‘보이지 않는 도시’ 카타콤(지하 묘지)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서 18~19세기 광범위한 지하 채석장 공동에 수백만 구의 유골이 옮겨진 역사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탈리아 북부 카루소에선 고대 그리스·로마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망자의 강’의 지질학적 배경이 된 ‘별이 뜨지 않는 강’을 탐사하고, 슬로베니아에서는 2차 세계대전 중 자행된 포이베 대학살 현장을 찾아간다.노르웨이 로포텐 장벽을 넘어 겨우 도착한 해안 동굴에선 수천 년 전 선인이 남긴 ‘붉은 댄서’를 지켜보며 경이로운 마음에 눈물을 쏟아내고 그린란드에서 마주한 빙하가 내뿜는 시간의 푸른빛에 취하는 한편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고 파열하는 변화를 목격한다. 저자의 여정은 핀란드 남서부 올킬루오토섬에서 끝난다. 암반 깊숙한 곳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봉인하기 위한 작업을 지켜보면서 인류세를 살고 있는 현대인이 수도 없이 들었을 경고의 메시지를 되새긴다. “우리에게서 살아남을 것은 사랑이 아니라 플라스틱, 돼지 뼈, 납 207”이라고.
저자는 산문시와 여행기, 모험기, 역사서, 환경 에세이 등 여러 장르를 혼합한 글쓰기로 우리가 몰랐던, 지금까지 묻혀진 언더랜드 이야기를 온몸으로 느끼게 한다. 집필에만 6년이 걸렸다고 했다. ‘열정적인 발걸음’이 묻어나고 작가적 글솜씨와 성찰이 돋보이는 역작이다. 저자는 “언더랜드는 우리의 기억, 신화, 은유뿐 아니라 동시대적 존재의 물질적 바탕에도 필수적”이라며 “스스로를 다그쳐 세상을 더욱 깊게 보라”고 말한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