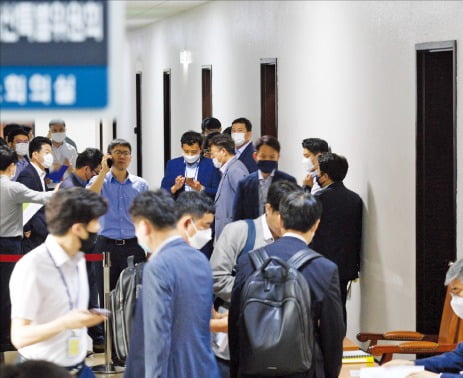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지난 6일 합의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이 이뤄지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추석 연휴 전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이 지원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경제 어려워지면 등장하는 추경
국가 예산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부 마음대로 편성할 수 없다. 1년 동안 쓸 총액과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정해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친다. 정부는 매년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 다음 1년치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의결해 12월께 확정한다. 정부는 이듬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회에서 허락받은 금액과 용도에 맞춰 돈을 쓴다. 이렇게 맨 처음 정해진 예산을 본예산이라 부른다.그런데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 한다. ‘추경’이라는 줄임말이 더 자주 쓰인다.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전쟁, 대규모 재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다.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올해 추경은 횟수와 규모 모두 ‘역대급’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서 3월 통과된 1차 추경은 11조7000억원, 4월 2차 추경은 12조2000억원, 7월 3차 추경은 35조1000억원이었다. 미국발(發)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추경(28조9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 액수다. 올 들어 ‘코로나 추경’은 방역 강화, 민생경제 안정, 소비 활성화, 고용 안정 등 다양한 목적을 내건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추경 없는 해가 거의 없었다는데…
코로나 사태가 끝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추경을 적절히 활용하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방만하게 쓰면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추경 재원은 주로 국채 발행이나 전년도에 쓰고 남은 세금, 한국은행 잉여금,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 최근 1~3차 추경에서 정부는 강도 높은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원을 마련했다. 4차 추경에서는 더 쥐어짤 데가 없어 전액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나랏빚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추경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돼 왔다는 점도 짚어봐야 할 문제다. 2000년 이후 추경이 없었던 해는 2007, 2010, 2011, 2012, 2014년 다섯 차례뿐이다. 정권에 관계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습관성 추경’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모든 추경이 불필요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우리나라가 해마다 위기를 겪은 것도 아니다. 국회가 추경 심사 과정에서 필요 없는 사업을 마구잡이로 끼워넣은 사례도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추경을 남발한다는 것은 ‘본예산을 잘못 짜고 있다’는 말과 같다”며 “정부의 세수 예측과 경기 진단이 부실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한다.
재정은 쌓아놓으면 썩어버리는 곳간의 곡식 같은 존재가 아니다. 현재 세대가 함부로 헐어 쓰면 결국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온다. 추경도 반드시 필요할 때, 절실한 곳에 쓰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기자 tardi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