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류 역사를 이야기하는 대부분 책이 소수의 지도자나 집단 대이동, 결정적인 전쟁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행성, 지구 자체는 간과되기 일쑤다. 인류의 역사는 오롯이 인류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것일까? 지구는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을까?
영국 우주국 연구원인 루이스 다트넬 웨스트민스터대 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가 인류 진화를 이끈 지구의 과정을 풀어낸 《오리진》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된다. 지구과학, 지질학, 해양학, 고생물학, 고고학, 역사학 등 인문과학 분야를 넘나들며 지구의 지형과 활동이 인류의 출현과 발달, 사회와 문명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한다. 다트넬 교수는 “지각이라 불리는 ‘판’의 활동과 기후변화, 대기순환과 기후 지역, 해류에 이르기까지 지구가 보여준 변화에 따라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달라져 왔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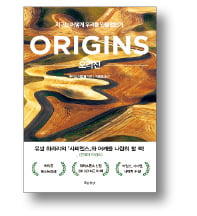 저자에 따르면 초기 인류 문명은 지각을 구성하는 판들의 경계 지점에 세워졌다. 거대한 산맥이 만들어낸 저지대 분지엔 농업에 유리한 기름진 토양이 쌓이고 화산은 비옥한 토양을 공급했다. 판의 변형으로 형성된 암석의 균열과 단층면 사이로 지하수가 솟는 곳을 중심으로 도시와 마을이 생겨났다. 저자는 “아라비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며 만들어진 산맥과 주변 지점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아시리아 문명, 페르시아 문명이 탄생했다”며 “다른 고대 문명 발상지들도 이런 판들의 경계 지역에서 탄생했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초기 인류 문명은 지각을 구성하는 판들의 경계 지점에 세워졌다. 거대한 산맥이 만들어낸 저지대 분지엔 농업에 유리한 기름진 토양이 쌓이고 화산은 비옥한 토양을 공급했다. 판의 변형으로 형성된 암석의 균열과 단층면 사이로 지하수가 솟는 곳을 중심으로 도시와 마을이 생겨났다. 저자는 “아라비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며 만들어진 산맥과 주변 지점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아시리아 문명, 페르시아 문명이 탄생했다”며 “다른 고대 문명 발상지들도 이런 판들의 경계 지역에서 탄생했다”고 주장한다.빙기와 간빙기는 인류의 운명을 뒤바꿨다. 호모 사피엔스로 불리는 원시 인류를 세계 곳곳으로 이주하도록 촉진해 지구에서 가장 널리 확산돼 살아가는 동물 종으로 만들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며 찾아온 간빙기는 인류 정착의 결정적 계기였던 농경과 목축을 가능하게 했다.
저자는 지난 1만 년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인류가 돌과 나무, 점토 가죽, 뼈, 식물섬유로 도구를 제작했던 석기시대부터 도구 제작과 기술에 일련의 혁명을 가져온 청동과 철 등 다양한 금속이 형성되고 인류가 발견해 사용했던 과정을 설명한다. 인류는 특정 지질학적 과정을 통해 금속이 농축된 광석을 캐냈다. 숯을 이용해 광석을 녹이는 고온과 산화물을 떼어내 순수 금속을 모으고 또 다른 광물을 섞어 합금을 만들었다.
저자는 금속과 더불어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에 에너지를 공급한 ‘화석 에너지 자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살펴본다. 수백 년 동안 인류는 지구의 과거에서 가장 변덕스러웠던 시기에 생성된 석탄을 채굴했고, 산소가 부족한 해저로 가라앉은 플랑크톤 유해에서 생성된 석유를 퍼올렸다. 저자는 “그렇게 만들어진 화석 자원을 사용한 산업활동을 통해 화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세계 기후를 점차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며 안타까워한다.
저자는 이처럼 지구 자체의 변천사와 인류 문명 발전사를 씨줄과 날줄로 엮은 장대한 ‘빅히스토리’를 들려주며 현대에 새겨진 ‘기원’을 파고든다. 그는 “역사의 우발적 사건들을 뛰어넘어 시간과 공간을 모두 아우르는 충분히 넓은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본다면 신뢰할 만한 추세와 믿을 수 있는 불변의 조건이 드러나고, 사건들의 배후에 있는 궁극적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