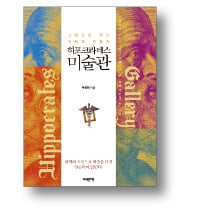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프랑스 화가 클로드 모네가 그린 아내 카미유의 초상화에서 ‘히포크라테스의 얼굴(임종을 앞둔 환자의 모습)’을 본다. 아이의 머릿니를 잡는 어머니의 모습을 담은 그림에서 진화생물학을 꺼낸다. 돈키호테를 그린 작품에서 조현병과 망상 증상을 읽어낸다.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프랑스 화가 클로드 모네가 그린 아내 카미유의 초상화에서 ‘히포크라테스의 얼굴(임종을 앞둔 환자의 모습)’을 본다. 아이의 머릿니를 잡는 어머니의 모습을 담은 그림에서 진화생물학을 꺼낸다. 돈키호테를 그린 작품에서 조현병과 망상 증상을 읽어낸다.3년 전 《미술관에 간 의학자》를 출간한 이후 ‘그림 읽어주는 의사’란 타이틀을 얻은 내과 전문의 박광혁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간행이사가 두 번째 책 《히포크라테스 미술관》을 내놨다. 20여 년 동안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미술관을 찾아다니며 그림에 담긴 의학과 인문학적 코드를 찾아 관찰하고 기록한 책이다.
저자는 우울증, 성병, 거식증 등 15개 주제를 통해 명화에 담긴 문학과 역사, 예술, 신화, 종교,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를 의학과 함께 엮어낸다. 빈센트 반 고흐, 표트르 차이코프스키, 루이 15세의 애첩 마담 퐁파두르, 카인과 아벨 등 역사·신화 속 인물과 이들을 표현한 화가들의 작품들을 풍부하게 소개한다.
책 제목은 ‘히포크라테스의 얼굴’에서 따왔다. 저자는 “혈색이 극도로 창백하고 안모(顔貌)가 매우 야위었으며, 협골은 돌출하고 안광이 무뎌져 의식을 거의 소실한 상태에서 히포크라테스는 죽음의 징후를 간파했다”고 설명한다. 또 “의학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그는 왜 죽었는가’란 질문에서 의학은 출발한다”고 덧붙인다. 이 때문에 모네와 히포크라테스를 연결시킨다. 저자는 모네의 그림 ‘임종을 맞이한 카미유’에 나타나는 어두운 색채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네는 걸작 ‘인상, 해돋이’에서 ‘찬란한 빛’을 그렸다면, ‘임종을 맞이한 카미유’에서는 ‘죽음의 빛’을 그렸다”고 말한다.
저자는 “의학의 시선으로 미술을 보면 (신화에서 문학, 예술, 역사, 인류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인문학이 읽힌다”고 강조한다. 문체가 간결해 일반 독자도 쉽게 페이지를 넘길 수 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