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고 나면 올라 있는 주가, 오직 주식 이야기로만 가득한 커피전문점, ‘영끌’ 주식 투자, 주식 뇌물과 부정에 연루된 고위 관료와 정치인들…. 요즘 일만이 아니다. 정확히 300년 전, 1720년 영국 사우스시컴퍼니(South Sea Company·남해회사) 주가 거품 사태 이야기다.
자고 나면 올라 있는 주가, 오직 주식 이야기로만 가득한 커피전문점, ‘영끌’ 주식 투자, 주식 뇌물과 부정에 연루된 고위 관료와 정치인들…. 요즘 일만이 아니다. 정확히 300년 전, 1720년 영국 사우스시컴퍼니(South Sea Company·남해회사) 주가 거품 사태 이야기다.저명한 과학저술가인 토머스 레번슨은 《허상을 좇는 돈(Money for Nothing)》에서 17세기 서구 과학혁명과 동시에 진행된, 또 다른 변화에 착안했다. 흑사병이라는 치명적인 질병 외에 ‘신종 사회 바이러스’가 탄생한 사건이었다. 이 바이러스는 외양만큼은 과학혁명 못지않은 일종의 지식혁명이자 신(新)발명이었기에 위험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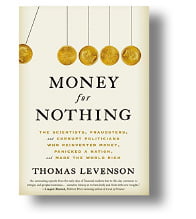 첫째, 자연현상 외에 사회와 경제까지 수량으로 표현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사상이 태동했다. 뉴턴은 천체와 사물의 운동 방정식 외에 복리 계산법 연구를 개척한 인물이기도 했다. 윌리엄 페티는 《정치산술》에서 인구통계를 이용해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을 보였다. 에드먼드 핼리는 사망률 통계를 이용해서 우연과 리스크의 개념을 도출하고 인구집단별로 생명보험료를 계산하는 산식을 개발했다.
첫째, 자연현상 외에 사회와 경제까지 수량으로 표현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사상이 태동했다. 뉴턴은 천체와 사물의 운동 방정식 외에 복리 계산법 연구를 개척한 인물이기도 했다. 윌리엄 페티는 《정치산술》에서 인구통계를 이용해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을 보였다. 에드먼드 핼리는 사망률 통계를 이용해서 우연과 리스크의 개념을 도출하고 인구집단별로 생명보험료를 계산하는 산식을 개발했다.둘째, 신용화폐 제도가 본격 형성되기 시작했다. 외상이나 어음, 선물옵션 거래, 왕실의 차입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이 시기는 좀 더 특별했다. 잉글랜드은행이 발급한 귀금속 보관 증서가 화폐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영국 의회가 왕실 재정 충당을 위한 차입에 보증을 서기 시작하면서 국왕의 채무는 국가 채무로 전환됐고 국채 시장이 탄생했다. 물론 복지가 아니라 전쟁용이었다.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 1688~1697년 5000만파운드를 대(對)프랑스 전쟁 비용으로 썼는데, 이 중 1600만파운드가 차입이었고, 이 가운데 700만파운드는 의회 보증 국채로 조달한 것이었다.
남해회사는 아프리카 노예무역을 명분으로 설립됐지만 주로 정부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됐다. 회사는 주식 발행 대금 대부분을 국채 매입에 지출했다. 의회가 보증하는 안전한 공기업이라는 허상의 믿음을 바탕으로, 주가는 1720년 1월 100파운드에서 출발해 6월에 700파운드를 거쳐 1000파운드까지 치고 올랐다. 당시 회사의 미래 예상수익을 근거로 주기적으로 주식의 적정 가치를 계산한 아치볼드 허치슨에 따르면, 연간 주당순이익이 200파운드가 돼야 700파운드 주가가 뒷받침됐는데, 이는 조폐국장 뉴턴의 5개월치 월급이었다. 이쯤 되면 논리적 분석 따위는 의미가 없다. 그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것이다. 그해 8월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대파국은 말할 것이 없다.
당시 이 대열에 합류했다가 훗날 크게 손실을 본 《로빈스 크루소》의 저자 대니얼 디포의 기록에 따르면 ‘시중에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은 딴 세상 사람’으로 간주될 정도였다. 그해 6월 버블방지법이 제정됐지만, 연관된 고위직 인사들은 로비를 벌여 자신들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법조항을 개정하는 파렴치한 행각도 있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는 남해회사 돌림병의 직계 변종에 불과하다. 기초자산이 300년 전 영국의 전쟁채무에서 21세기 미국의 부동산담보채무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 유행병은 수십 년에 한 번씩 세상을 뒤흔들었다. 신용화폐의 폭발적 팽창과 독자적 운동은, 과도한 레버리지라는 괴물을 촉매로 남해 곳곳에서 거품을 만들어내면서 언제 터질지 모를 화산처럼 잠복해 있다. 최근의 게임스톱 공매도 사태도 레버리지 대상이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바뀌었을 뿐 본질은 다르지 않다. 지금도 국가채무와 민간채무 규모로 논란이 많다. ‘탈부채화 위기’는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터지게 돼 있다. 문제는 아무도 그 시기와 형태를 미리 알 수는 없다는 데 있다.
19세기 초 미국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활기를 목도했던 알렉시 드 토크빌은 한편에서 뼈아픈 지적을 했다. “버블과 금융위기는 민주주의 사회의 풍토병이다.” 자유민주주의라면 항상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고질병이라는 것이다. 이 병에는 치료제가 없다. 오직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 명철했던 뉴턴조차 이 질병 앞에서 당했을 정도이니 여전히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송경모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