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의 장악이야말로 인류의 모든 조직체에서 전개될 전 세계적 권력투쟁에서 핵심 문제다. 앞으로의 권력투쟁은 더욱더 지식의 배분과 접근기회를 둘러싼 투쟁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지식의 장악이야말로 인류의 모든 조직체에서 전개될 전 세계적 권력투쟁에서 핵심 문제다. 앞으로의 권력투쟁은 더욱더 지식의 배분과 접근기회를 둘러싼 투쟁으로 바뀌어갈 것이다.”미래학자 앨빈 토플러(1928~2016)가 1990년 펴낸 《권력이동》은 《미래쇼크》(1970년), 《제3의 물결》(1980년)에 이은 미래학 3부작의 완결편이다. 10년 주기로 출간한 세 책에서 ‘변화’를 공통 주제로 삼으면서도 각기 다른 렌즈로 현실을 들여다봤다. 《미래쇼크》가 변화의 ‘과정’에 주목했다면 《제3물결》은 변화의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권력이동》은 미래의 변화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 하는 변화의 ‘통제’를 다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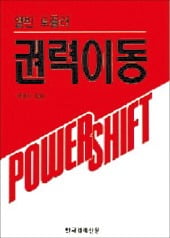 토플러는 농업사회(제1물결)에서 산업사회(제2물결), 정보사회(제3물결)로 옮겨가면서 권력이 이동하는 현상을 탐구했다. 특히 단순한 ‘권력의 이동(power shift)’이 아니라 권력 본질 자체의 심층적 변화인 ‘권력이동(powershift)’에 주목했다. 토플러는 권력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새로운 부(富)의 창출체제’에서 비롯되며, 그 힘의 정체가 지식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아이디어·상징체계가 즉시 전달되는 ‘초(超)기호경제(super-symbolic economy)’가 낡은 ‘공장굴뚝(smokestack)경제’와 충돌하면서 권력의 원천인 ‘물리력(폭력)·부·지식’의 급진적 변화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사회를 통제하는 힘은 물리력과 부에서 지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식은 원자재·노동·시간·장소 및 자본의 필요를 감소시켜 선진경제의 중심적 자원이 되고 있다. 지식의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지식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이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게 토플러의 진단이었다.
토플러는 농업사회(제1물결)에서 산업사회(제2물결), 정보사회(제3물결)로 옮겨가면서 권력이 이동하는 현상을 탐구했다. 특히 단순한 ‘권력의 이동(power shift)’이 아니라 권력 본질 자체의 심층적 변화인 ‘권력이동(powershift)’에 주목했다. 토플러는 권력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새로운 부(富)의 창출체제’에서 비롯되며, 그 힘의 정체가 지식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아이디어·상징체계가 즉시 전달되는 ‘초(超)기호경제(super-symbolic economy)’가 낡은 ‘공장굴뚝(smokestack)경제’와 충돌하면서 권력의 원천인 ‘물리력(폭력)·부·지식’의 급진적 변화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사회를 통제하는 힘은 물리력과 부에서 지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식은 원자재·노동·시간·장소 및 자본의 필요를 감소시켜 선진경제의 중심적 자원이 되고 있다. 지식의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지식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이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게 토플러의 진단이었다.정보화 혁명 이후 권력이동은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식이 재분배되면서 지식에 기초한 권력도 재분배되고 있다. 과거 의사들은 지식을 독점하면서 환자에게 절대적 권위를 가졌지만 오늘날 의료정보 접근이 쉬워지면서 권좌에서 밀려났다. 기업 내부에서도 종업원들이 경영층이 독점하던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더 중요한 것은 근육노동이 아니라 정신에 기초해 부를 창출하는 새로운 체제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는 갈수록 코그니타리아(cognitariat: 지식과 두뇌에 바탕을 둔 유식계급)가 돼갔다. 지식근로자를 대체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근로자의 교섭력도 커졌다는 게 토플러의 설명이다. “물리력과 부는 강자와 부자의 소유물이었지만, 지식은 약자와 가난한 자도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지식이 갖는 진정으로 혁명적인 특징이다.”
토플러는 금융과 미디어에서의 권력이동도 예견했다. 농업사회의 실물, 산업사회의 지폐에 이어 정보사회에서는 유사화폐가 출현할 것으로 봤다. TV와 컴퓨터 기술이 결합하면 시청자들이 ‘마음대로 영상을 개조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늘날 암호화폐가 등장해 기존 금융체제를 위협하고, 유튜브 등 1인 미디어가 발달한 것을 보면 토플러의 통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기업과 일상생활에서 권력의 붕괴가 가속화하는 것과 함께 범세계적인 권력구조도 와해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양대 초강대국이 거인처럼 지구 위를 활보했지만, 소련 권력의 위축으로 균형 유지는 끝났다. 토플러는 공장굴뚝경제의 쇠퇴와 초기호경제의 등장이라는 변화 속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신봉하는 세 가지 기둥인 ‘소유, 중앙계획, 하드웨어의 지나친 강조’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국유기업들은 지식이 부를 창출한다는 혁명적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중앙계획경제는 높은 수준의 정보와 경제적 복잡성을 통제하지 못했다. 사회주의자들이 공장굴뚝 산업에 치중하고 정신노동을 경시하면서 소프트웨어와 무형자산을 1차적 원료로 삼는 신(新)경제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토플러는 “사회주의의 미래와의 충돌은 치명적이었다”며 “어떤 국가라도 지식을 볼모로 삼으면 그 시민들을 과거의 악몽 속에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식의 시대에도 폭력과 부라는 권력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결코 대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부는 앞으로도 계속 가공할 만한 권력의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토플러는 권력의 역사상 중요한 한 가지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최고급 권력의 원천인 지식이 시시각각으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현실 말이다. “권력이동은 사회가 미래와의 충돌을 향해 달려감에 따라 폭력·부·지식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숨겨진 이동이다.”
양준영 한국경제신문 뉴스레터부장 tetriu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