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을 다해 대항하라”고 했던 레프 톨스토이에겐 극복의 대상이었다. “가장 성스러운 자원”으로 애지중지했던 피터 드러커에겐 소중한 자산이자 효율적인 도구였다. 압도적인 모습으로 인간에게 다가오면서 온갖 모순을 함축한 존재. 바로 시간 얘기다.
시간은 인간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절대적 존재다. 모든 일은 시간에 얽혀 있고, ‘시간의 축’을 통해 이해된다. 시간만큼 평등한 것도 없다. 부자건 빈자건,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하루에 주어진 24시간은 동일하다. 일방적이고 불가역적이어서 되돌릴 수도, 나눌 수도 없다. 하지만 사람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는 같지 않았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운명도 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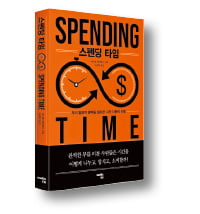 《스펜딩 타임》은 미국 예일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프린스턴대 등에서 활동했던 저명한 노동경제학자가 시간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아 현대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되짚어본 책이다. 2000년대 이후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에서 수집한 방대한 일반인의 시간 사용 데이터가 동원됐다. ‘시간을 어떻게 쓰나’라는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철학자나 물리학자와는 다른 시선에서 접근한다.
《스펜딩 타임》은 미국 예일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프린스턴대 등에서 활동했던 저명한 노동경제학자가 시간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아 현대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되짚어본 책이다. 2000년대 이후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에서 수집한 방대한 일반인의 시간 사용 데이터가 동원됐다. ‘시간을 어떻게 쓰나’라는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철학자나 물리학자와는 다른 시선에서 접근한다.예를 들어 1인당 소득이 1만달러 늘어나면서 가사활동 시간은 하루 평균 10분가량 줄어든다. 미국 성인은 하루 평균 2시간45분을 TV를 보는 데 소비하고, 10분 미만을 종교 활동에 할애하며,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은 1시간45분을 쓴다. 저자는 이런 것을 상세히 보여주는 대신 ‘아침형 인간이 돼라’는 식의 뻔한 메시지는 제시하지도 않는다.
일관되게 책이 주목하는 것은 시간의 모순성이다. 인간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도무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은 시간이 상반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여러 각도에서 시간의 특징을 파헤친다.
시간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유한하면서도 무한하고, 바뀌지 않으면서도 크게 변화한다는 것이다. 빈둥거리며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시간이 무한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한부 삶을 보내는 이에겐 1분1초가 소중할 수밖에 없다. 시곗바늘이 도는 속도는 동일한데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시간의 진행 속도는 가파르게 빨라진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게 시간이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천차만별이다. 때론 운명적으로 사용법이 갈리기도 한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라 사실상 주어진 시간도 차이가 난다. 미국에서 평균 성인 남성은 주당 53시간 일했지만 여성은 54시간 이상 일했다. 여성의 노동에 가사 활동이 많이 포함된 까닭이다. 여성은 샤워하고, 옷을 입고, 머리를 손질하는 데 1주일에 2시간30분가량을 남성보다 더 쓴다. 여성을 향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대신 미국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더 잠을 잔다. 무엇보다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5년이나 더 긴 까닭에 인생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의 총량이 더 많다. 60~64세에서 남성은 미국 인구의 48%를 차지하지만 84세 이상에선 7.7%에 불과한 점이 ‘시간의 역설’을 웅변한다.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이 바뀐다는 점도 눈길을 뗄 수 없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저자에 따르면 부자의 시간은 더 가치가 있다. 기회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에 부자들은 돈이 적게 들고 몸으로 때워야 하는 시간집약적 활동 대신 비싸더라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품집약적 활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시간조차 한계가 있기에 부자는 수면시간과 TV 시청시간을 줄인다. 임금이 평균의 두 배인 미국 남성은 평균의 절반인 남성보다 하루에 20분 적게 잔다. 소득이 하위 10%에서 상위 10%로 올라가면 하루 수면시간이 14분, 1년으로 환산하면 100시간 단축된다.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 간 시간 사용법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시간을 아꼈기에 부자가 됐는지, 부자가 됐기에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말이다.
경제학자인 저자는 시종일관 시간을 ‘부족한 자원’으로 바라본다. 모든 일은 ‘시간을 잡아먹는’ 행동이며, 시간을 사용하는 데는 돈이 든다는 것이다. 시간과 관련한 모든 일은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파악된다. 일상의 모든 분야를 경제학으로 설명하려 해서 ‘제국주의적’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경제학의 최신 모습을 반영하는 듯하다.
다만 저자가 다루는 내용의 대부분이 현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탓에 공감하기 어려운 점도 적지 않다. 상세한 시간 사용 실태 분석과 대조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써야 하는지 대안 부분이 취약한 것도 한계다. 근대 이후에야 시간을 세분화해 객관적으로 파악했던 만큼, 역사적 접근법을 곁들였으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없지 않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