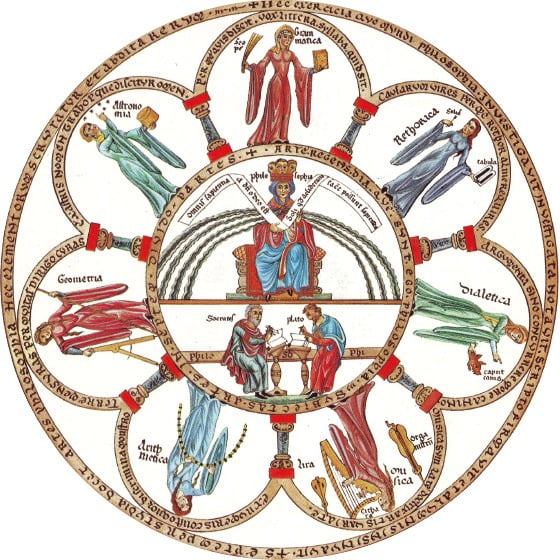
시곗바늘은 왜 시계 방향으로 돌까. 해시계 그림자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랐기 때문이다. 북반구에서 해는 동쪽에서 떠올라 남쪽 하늘을 지난 뒤 서쪽에서 진다. 해시계 그림자는 서쪽에서 북쪽을 거쳐 동쪽으로 옮겨간다. 후일 만들어진 기계식 시계는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바늘을 달게 됐다. 만약 남반구에서 먼저 해시계가 발달했다면 왼쪽으로 도는 시계가 표준이 됐을지도 모른다.
 과학사학자인 김태호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교수가 쓴 《오답이라는 해답》은 이처럼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과학기술사의 이면을 들여다본다. 저자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쓰는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 기술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쓰는 형태로 진화해야 할 필연적 이유 같은 것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과학사학자인 김태호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교수가 쓴 《오답이라는 해답》은 이처럼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과학기술사의 이면을 들여다본다. 저자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쓰는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 기술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쓰는 형태로 진화해야 할 필연적 이유 같은 것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한다.과학사를 다루면서도 뻔한 내용을 담지 않은 게 이 책의 미덕이다. 뉴턴, 아인슈타인, 보어, 슈뢰딩거 등은 등장조차 하지 않는다.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드러낸 이중슬릿 실험으로 당시 과학계가 충격과 공포에 빠진 과학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도 없다. 대신 이 책은 한국 역사의 구석구석에서 낯설지만 흥미로운 장면들을 찾아내는 데 집중한다. 어찌 보면 과학사 책이라기보다 과학을 곁들인 역사책 같은 느낌도 든다.
광복 후 한국에서 음력 설과 추석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다. 지금은 당연시되는 설날과 추석은 일제강점기 때 양력을 도입한 이후 미신이란 누명을 썼다. 하지만 휴일로 인정해주지 않아도 꼬박꼬박 음력 설과 추석을 쇘던 민중의 관습은 정부의 노력으로도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프랑스 대혁명기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혁명정부는 1793년 하루는 10시간, 1시간은 100분, 1분은 100초라고 선포했다. 열두 달의 이름도 로마 신의 이름에서 벗어나 ‘새싹이 트는 달(제르미날)’ 등 계절에 맞는 이름으로 바꿨다. 하지만 일상생활의 혼란만 야기한 채 1805년 폐지되고 말았다. 지구가 365일 걸려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새해가 언제 시작되느냐는 시대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책은 한국 근현대 과학계에 등장한 인물에게도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한국인에게 근대의학을 가르친 최초의 한국인 의사 김익남, 한반도 상공을 날았던 최초의 한국인 비행사 안창남, 한글 타자기를 개발한 송기주 등이다. 1940년대 한국 과학계를 대표하는 인물인 이태규, 우장춘, 리승기를 통해 시대에 낀 인물들의 애달팠던 삶을 보여준다. 우장춘은 아버지가 친일 역적에 어머니는 일본인이었다. 한국에선 완전한 한국인으로, 일본에선 완전한 일본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교토대 교수를 지낸 이태규는 광복 후 서울대 문리대 초대 학장이 됐지만 일본 배경을 문제 삼은 이들에게 상처를 받아 미국으로 떠났다. 리승기 역시 서울대 공대 초대 학장으로 취임했지만, 6·25전쟁 통에 북한으로 가게 돼 한국에서 잊힌 인물이 됐다.
이를 통해 저자는 한국이 민족이나 국가를 너무 강조하면서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표한다. 한국 과학자를 길러낸 일본인 스승들은 금기어가 됐고, 광복 후 정치적 주류에서 벗어난 과학자들은 역사에서 종적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좋을까’하는 걱정 때문에 이 기본적인 일을 미루다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 연구자들이 먼저 작업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쓰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책 제목처럼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오늘의 오답이 어제의 해답일 수 있고, 오늘의 해답이 내일의 오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의문조차 품지 않았던 익숙한 현상에 질문을 던지며,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틀을 제시한다. 주간지에 연재했던 글을 모은 까닭에 어떤 면을 펼치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명확하고 군더더기 없는 문장도 일품이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