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래식의 발견》(존 마우체리 지음, 에포크)은 지휘자 겸 음악교육자인 존 마우체리가 클래식 입문자들에게 감상의 길을 터주는 책이다. 저자에 따르면 1700년대부터 유럽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클래식은 250여 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무수한 명작이 쏟아졌다. 유럽 백인 남성들이 써낸 곡들이 이제 만국 공통어가 됐다. 서양에서만 즐기던 장르가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며 전쟁과 무역을 통해 전 세계에 퍼졌다.
《클래식의 발견》(존 마우체리 지음, 에포크)은 지휘자 겸 음악교육자인 존 마우체리가 클래식 입문자들에게 감상의 길을 터주는 책이다. 저자에 따르면 1700년대부터 유럽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클래식은 250여 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무수한 명작이 쏟아졌다. 유럽 백인 남성들이 써낸 곡들이 이제 만국 공통어가 됐다. 서양에서만 즐기던 장르가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며 전쟁과 무역을 통해 전 세계에 퍼졌다.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클래식이 백인 남성들의 전유물로 탐탁잖게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저자는 클래식을 들을 때 국가와 인종을 강조하는 건 구시대적이라고 비판한다. “사람들은 이미 클래식 음악을 알고 있다. 선율 속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다”라는 게 저자의 항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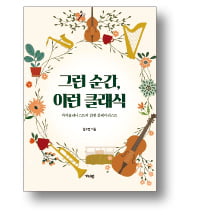 《그런 순간, 이런 클래식》(김수연 지음, 가디언)은 일상의 순간을 특별하게 바꾸는 힘을 지닌 클래식 작품들을 소개한다. 바이올리니스트이자 클래식 공연기획자 김수연이 긴장감이 필요하거나, 이별했을 때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40여 개 상황에 도움이 될 작품 90여 곡을 설명한다.
《그런 순간, 이런 클래식》(김수연 지음, 가디언)은 일상의 순간을 특별하게 바꾸는 힘을 지닌 클래식 작품들을 소개한다. 바이올리니스트이자 클래식 공연기획자 김수연이 긴장감이 필요하거나, 이별했을 때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40여 개 상황에 도움이 될 작품 90여 곡을 설명한다.나른한 감정을 깨트릴 때는 ‘프레스토(아주 빠르게)’로 쓰인 곡을 추천하는 식으로 전개된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송어)’ 3악장이나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의 3악장이 분위기 전환을 위한 대표 추천곡이다. 코로나19로 쌓인 답답함을 풀고자 할 때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 불고’를 들으라고 조언한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주인공이 3분 동안의 자유를 만끽하는 장면을 꾸민 작품이다.
 《다락방 클래식》은 주요 클래식 작품에 얽힌 작곡가의 후일담과 비화를 담은 책이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과 로베르트 슈만, 프레데리크 쇼팽 등 한 시대를 풍미한 작곡가들이 어떻게 영감을 얻었고, 작곡을 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려준다.
《다락방 클래식》은 주요 클래식 작품에 얽힌 작곡가의 후일담과 비화를 담은 책이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과 로베르트 슈만, 프레데리크 쇼팽 등 한 시대를 풍미한 작곡가들이 어떻게 영감을 얻었고, 작곡을 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려준다.저자는 음악 사조나 화성학을 몰라도 즐겁게 작품을 감상하게끔 독자들을 이끈다. 쇼팽의 대표 레퍼토리를 들을 때 여성작가 조르주 상드와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는 식이다. 상드와 사랑에 빠졌던 쇼팽은 ‘마주르카’와 ‘뱃노래’를 썼다.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음악가들도 되돌아본다. 생전 ‘신이 모차르트를 대신해 보낸 피아니스트’라 불렸던 클라라 하스킬(1895~1960)과 첼리스트 자클린 뒤프레(1945~1987) 이야기다. 모두 몸이 굳어져가는 ‘다발성 경화증’을 앓았다. 저자는 평생 한 번은 하스킬이 연주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4번’과 뒤프레가 켠 에드워드 엘가의 ‘첼로 협주곡 e단조’를 들어보라고 강조한다. “새우등으로 피아노를 치던 하스킬의 위대함과 듣는 이의 혼을 빼놓는 뒤프레의 열정”이 묵직하게 전해진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