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헌론을 던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담았다. 정치·사법 개혁과 관련,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선 기간 중 여러 차례 개헌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기자들에게 “지금의 헌법은 1987년 체제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 상태의 절충적인 헌법”이라며 “많은 변화가 일어난 현재 대한민국에 맞는 옷인가. 안 맞는 옷은 바꿔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면적보다는 단계적·순차적 개헌을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합의된 게 일부라도 있으면 총선·대선·지방선거 등 기회에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임기 단축 수용과 임기 초반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고 그의 뜻대로 개헌이 이뤄진다면 2027년 5월 9일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1년 정도 단축해 2026년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외엔 구체적인 개헌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만약 개헌이 본격 추진된다면 청와대가 2018년 3월 국회에 제출한 자체 개헌안이 뼈대가 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개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개헌안에도 ‘대통령 임기 4년제 및 1회 중임 허용’ 조항이 들어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대통령 중임제와 책임총리제를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 중임제는 5년 단임 대통령의 단점으로 꼽히는 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막고 정책 연속성을 기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임기와 맞춰 잦은 선거로 인한 폐단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단점도 적지 않다. 우선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포퓰리즘적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 재선 땐 단임 대통령제와 마찬가지로 임기 후반기 역시 레임덕을 겪을 수 있다.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개헌은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개헌을 꺼낸 것에 대해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도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재선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것과 똑같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주도로 개헌하더라도 난관이 적지 않다. 청와대와 여당은 헌법의 뼈대를 건드리려고 하고 있다. 자칫 우리 사회를 거대한 좌·우 이념 논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 청와대 개헌안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항쟁 등을 넣었다. 여권은 촛불 시위, 제주 4·3 사건, 동학농민운동도 전문에 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후보는 여기에 더해 기후 위기 문제도 전문에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헌법 전문의 기본 성격을 망각한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헌법 자체가 국가 통치 조직과 기본원리,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본 규범이다. 이 때문에 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국들의 헌법 전문엔 이런 정신을 축약하는 내용만 담겨 있고 개별 사건들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전문은 매우 짧다. 미국 헌법 전문은 한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쳐 48개 단어에 그치고 영국·프랑스·일본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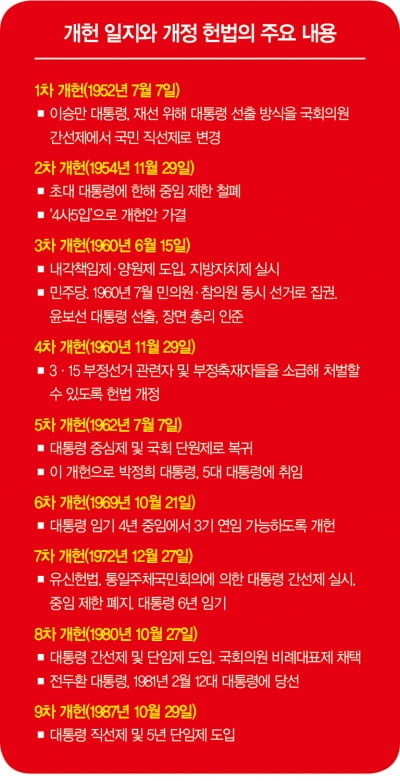
우리 정치사에서 개헌은 약방의 감초 같았다. 지난 30년 넘게 반짝 등장했다가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없이 연기만 피우다가 사그라지기를 반복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개헌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3년 뒤다. 민정당 소속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김영삼(YS) 민주당 총재, 김종필(JP) 신민주공화당 총재가 3당 합당에 합의하면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기로 하고 비밀 각서까지 썼다. 하지만 YS는 각서가 공개되자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 대표 업무를 거부하고 경남 마산으로 내려갔다. 대통령 뜻이 강했던 YS의 반대로 내각제 개헌 약속은 없던 것이 됐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도 내각제 개헌 공약이 나왔다. 김대중(DJ)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대선 후보와 JP가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면서다. 두 사람은 대선 승리 땐 1999년까지 개헌한다고 합의했지만 집권 뒤 DJ가 이를 어기면서 DJP연합은 깨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말인 2007년 4년 중임제의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위로 돌아갔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땐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집권하면 개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고 ‘5년 단임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등 복수 개편안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고 19대 국회 땐 ‘헌법개정자문위’가 출범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이 역시 여야 이견으로 유야무야됐다. 2016년 10월엔 탄핵에 몰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헌을 전격 제안했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는 정국 전환용 계책이라고 반대하면서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개헌이 번번이 무산된 데는 각 정파의 ‘유불리’ 계산이 앞섰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불리한 정국 타개용으로 제시하기 일쑤였고 야당은 퇴짜를 놓았다. 후보 시절 공약했지만 막상 정권을 잡으면 개헌이 자칫 국정 블랙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공수표가 되곤 했다. 이 때문에 이 후보도 집권에 성공하더라도 개헌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홍영식 논설위원 겸 한경비즈니스 대기자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