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2월 8일 90세 영국 할머니 마거릿 키넌이 세계 최초로 정식 출시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 약 1년 만이었다. 이 백신을 개발한 회사는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 이어 모더나와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에서도 백신을 내놓았지만 대량 생산과 유통이 가능하고 예방률도 높은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달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세계 15개국에서 동시 출간된 문샷》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이 어떻게 9개월 만에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를 다룬다. 저자는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다. 당시 화이자 내에서 벌어진 상황과 의사결정 과정을 생생하게 그린다. 위기의 순간에는 다르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용기가 화이자 기업 문화 속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백신을 만들 수 있었다고 그는 설명한다.
화이자의 백신 개발은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제약사 관계자와 과학자들을 백악관에 소집하면서 시작됐다. 화이자 내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어떤 방식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만들 것이냐였다. “모더나는 mRNA 기술에 상당한 전문성을 확보해뒀기 때문에 백신 개발에 대한 선택지는 유일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달랐다. 화이자 연구팀은 아데노바이러스, 재조합 단백질, 접합, mRNA 등을 포함해 백신을 만드는 수많은 플랫폼을 접해왔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제시한 과제는 우리가 어떤 플랫폼에 베팅해야 할지 추천하라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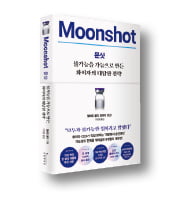 토론을 마친 연구팀은 mRNA 방식을 제안했다.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얼마든지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아데노바이러스로 만든 백신은 전달체인 아데노바이러스 자체에 면역이 생기면서 추가 접종이 어려웠다. 마침 화이자는 2018년 독감 백신 개발을 위해 바이오엔테크와 mRNA 기술 제휴를 한 상태였다.
토론을 마친 연구팀은 mRNA 방식을 제안했다.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얼마든지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아데노바이러스로 만든 백신은 전달체인 아데노바이러스 자체에 면역이 생기면서 추가 접종이 어려웠다. 마침 화이자는 2018년 독감 백신 개발을 위해 바이오엔테크와 mRNA 기술 제휴를 한 상태였다.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바이오엔테크와 계약을 맺으면서도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모든 개발비와 상용화에 따른 이익을 50 대 50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화이자가 개발비 전액을 먼저 부담하기로 했다. 개발이 실패한다면 모든 손실은 화이자가 져야 했다.
“너무 늦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백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수천만 회가 아니라 수억 회를 접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라 CEO의 말에 화이자 임직원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이지만 단기간에 수억 회 접종분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불라는 밀어붙였다. 우선 초저온 보관을 위해 기존 창고를 축구장 크기의 ‘냉동고 농장’으로 개조했다. 각각 30만 회 접종 분량의 백신을 저장할 수 있는 냉동고 500개를 설치했다. 유럽 공급을 위한 벨기에 공장도 똑같이 개조했다. 드라이아이스도 직접 만들기로 했다.
핵심은 대량 생산이었다. 새로운 생산 시설을 지으려면 몇 년이 걸렸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초기에 천막 아래에서 자동차 생산 라인을 돌렸던 데서 아이디어를 따왔다. 물론 백신을 천막에서 만들 순 없었다. 대신 몇 주 만에 완성할 수 있는 조립식 모듈로 공장을 지었고, 2021년 초에는 연간 25억 회분의 백신을 제조하겠다고 발표할 수 있었다. 불라는 이렇게 회상했다.
“화이자에서 28년간 일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큰 조직에서는 직급이 낮을수록 이런 경향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확장해야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해낼 수 있으며, 스스로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
화이자 백신은 과학의 승리이자 민간 기업의 승리다. 불라는 이렇게 말한다. “기업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힘이 있다. 기업은 창의성의 엔진이자 기회의 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업적 압박으로 인해 기업인들은 신기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적용하며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인다. 기업가 정신과 혁신은 긴밀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책은 화이자 CEO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풀어간다. 실제 연구진이 어떻게 백신을 개발했는지보다는 경영자 입장에서 큼직큼직한 결정을 내린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때때로 자기 자랑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래도 사건에 얽힌 사람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상황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한 가치를 지닌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랬고, 코로나19 때도 주요 관계자들의 책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미국 문화의 큰 장점이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