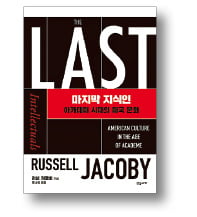 “익숙한 방에 들어섰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없어져 버린 물건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익숙한 방에 들어섰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없어져 버린 물건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역사학자이자 학술·문화비평가 러셀 저코비의 저서 《마지막 지식인》은 이런 글로 시작한다. 여기서 ‘익숙한 방’은 미국이며 ‘없어져 버린 물건’은 지식인이다. 책은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사라져 버린, 그러나 대다수 사람이 그 부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지식인에 대한 이야기다. 저자는 지식인 중에서도 젊은 지식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저코비가 관심을 갖는 지식인은 미국의 ‘공공 지식인’이다. 공공 지식인은 대중을 향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하는 지식인을 말한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갇히지 않고 책, 리뷰, 저널리즘을 통해 사회 공론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요즘 젊은 지식인들이 이전 세대처럼 프리랜서로 글을 쓰면서 사는 건 쉽지 않은 일이 됐다. 글을 실을 만한 신문과 잡지 수가 계속 줄어든 데다 이들을 강단으로 끌어들이려는 대학들의 유혹이 갈수록 거세졌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등교육 수요가 확대되면서 지식인들은 프리랜서 저술가에서 대학교수로 옮겨 갔다. 대학이 팽창하면서 지식인들은 불안정한 생활을 청산하고 안정된 커리어를 찾게 됐다. 미국의 인구는 1920년부터 1970년 사이 약 두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대학교수는 열 배나 늘었다. 이제 지식인이 된다는 건 교수가 된다는 것의 다른 말이 됐다.
책은 ‘지식인의 대학교수화(化)’가 공공 문화의 활력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한다. 대학교수로 성장한 젊은 지식인이 전문적이고 유능할 수는 있지만, 공공의 삶을 살찌우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학계가 번창하는 동안 공공 문화는 오히려 낡고 빈약해졌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이 같은 지적은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초판이 출간된 1987년과 두 번째 서문을 작성한 2000년, 한국어판이 출간된 2022년에도 ‘한국에 공공 지식인은 없다’는 현실엔 변함이 없다. 한국은 1970년대까진 식민과 독재에 저항하는 ‘지사적 지식인’이, 1980년대 초중반엔 사회운동에 투신하는 ‘참여적 지식인’이 존재했다. 그러다 1980년대 말 민주화 이후 지식인들이 대학과 정부 등 제도권으로 흡수되면서 공론장에서 이들의 존재감은 점차 사라졌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변화, 전쟁 등 인류사적 위기는 공공 지식인의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저코비는 지식인들에게 대중적 언어를 되찾고 공공의 영역에서 역할을 찾기를 호소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