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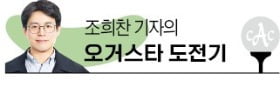 “당신, 로또에 당첨된 거야. (당첨된 걸) 경매에 내놓으면 최소 10만달러(1억2300만원)는 받을 걸.”
“당신, 로또에 당첨된 거야. (당첨된 걸) 경매에 내놓으면 최소 10만달러(1억2300만원)는 받을 걸.”지난 며칠간 눈인사만 했던 미국 기자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손을 내밀었다. 부러움이 가득한 눈이었다. 벽에 붙은 TV 화면에는 ‘월요일 골프 로또 당첨자 조희찬(Monday Golf Lottery Winner, Heechan Cho)’이 적혀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프로골프투어(PGA)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열린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내셔널GC에 마련된 기자실에서 벌어진 일이다.
오거스타GC가 마스터스 취재를 위해 찾은 전세계 500여명의 기자중 추첨을 통해 딱 28명에게만 주는 라운드 기회를 잡은 것. 세계 최대 골프축제의 무대이자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등 ‘명사(名士)중의 명사’만 회원으로 받는 오거스타GC가 ‘서울에서 온 주말 골퍼’에게 티박스를 내준다는 얘기였다.
509일만에 이뤄진 타이거 우즈 복귀 소식을 전하느라 지난 5일동안 10시간도 못 잘 정도로 고된 일정을 소화한데 대한 보상임에 틀림없다고 믿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잘 즐기고 오라”는 말을 기대하고, 서울에 있는 데스크에게 전화했다.
그러나 수화기 건너편에 있는 사람의 생각은 180도 달랐다. “체험기를 준비하자. 독자들이 오거스타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사소한 것까지 꼼꼼하게 취재해 전달해보자.” 1억원짜리 로또는 그렇게 숙제가 돼버렸다.

체험기는 둘째치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골프채 확보였다. 오거스타GC 관계자는 “그린피, 캐디피, 식사까지 골프장이 책임진다. 공과 채는 알아서 구하라”고 했다. 티오프 시간은 11일 오전 11시. 일요일(10일)에 인근 골프숍이 모두 문닫은 탓에 티오프 두시간 전에야 골프숍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무테 안경을 쓴 주인에게 “클럽 대여비가 얼마냐”고 묻자 퉁명스럽게 “대여 안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2시간 뒤 오거스타에서 티오프한다”며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주인장의 표정이 바뀌었다. “오거스타 옆에서 평생 살았지만 한번도 못가봤다. 나 대신 클럽을 보낼테니, 오거스타의 흙과 잔디를 많이 묻혀와달라.”
주인은 “돈은 안받겠다”"며 본인 소유의 채를 그냥 내줬지만, 50달러를 건넸다. 고마운 마음에 골프공도 24개나 구입했다. 이제 챙길 건 다 챙겼다. 엑셀을 밟는 오른 발에 힘을 줬다.

오거스타내셔널GC는 외부인들에게는 좀처럼 ‘속살’을 공개하지 않는다. 전 세계 유명인 중 딱 300명 안팎에게 멤버십 회원을 부여하는데, 이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는 한, 제 아무리 돈 많은 기업인이건 유명 스타이건 클럽하우스로 들어가는 입구인 '게이트3'를 통과할 수 없다.
그런 게이트3를 기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통과했다. 흰색 제복을 입은 수문장은 초청장과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한 뒤 큼지막한 무쇠 바리케이드를 내렸다. 그러자 도로를 사이에 두고 줄 지어선 울창한 목련나무 60그루가 기자를 맞이했다. 오거스타GC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매그놀리아 레인(목련나무 길)’이다.

터널을 서행하며 지나자 시야가 확 트였다. 2층짜리 흰색 클럽하우스가 한눈에 들어왔다. 평범한 미국 가정집을 조금 크게 확대한 모양새다. 내심 기대했던 '럭셔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건물 외관의 고급스러움만 따지면 웬만한 한국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었다.

클럽하우스 앞에 차를 대자 직원 서넛이 모여들었다. 한명은 트렁크를 열어 골프백을 내렸고, 다른 한명은 차 문을 열어주면서 발렛 티켓을 건넸다. 눈을 돌리니 또 다른 직원은 클럽하우스 정문을 잡은 채 "들어오라"며 손짓했다.

그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도착한 곳은 '챔피언스 온리'란 팻말이 선명하게 붙은 '챔피언스 로커'. 마스터스 역대 우승자 55명에게만 허락된 곳이다. 로리 매킬로이도, 어니 엘스도, 브라이슨 디섐보도 열어보지 못한 로커를 기자가 쓰는 영광을 누렸다. 매킬로이처럼 마스터스에서 우승하지 못한 선수들은 옆 건물에 있는 일반 로커를 쓴다. 28개 옷장마다 두 명의 챔피언 명패가 붙어있다. 기자에게 배정된 로커의 주인은 1955년 챔피언 캐리 미들코프와 1988년 챔피언 샌디 라일이었다.


챔피언스 로커 중앙에는 전년도 마스터스 우승자인 마쓰야마 히데키의 그린재킷과 셔츠, 시합 때 쓴 웨지, 스코어카드 등이 전시돼 있다. 내년에 당첨된 기자들은 올해 우승자인 스코티 셰플러의 그린재킷이 맞이할 것이다.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를 따라 야외 연습장으로 향했다. 마스터스 대회기간 선수들이 연습하던 바로 그곳이다. 이날 함께할 기자의 전담 캐디는 이미 연습장에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찜해놓은 곳은 김시우가 3라운드에 나서기 전에 연습했던 자리였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연습 라운드부터 진땀 뻘뻘72세 흑인 남성 캐디는 오거스타GC에서 12년동안 일해왔다고 했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월터라고 부르면 된다고 했다. 월터는 기자가 웨지를 꺼내든, 드라이버를 치든, 7번 아이언을 고르든 언제나 "좋은 선택"이라고 맞장구를 쳐줬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는지,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싶었던 모양이다.
공 그린에 놓자 저 멀리 굴러
전담 캐디로 만난 72세 월터
"실제 그린은 더 빠르다"며 웃음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아놓은 타이틀리스트 공은 새 공이 아니면 'A급 로스트 볼' 수준이었다. 치기 미안할 정도로 광이 났다. 오거스타내셔널은 타이틀리스트 브랜드 공만 들여놓는다.
후덥지근한 날씨 때문인지, 긴장한 탓인지, 10분 만에 온 몸이 땀에 젖었다. 그걸 봤는지, 월터는 "그린에서 연습을 해보지 않겠냐"고 했다. 우즈처럼 무심하게 공 2개를 그린에 툭 던지고 퍼터를 건네 받으려 잠깐 고개를 돌린 사이, 공은 저멀리 굴러갔다. 머리를 긁적이자 월터는 "실제 그린은 더 빠르다"며 껄껄 웃었다.

정신을 부여잡고 머릿 속엔 두가지만 떠올렸다. 당첨을 통보받은 9일 임성재 선수와 데이비드 마허 아쿠쉬네트 최고경영자(CEO)가 건넨 조언. 임 선수는 "바람 신경쓰지 말고 페어웨이 한가운데 공을 보내는데 집중해라"고 했고, 마허 CEO는 "절대 길게 치지 말아라. 짧게 쳐서 오르막 퍼팅을 하는게 좋다"고 했다.
그렇게 1번홀(파4) 티박스에 올라섰다. 세계 랭킹 50위 톱 랭커들만 오를 수 있는 티박스에 서게 되다니 믿기질 않았다. 섭씨 25도로 다소 더웠지만 코끝을 스치는 잔잔한 바람, 구름한점 없는 하늘...날씨는 완벽했다. 대회 때 1번홀 주변을 가득메운 갤러리들의 함성이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다. 티박스에서 정면으로 홀을 바라보자 위압감에 숨이 턱 막혔다. 동반자들과 인사치레로 나눈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 왼볼엔 작은 경련마저 느껴졌다.
1번홀은 정작 마스터스 대회 취재 때는 가까이 가보지도 못했다. 갤러리가 너무 많았던 탓에 1번홀 티박스에 선 골퍼를 보는 건 멀리서 까치발을 들고서도 힘들었다. 그러고보니 기자가 선 곳은 선수들이 친 '마스터스 티(445야드·407m)'가 아니라 아마추어 회원들이 치는 '멤버 티'(365야드·333m)다.
한국 골프장의 '화이트 티'(아마추어 남성 티)와 거리는 별반 차이가 없지만, '오거스타 루키'에겐 위압적이었다. 티샷은 경사 10도가 넘는 언덕을 넘어야 했고, 오른쪽에 하얗게 입을 벌리고 있는 커다란 벙커도 피해야 했다. 그린은 보이지도 않았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드디어 티오프 …"레츠고, 희찬!"어느새 티오프 시간인 11시가 됐다. 동반자인 AP통신, 게티이미지, 영국 더선 기자들과 순서부터 정했다. 티를 던져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부터 시계 방향이었다. 기자는 다행히 맨 마지막 순서였다. 동반 기자들도 극도로 긴장하긴 마찬가지. 1~3번 타자 모두 티샷이 페어웨이를 지키지 못하고 좌우로 흩어졌다. 순간 3명의 다른 기자와 4명의 캐디의 눈길이 모두 기자로 향했다. 마치 ‘우리의 자존심을 너라도 지켜달라’는 투의 기대감이 가득한 시선이었다. 링 위에 선 복서 마냥 시야가 좁아지고 숨이 턱 막혔다. 11년전 미국 애리조나의 이름 모를 골프장에서 처음 티샷을 쳤을 때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혼미한 정신 부여잡고 1번홀
티박스 서자 긴장감에 '패닉'
동반자들 시선, 기자에게 집중
'땅' 힘차게 티샷 날렸으나…
두번 연습 스윙을 한 뒤 자세를 잡았다. "레츠 고, 존(기자의 영어이름)!" AP통신 기자가 힘껏 외쳤다. 최대한 힘을 빼고 허리를 돌렸다. '땅'. 클럽 헤드가 공을 맞추는 소리는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꿈의 라운드가 시작됐다.
평균타수 90…비거리는 200m
골프 기자로서의 목표는 두 가지다. 타이거 우즈 단독 인터뷰와 30년 뒤에도 골프 기자를 하는 것이다.
▶ (2회) 우즈도 떤 '유리알 그린' 실감…이게 실화냐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4184525i
▶ (3회) 지옥 같은 '헬(hell)렐루야'…악명 높은 오거스타 '바람의 심술'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4197384i
▶ (4회·끝) 우즈가 인생 최악 샷 날린 12번홀, 보란듯 그린에 올렸지만…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4200055i
※ '조희찬 기자의 오거스타 도전기' 전체 기사는 한경닷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거스타(미국 조지아주)=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