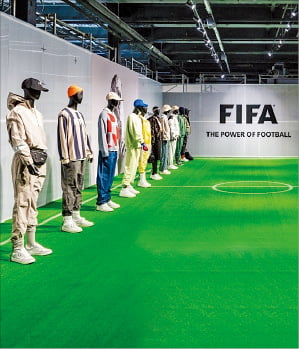 올해 1월 미국 완구업체 마텔이 디즈니의 공주 캐릭터 장난감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마텔이 연 3억달러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소식이 알려진 당일 마텔 주가는 10% 이상 뛰었다. 반면 경쟁업체인 해즈브로의 주가는 하락했다.
올해 1월 미국 완구업체 마텔이 디즈니의 공주 캐릭터 장난감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마텔이 연 3억달러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소식이 알려진 당일 마텔 주가는 10% 이상 뛰었다. 반면 경쟁업체인 해즈브로의 주가는 하락했다.이 같은 라이선스는 마케팅에서 자주 활용되는 브랜드 전략이다. 올해 패션업계에선 단연 ‘라이선스 브랜드’가 가장 큰 화두로 통한다. 한경 CMO 인사이트의 마케팅 케이스 스터디(사례 분석)는 라이선스 브랜드를 앞세워 약진하고 있는 코웰패션을 소개했다.
2002년 창업한 코웰패션은 자체 브랜드가 전무했다. 당시는 삼성물산의 빈폴과 LF의 헤지스 같은 다양한 ‘TD(트래디셔널 캐주얼)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었을 때였다. 자체 브랜드를 만들 자본이 턱없이 부족했던 코웰패션은 시선을 해외로 돌렸다. 패션 대기업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언더웨어와 스포츠의류 브랜드를 하나둘 가져왔다. 코웰패션은 2010년부터 푸마, 아디다스, 리복 등과 손을 잡고 언더웨어 상품을 전개했다. 이들은 모두 국내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었지만, 언더웨어는 판매하지 않았다. 글로벌 브랜드 입장에서도 코웰패션을 활용해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니 ‘윈윈’ 전략이었던 셈이다.
코웰패션의 영업이익률은 지난 5년 동안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 패션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넘지 못한다는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임종민 코웰패션 대표는 “사업 초기 자체 브랜드를 전개할 것인지 아니면 라이선스 브랜드를 가져올 것인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며 “해외 브랜드의 힘을 이용한 전략이 신의 한 수였다”고 말했다.
코웰패션은 현재 20개 의류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다. 한때는 유행에 민감한 캐주얼 상품을 전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 대표는 그런 상품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점을 깨달았다. 캐주얼 의류는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한번 트렌드에 뒤처지면 사업 자체가 위태해질 수 있어서다.
 시행착오 끝에 스포츠웨어를 중심으로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스포츠웨어는 디자인이나 스타일이 유행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이 장점이다. 의류의 기능성과 성능만 잘 유지된다면 소비자들은 상품을 계속 구매한다. 코웰패션이 스포츠웨어와 속옷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법이다. 최근에는 캘빈클라인 등 해외 브랜드의 애슬레저(평상복처럼 입는 스포츠웨어) 상품을 출시하는 등 스포츠웨어 부문을 더 확장하고 있다.
시행착오 끝에 스포츠웨어를 중심으로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스포츠웨어는 디자인이나 스타일이 유행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이 장점이다. 의류의 기능성과 성능만 잘 유지된다면 소비자들은 상품을 계속 구매한다. 코웰패션이 스포츠웨어와 속옷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법이다. 최근에는 캘빈클라인 등 해외 브랜드의 애슬레저(평상복처럼 입는 스포츠웨어) 상품을 출시하는 등 스포츠웨어 부문을 더 확장하고 있다.천성용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코웰패션은 라이선스 브랜드의 높은 인지도 덕분에 마케팅 비용을 낮추고 새로운 시장 진입에 따른 리스크도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브랜드 가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라이선서(Licensor)의 마음’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므로 브랜드를 빌려온 라이선시(Licensee)는 분산투자처럼 라이선스 브랜드의 분산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