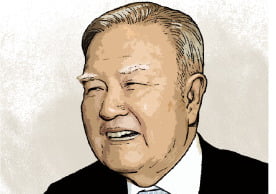 어제 별세한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만큼 대학 밖에서 다양하게 활동한 학자도 드물다.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고, 서울시장도 역임했다. 정계 투신 이후 역정은 더 화려했다. DJ정부 시절 민주당 후보로 민선 1기 서울시장에 당선됐고,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다. 중도 사퇴하긴 했지만 대선에도 나선 걸 보면 화려한 그 이력의 종착 목적지는 대통령이었을까.
어제 별세한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만큼 대학 밖에서 다양하게 활동한 학자도 드물다.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고, 서울시장도 역임했다. 정계 투신 이후 역정은 더 화려했다. DJ정부 시절 민주당 후보로 민선 1기 서울시장에 당선됐고,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다. 중도 사퇴하긴 했지만 대선에도 나선 걸 보면 화려한 그 이력의 종착 목적지는 대통령이었을까.고인은 경제학계의 거목이었다. 그의 《경제학원론》은 대학가의 초장기 인기 교과서였다. ‘조순 사단’이라는 그의 제자 그룹을 빼고는 한국 경제학계를 말하기도 어렵다. 정운찬 전 총리를 비롯해 학계·관계·산업계 곳곳에 넓게 포진해 있다. ‘학현학파’라는 변형윤 교수 라인도 있고, 서강학파라는 말도 낯설지 않지만 적어도 수적으로는 조순학파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한학 공부를 한 1세대 미국 유학파 경제학자였으니 그의 공직 활동을 두고 관운이 좋았다고만 한다면 폄하가 될 것이다. 짙은 흰 눈썹으로 일찍부터 ‘산신령’ ‘포청천’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미지도 좋았다. 예나 지금이나 선거와 정무직 인사에서는 인상과 외모, 무난한 성격이 반절은 먹고 들어간다. 더구나 20년간 길러온 ‘서울 상대’ 제자들은 경제성장기에 한국 사회 파워엘리트로 속속 자리 잡았다. 주중에는 좌우보혁으로 다투면서도 주말이면 “교수님께 인사 가자”며 견고한 동료 의식을 다지는 관변학자들이 최근까지도 더러 보였다.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 다 지냈지만 재임 때 속은 편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제기획원 그때나 지금의 기획재정부에서나 노회한 수석 부처의 관료들을 이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겉으로는 ‘백조집단’이지만 물밑으로는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학계, 금융·산업계로 이해관계가 겹겹이 연결된 두뇌집단이다. 당시 그는 관행을 깨는 인사 등으로 관료들 불만도 적지 않게 샀다.
많은 교수가 ‘조순 스타일’의 사회 참여를 꿈꿀지 모른다. 현실 참여는 경세제민을 탐구하는 경제 전공자만의 도전 영역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학문하는 이에게 ‘바깥세상’은 여전히 거칠다.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폴리페서’라는 비판이나 듣기 십상이다. 고인은 그래도 깨끗한 정치, 혁신적 서울시 행정 시도로 주목도 많이 끌었다. 본인만의 이상이 있었던 것이다. 선생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
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