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7458억원 규모 충남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입찰에서 두산중공업은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을 제치고 낙찰자로 선정됐다. 당락을 가른 것은 기술력도, 가격 경쟁력도 아니었다. 참여 7개사가 써낸 입찰가의 평균값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제시한 ‘운’ 덕분이었다.
기술력보다 운에 달렸다고 해서 ‘운찰제’로 불리는 공공 공사 종합심사 낙찰제의 한 단면이다. 법 제정 후 60년 동안 시공과 설계 겸업을 금지한 건축법 등 한국 건설산업의 ‘갈라파고스화’를 심화하는 규제와 낡은 법규는 곳곳에 암초처럼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건설산업이 해외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데는 ‘도토리 키재기식’ 경쟁을 유도하는 입찰제, 시대와 동떨어진 칸막이 규제 등도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대형 건설사 핵심 관계자는 “기술보다 중간값 맞히기가 당락을 가르는 운찰제로는 전문 분야의 기술 경험을 축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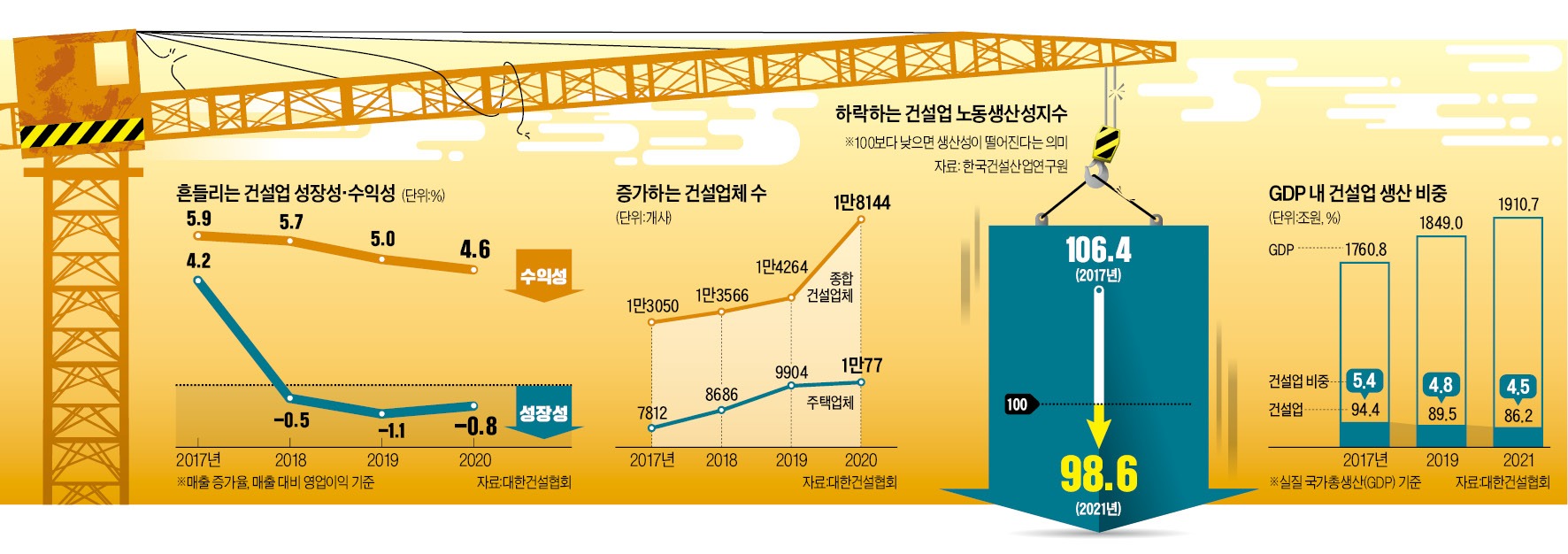
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300억원 이상 공공 공사 입찰 때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국내 건설사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 종전 최저가낙찰제에서 나타난 덤핑 낙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종심제는 가격뿐 아니라 공사 품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였다. 최종 평가 점수는 전문성·역량을 보는 공사 수행 능력(만점 50점)과 입찰 가격(만점 50점)으로 계산한다.
문제는 종심제에선 건설사별 공사 수행 능력이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비슷한 분야에서 일정 정도의 수주 기록만 있으면 통상 만점을 주는 구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진행한 대다수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두 곳 중 한 곳꼴로 공사 수행 능력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결국 역량 평가는 유명무실해지고, 입찰 가격 평균인 균형가격에 근접한 가격을 낸 건설사가 낙찰받는 기형적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세종신청사, 산청~신안 국도 건설, 울산 북신항 부두 축조, 당진 가스탱크 건설 등 최근 1~2년간 입찰에 나선 크고 작은 공공 공사가 모두 이런 방식으로 낙찰 회사가 결정됐다. 건설사 한 고위 임원은 “대형 공사 수주에 별다른 기술 혁신을 요구하지 않는데 어떤 대표가 인력 양성이나 기술개발에 투자하겠느냐”며 “공공 공사 입찰 제도의 허점이 결국 건설사의 역량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심제를 도입한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해 2019년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내놨으나 아직도 실행되지 않고 있다. 공공 계약 제도를 혁신 촉진형으로 바꾸기 위해 기술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찰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잦은 담당자 교체 등을 이유로 도입을 미루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훈령만 바꿔도 어렵지 않게 이런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데도 기재부가 손을 놓고 있어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설계 경험 부재는 건설사의 해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수익성이 높은 해외 PM(계획·설계·구매 조달·시공 및 감리·운영 관리) 부문을 공략해야 하지만 설계 경험 자체가 없어 도전장을 내미는 게 쉽지 않다. 건설사 해외 영업 담당자는 “시공을 겸업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우리만 제정된 지 60년도 넘은 건축법 때문에 설계 경험을 쌓을 수 없어 해외 수주 경쟁에서 갈수록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하헌형 기자 kej@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