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보다 아름다운 시를
내 다시 보지 못하리.
허기진 입을 대지의 달콤한 젖가슴
깊숙이 묻고 있는 나무
온종일 잎에 덮인 두 팔을 들어 올린 채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는 나무
여름이 오면 머리 한가운데
울새 둥지를 이고 있는 나무
그 가슴에 눈이 내리면 쉬었다 가게 하고
비가 오면 다정히 말을 건네주는 나무
시는 나 같은 바보들이 만들지만
나무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다네.
* 조이스 킬머(1886~1918) : 미국 시인.
--------------------------------
(휴가들 잘 다녀오셨죠? 저도 잘 쉬었습니다. 이 시와 관련, 최근 출간한 『나무 심는 CEO』(고두현, 더숲) 서문에 몇 가지 얘기를 담았습니다. ESC 시대의 ‘부름켜 경영’, 괴테가 식물학자였던 이유, 테슬라 니콜라가 괴테의 시에서 ‘전기 혁명’ 아이디어를 떠올린 과정 등을 언급했죠. 함께 읽고 음미해 보실까요? 이번엔 경어체 대신 책 원문을 그대로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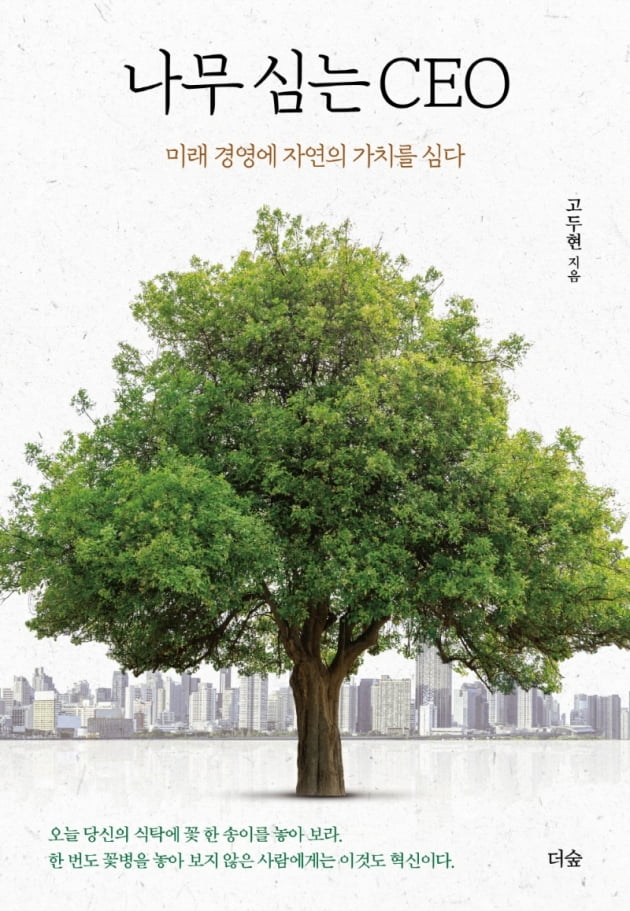
-대들보 인재 키우는 법과 생태 경영 노하우
대지에 발을 딛고 서 우주로 팔을 벌린 형상이 곧 나무[木]다. 그 밑동에 ‘한 일(一)’자를 받치면 세상의 근본[本]이 된다. 나무는 이렇게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넘나들며 지상과 천상을 연결한다.
나무는 뛰어난 인재(人材)를 의미한다. 목조건축이나 기구를 만드는 데 쓰는 나무를 재목(材木)이라고 한다. 이 또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거나 어떤 직위에 합당한 인물’을 가리킨다. 예부터 될성부른 떡잎과 들보로 쓸 만한 동량(棟梁)을 나무에 비유했다.
나무는 성장을 의미한다. 파종부터 발아, 개화, 결실까지 지속가능한 성장의 표본이다. 친환경 성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생태 경영’과 ‘녹색 경영’, ‘미래 경영’의 핵심 화두이기도 하다.
부름켜는 나무줄기의 물관과 체관 사이에 있다. 물관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양분을 보내는 길이고, 체관은 잎에서 만든 영양분을 줄기와 뿌리로 보내는 길이다. 두 갈래 길 사이에 있는 부름켜는 나무의 성장과 생육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무와 달리 풀에는 부름켜가 없어 줄기가 가늘고 잘 휘어진다.
부름켜는 나무 안쪽에 목재를 만들고 바깥쪽에는 껍질을 만든다. 봄과 여름에는 세포분열이 활발한 까닭에 크고 연한 세포를 많이 생성한다. 식물호르몬도 그만큼 왕성하게 분비한다. 가을에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 세포가 작고 단단해진다. 이 두 세포층이 줄기 안에서 겹겹이 교차하며 매년 만들어내는 경계가 바로 나이테(연륜)다.
겨울에는 어떤가. 나무는 추위가 닥치기 전에 ‘떨켜’를 준비하며 스스로 잎을 떨어뜨린다. 떨켜는 잎이 떨어진 자리에 생기는 세포층을 말한다. 떨켜 아래에는 보호막이 있어 외부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줄기의 수분이 잎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 역할도 한다. 나무가 혹한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떨켜를 통해 몸통을 지키고 힘을 비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잎이 지는 데에도 차례가 있다. 성장호르몬 분비가 끝나는 순서에 따라 가장 먼저 돋아난 잎이 가장 늦게 떨어지고, 가장 늦게 돋은 잎이 제일 먼저 떨어진다. 신기한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 헨리 소설 ‘마지막 잎새’는 지난봄 맨 먼저 나온 잎일 가능성이 높다.
요즘 경제?경영계의 최대 관심사인 ‘ESG 경영’이나 ‘녹색 경영’도 마찬가지다. ESG는 기업이 친환경(Environment)과 사회적(Social) 책임에 앞장서며,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Governance)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는 개별 기업을 넘어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했다. 이것을 잘 활용하고 소비자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도 부름켜와 떨켜의 원리를 닮았다. 성장과 내실의 균형이 깨어지면 나무의 건강 상태가 나빠진다.
소비자 트렌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변한다. 젊은 소비자일수록 더 그렇다.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MZ 세대의 74%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친환경 정책 수립과 활동이 필수”라고 응답했다. 이들의 ‘ESG 감수성’이 기업 마케팅의 방향까지 바꾸고 있다.
한동안은 친환경 이벤트의 하나로 에코백과 텀블러를 내놓는 기업이 많았다. 하지만 요즘 소비자들은 이런 걸 반기지 않는다. 일회성 이벤트의 가벼움이나 기업의 신뢰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잘못하면 ‘그린 워싱(위장환경주의)’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그러니 제품 기획 단계부터 소비자의 ‘ESG 감수성’에 맞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식물변형론』이라는 책에서는 식물 잎의 변화를 세분화하고 ‘꽃을 이루는 기관은 잎이 변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밝혔다. 이런 노력 덕분에 그의 이름을 딴 ‘괴테 식물(Goethe plant)’이 등장했다.
그는 이런 식물의 인문·과학 정신을 시로 융합해냈다. 그러면서 “다들 과학이 시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시대가 바뀌면 두 분야가 더 높은 차원에서 친구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내다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시와 과학을 접목한 그의 사상은 근세 서양철학과 음악, 미술의 자양분이 됐다. 헤겔과 쇼펜하우어 등 사상가와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등 음악가, 세잔, 모네 같은 화가들도 그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괴테는 독일을 대표하는 대문호이면서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으로 나라를 이끈 국가경영자이기도 했다. 이 모든 게 식물의 생태인문학에서 시작됐으니, 나무와 숲에서 얻은 영감과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이때의 나무야말로 ‘전기 혁명’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영감의 안테나다. 그 테슬라의 이름이 전기자동차와 우주산업의 신기원을 열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회사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더욱 놀라운 일이다.
그러고 보니 종이책의 재료도 나무다. 활자와 여백 사이에서 반짝이는 부싯돌로 우리 영혼의 불빛을 밝혀 주는 나무! 그 빛이 우리 내면의 땔감에 불을 붙이고, 상상력의 예각을 넓혀주기도 한다. 미국 신학자 존 파이퍼는 그 과정을 이렇게 멋진 말로 표현했다.
“많은 책을 읽는 것은 나무를 한곳에 모으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나뭇더미에 불을 지르는 것은 단 하나의 문장이다.”
참으로 절묘한 표현이다. 우리가 읽는 수많은 책 속에는 ‘나뭇더미에 불을 지르는 단 하나의 문장’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다만 그것을 언제 발견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푸른 잎을 흔드는 나뭇가지로 안테나를 세우고 행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 고두현 시인·한국경제 논설위원 : 199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 시집 『늦게 온 소포』,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 『달의 뒷면을 보다』 등 출간. 시와시학 젊은시인상 등 수상.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