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에스파스 루이 비통 서울’의 맨 꼭대기 층에는 자그마한 전시장이 있다. 지난 2019년에 자코메티의 중·후기 작업의 정수로 평가받는 조각 여섯 점이 이곳에 전시된 바 있다.
자코메티 아틀리에의 뉘앙스를 상징적으로 재현한 듯한 이 잿빛 공간에서는 자코메티 조각의 대표적 특질, 즉 지나치게 가느다란 팔다리, 지나치게 작은 두상, 지나치게 큰 발이 자아내는 불균형성이 기이한 균형감을 이루고 있었다. 철저히 원근법을 따른 황금 비율 덕에 엄연한 물성을 지닌 조각이 소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스라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자코메티의 조각은 예나 지금이나 그 자체의 불완전함을 통해 보는 이들을 세상의 불균형과 균형의 이질감을 통찰하는 철학자로 변모시킨다.
완전한(혹은 그렇다 믿는) 인간에게 종교는 무용지물이고, 행복한(혹은 그렇다 믿는) 인간은 실존 따위를 고민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자코메티의 작업을 언급할 때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인 ‘인간 실존을 다룬 궁극의 조각’이라는 문장 역시 태생적으로 불완전한 실체에서 기인한다.
자코메티의 조각들은 특히나 말이 없다. 현실에서는 죽기 직전까지 성과 속의 경계를 넘나들던 그가 자기 작업만큼은 가히 사제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침묵과 고독의 세계에 봉인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쓰러지는 남자(Homme Qui Chavire)>는 여러모로 특별하다.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나 사뮈엘 베케트(Samuel Beckett) 같은 실존주의자들이 피력한바 거대한 운명에 어찌할 수 없이 휘말리는 인간의 나약한 실존이 담긴 작품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나는 자코메티의 전시장에 세 번 갔었는데, 이 작업은 볼 때마다 다른 느낌을 전했다. 처음에는 ‘안정과 추락이 교차하는 순간에 놓인 인간의 모습’, 그저 쓰러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아슬아슬한 모습에 기를 쓰며 사는 나를 완전히 투사했기 때문인지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두 번째로 볼 땐 이 ‘쓰러지는 남자’가 한 발을 크게 내딛어 쓰러지지 않았는지, 혹은 바닥에 얼굴을 처박으며 쓰러져 크게 다친 건 아닌지 새삼 궁금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났을 때는 어쩌면 그가 쓰러지지 않으려 애쓰는 게 아니라 잘 쓰러지고자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급기야 이 쓰러지는 남자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긴 팔은 활처럼 완만하게 굽어져 있고 두 다리는 엉거주춤하며 발뒤꿈치도 어정쩡하지만, 무엇보다 <쓰러지는 남자>의 백미는 뒤로 젖힌 고개다. 너무 애쓰지도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않았음을, 그 의지의 정도를 적절한 각도로 젖혀진 고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포즈는 오히려 인간이 걷거나 서 있는 모습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보편적으로 다가오는데, 쓰러지는 남자를 대하는 자코메티의 애정 어린 눈빛이 느껴지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전시 브로슈어의 글에는 “단지 서 있기 위해 엄청난 기운을 들여 버티는 듯한 인물을 묘사하여 인간의 나약함”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며, “극적인 인간의 본질을 가장 강렬한 한순간, 구체적으로 연약함이 보이는 순간으로 재현했다”고 쓰여 있다. 맞는 말이다.
다만 자코메티가 부피도, 무게도 모두 소거한 채 무중력을 떠도는 듯한 이 인간 형상들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게 희망이었는지, 절망이었는지, 그 사이의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모를 일이다. 언젠가는 쓰러질 수 있음을, 더 나아가 어느 때에는 반드시 쓰러져야 한다는 진실을 인정하는 것과 부인하는 건 천지 차이이기 때문이다.
자코메티의 작품을 본다는 건 곧 한없이 불완전한 인간이었던 그가 예술가로서는 얼마나 강박적으로 완벽주의를 추구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물 탐구에 집착적으로 몰두하던 그는 자신이 인식한 대로 모델을 재현하는 것이 결국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다.
그의 조각의 몸은 점점 가늘어지고 점점 위태로워졌다. 결국 조각에 최소한의 선만 남게 된 건 극도의 단순화를 통해 존재감을 역설하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즉 조각을 조각 자체가 아닌 공간의 일부로 남기는 것이 본인이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다름아닌 무거운 청동 재료로 구현한 것도 단 몇 개의 선으로 구성된 인물의 형상만으로 당대 인간상은 물론 그들이 놓인 공간, 세상, 세계의 의미까지 담아내고자 한 완벽주의가 승화된 결과물인 셈이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자코메티는 이 경지를 강렬히 욕망했으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덕분에 현시대의 우리는 이게 가능했음을 알게 되었다.
보는 대로(원하는 대로) 그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던 자코메티의 말마따나 생각하는 대로(바라는 대로) 사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완벽한 작품도 없고 완벽한 존재도 없으며, 따라서 완벽한 삶도 없다. 어쩌면 오늘날 가장 비싼 값에 팔리는 자코메티의 작품들은 실은 모두 미완성일지도 모르겠다.
매 순간 존재를 고민하는 우리를 향해, 결코 완벽하지 못했던 한 인간이 생의 전부를 걸어 덜어 내고 비워낸 미완의 것들이 비밀스럽게 용기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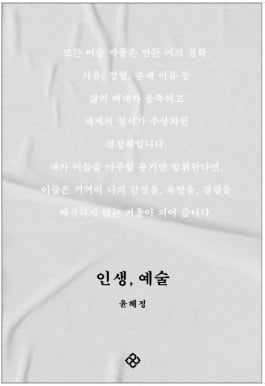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