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소재 A골프장 경영진은 내년 사업계획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 개정으로 당장 내년 1월 ‘대중형’으로 전환할지 ‘비회원제’로 남을지 결정해야 하는데 세금과 그린피 등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다보니 어떤 선택이 좋을지 도통 감을 잡을 수 없어서다. 당초 회원제로 출발했던 이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간 출혈경쟁과 골프 수요 감소 등으로 반환해야할 입회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 2016년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회생 과정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회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2017년 대중제로 전환했다. 그 후 3년에 걸쳐 겨우 골프장을 정상화시킨 상황에서 갑자기 ‘그린피를 낮춰 대중형 골프장이 되든지, 재산세를 더 내는 비회원제 골프장이 되라’는 선택을 강요받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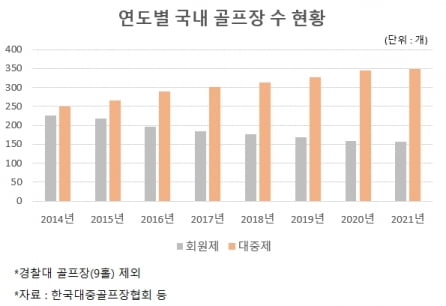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린피와 세금으로 요약된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되려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한 수준으로 그린피를 맞춰야 하고,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남으면 현재(토지 0.2~0.4%, 건물 0.25%)보다 높은 재산세율이 부과돼서다. 대중형 골프장 전환요건에 그린피 인하가 기재돼있진 않지만 ‘(그린피를)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서 문체부 장관의 고시 금액을 뺀 금액보다 낮게 책정할 것’이란 규정이 사실상 요금 인하를 의미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가성비를 갖춘 대중형 골프장을 앞세워 골프 대중화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지만 새 법을 적용받는 대중제 골프장들은 “시장 원리를 무시한 가격 통제”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A골프장 임원은 “대중제 골프장은 성수기와 비수기뿐만 아니라 아침과 저녁의 그린피도 다를 정도로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크다”며 “시장에 맡겨야할 그린피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사실상 징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수도권 대중제 골프장 대표는 “비회원제를 택한 골프장이 커진 세금 부담만큼 그린피를 인상한다면 대중형 골프장만 요금을 낮춘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을 높이는 내용에 대한 반감도 상당하다. 대중제 골프장 운영사들은 “회원을 모집하는 것도 아님에도 회원제처럼 비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 중과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골프업계 관계자는 “대중제 골프장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는 데 대한 상응 조치”라며 “이제와서 재산세를 중과하면 위헌 소지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정부에 직접 개정안의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대중제 골프장 운영사 10여곳은 지난달 말 그린피를 시장 자율에 맡기고 해당 개정안을 면밀히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의견서 작성과정에서 로펌들로부터 법률자문까지 받았을 정도로 법적으로 합당한지 면밀히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대중제 골프장 운영사들은 “내년 사업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 대부분은 적잖은 차입을 통해 지어진다. 골프장 영업을 시작해 벌어들이는 돈으로 골프장을 만들 때 빌린 돈을 갚아나간다. 회원권 분양을 통해 빚을 갚고 곧바로 영업에 들어가는 회원제와 다른 점이다. 그런데 대중제 골프장이 그린피를 낮춰 대중형으로 전환하면 수익 감소로 차입금 상환이나 연장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비회원제로 남으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
한 대중제 골프장 임원은 “당장 다음달이면 내년 사업계획을 짜야하는데 그린피 인하와 재산세율 인상 중 뭐가 그나마 나은 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중요한 사안을 내년 초 벼락치기로 결정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