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각장애인은 TV를 어떻게 볼까. 소리만으로 내용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 TV를 켠 뒤 눈을 감아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드라마 주인공의 표정이나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 없이 흐름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시각장애인에게 화면 속 인물의 표정과 움직임, 배경 등을 말로 설명해주는 ‘화면해설 방송’이 필요한 이유다.
최근 출간된 <눈에 선하게>는 10년간 화면해설방송 대본을 써온 베테랑 화면해설작가 권성아(51), 김은주(46), 이진희(46), 임현아(37), 홍미정(51) 작가 다섯 사람이 함께 쓴 에세이다.
“화면해설작가란 직업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게 저희가 책을 쓴 이유예요.” 지난 19일 서울 합정동의 카페에서 만난 저자들에게 집필 계기를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국내 첫 화면해설방송이 전파를 탄 건 2001년 4월 19일 MBC ‘전원일기’ 1000회였다. 20년이 지났는데도 화면해설방송이 낯선 건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 작가는 “법이 정해둔 화면해설방송 의무 비율은 방송사별로 연간 5~10% 수준”이라며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즐겨보던 드라마의 결말을 영영 알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적용 대상도 아니다.
이들이 화면해설작가의 세계를 더 많이 알리기로 결심한 건 이런 무관심을 걷어내기 위해서다. 그래야 더 많은 시각장애인이 ‘눈에 선하게’ 세상을 만날 수 있으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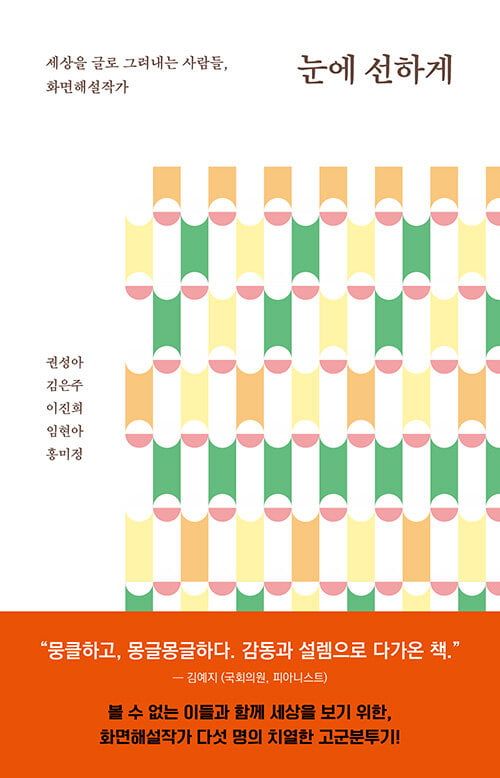
책에는 이들이 느끼는 ‘일하는 기쁨과 슬픔’이 진솔하게 담겼다. 작가들은 첫 방송 직후 잡힌 재방송 일정에 맞춰 대본을 쓰느라 수시로 밤을 샌다. 대사와 음향효과 사이, 좁은 틈에 효과적인 해설을 끼워 넣느라 머리를 쥐어뜯는다. 이 작가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이 모습은 어떻게 해설하지’ 생각이 들어 여행할 때도 제대로 못 쉰다”고 했다. 임 작가는 “다큐멘터리, 역사극 등을 설명하려면 다양한 배경지식이 필요해 늘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음이나 내용 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도 많다. ‘비니를 썼다’는 ‘비닐을 썼다’로 오해할까 봐 ‘니트모자를 썼다’로 고쳐 쓴다. 홍 작가는 “‘앉은뱅이책상’ ‘벙어리장갑’처럼 장애인을 폄하하는 낱말은 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많은 시각장애인이 ‘화면해설방송 덕분에 내용을 이해하게 됐다’고 하세요. 그 말, 참 중독성이 있어요.”
요즘엔 비(非)시각장애인 사이에서도 인기란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꿀 떨어지는 눈빛’에 대한 섬세한 묘사를 듣다 보면, 누군가 연애소설을 읽어주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다섯 사람은 더 좋은 화면해설방송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오는 26일부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접근센터 강의를 통해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화면에 보이는 모든 걸 그리려고 하면 오히려 듣는 사람이 혼란스럽다. 눈에 보이게 쓰려면 내 눈에 현혹되면 안 된다”(권 작가)는 실전형 조언들이다. 권 작가는 올해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되새기는 ‘흰지팡이 날(10월 15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눈에 선하게>는 조만간 국립장애인도서관을 통해 음성자료로 제작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