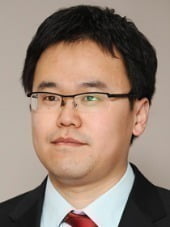 2020년 겨울 김용익 당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서울 마포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문재인 케어의 이념이 된 건보 보장성 확대를 설파했던 그는 17대 대선 캠프에서 문재인 케어를 설계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건보공단 이사장을 맡아 정책 실행을 이끌고 있었다. 한국경제신문은 그때도 문재인 케어의 집요한 비판자였다.
2020년 겨울 김용익 당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서울 마포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문재인 케어의 이념이 된 건보 보장성 확대를 설파했던 그는 17대 대선 캠프에서 문재인 케어를 설계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건보공단 이사장을 맡아 정책 실행을 이끌고 있었다. 한국경제신문은 그때도 문재인 케어의 집요한 비판자였다.기자를 마주한 김 전 이사장은 차분한 어조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보 혜택이 확대되면 결국에는 기업의 직원 복지 및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고, 개인 부담도 낮아져 경제 선순환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을 수치와 풍부한 해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상대의 논리와 단어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건강보험, 더 나아가 보건의료정책에서 김 전 이사장만큼 진정성과 실력을 갖춘 이를 찾기란 쉽지 않다. 소아마비 장애를 딛고 서울대 의대에 입학한 그는 1970년대부터 판자촌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했다. 서울대 교수 시절인 1987년에는 의료관리학교실을 설립해 의료정책 전문 인력을 양성했다. 직장과 지역별로 수백 개 나눠져 있던 건보조합 통합을 일찍부터 주장해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직접 추진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장기 복지 로드맵인 ‘비전 2030’ 작성을 주도했다.
하지만 김 전 이사장이 주도했던 문재인 케어는 지금 부도 위기에 몰려 있다. 지나친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확대로 관련 건보 지출은 2018년 1891억원에서 지난해 1조8476억원으로 급증했다. 놀란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보장성 축소를 발표했다. 한정된 자원을 검진과 대학병원 특진 지원에 투자하는 동안 필수 의료체계는 망가졌다. 왜곡된 건보 보상체계로 소아청소년 전공의가 급감하며 일부 대학병원에선 응급 진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단순히 ‘김용익의 실패’로 치부할 수는 없다. 저출산·저성장 시대로 바뀌는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느 정책이든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지금까지 각종 복지정책은 성장의 과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누기 위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고령화에 저성장이 겹치면서 기존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다. 건보만 해도 지금의 혜택을 유지하면 2050년에는 연간 적자가 24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 복리 확대 이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도 설계의 중심에 놓는 고민이 절실하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