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 서점가를 휩쓸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마음을 달래주는 게 인기 비결이란 설명이다. 시대가 불안할 때마다 정신과 의사들의 책이 잘 팔린다는 점에서 “반갑지 않은 현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0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 6권 나왔다. 업계에선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다.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부키)은 일본 정신과 의사가 썼다. 그는 학생 때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에 우울증까지 앓아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박윤우 부키 대표는 “아무리 환자를 많이 치료한 정신과 의사라고 해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이상 완벽히 환자를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훨씬 더 독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책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부키)은 일본 정신과 의사가 썼다. 그는 학생 때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에 우울증까지 앓아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박윤우 부키 대표는 “아무리 환자를 많이 치료한 정신과 의사라고 해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이상 완벽히 환자를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훨씬 더 독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책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영국 정신과 의사가 쓴 <몸이 아프다고 생각했습니다>(심심)는 만성피로증후군, 신경성 두통, 어지럼증 등 현대의학으로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는 증상의 환자들 고통을 마음에서 찾는다. <살아남기 위한 고통>(다다서재)은 약물 의존증 최고 권위자라는 일본 의사의 책이다.
영국 정신과 의사가 쓴 <몸이 아프다고 생각했습니다>(심심)는 만성피로증후군, 신경성 두통, 어지럼증 등 현대의학으로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는 증상의 환자들 고통을 마음에서 찾는다. <살아남기 위한 고통>(다다서재)은 약물 의존증 최고 권위자라는 일본 의사의 책이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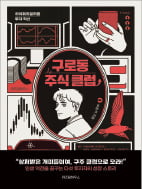 ‘주식 중독’도 정신과 의사가 조언을 건넬 수 있는 영역이다. <구로동 주식 클럽>(위즈덤하우스)은 소설의 형식을 빌려 주식 중독 치료 과정을 그렸다. 정신과 의사인 저자 박종석은 그 자신이 주식 중독에 빠져 전 재산을 날렸었다. 현재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2위에 올라 있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메이븐)도 정신과 의사의 책이다. 22년 전 마흔세 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한다.
‘주식 중독’도 정신과 의사가 조언을 건넬 수 있는 영역이다. <구로동 주식 클럽>(위즈덤하우스)은 소설의 형식을 빌려 주식 중독 치료 과정을 그렸다. 정신과 의사인 저자 박종석은 그 자신이 주식 중독에 빠져 전 재산을 날렸었다. 현재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2위에 올라 있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메이븐)도 정신과 의사의 책이다. 22년 전 마흔세 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한다. 정신과 의사들의 책이 인기를 끈 건 처음이 아니다. 1980년대 이시형 박사의 <배짱으로 삽시다> 이후 주기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대세 장르’와는 거리가 멀었다. 지금처럼 전방위적으로 정신과 의사들의 책이 쏟아져 나온 것은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박윤우 부키 대표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 대한 관심이 2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높아져 지금 정점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신과 의사들의 책이 인기를 끈 건 처음이 아니다. 1980년대 이시형 박사의 <배짱으로 삽시다> 이후 주기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대세 장르’와는 거리가 멀었다. 지금처럼 전방위적으로 정신과 의사들의 책이 쏟아져 나온 것은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박윤우 부키 대표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 대한 관심이 2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높아져 지금 정점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정신과에 관한 책을 읽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것도 인기 이유로 꼽힌다
조한나 심심 팀장은 “예전엔 쉬쉬했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개선하려고 한다”며 “특히 ‘무기력’이나 ‘불안’을 키워드로 한 책은 저자의 유명세와 상관없이 꾸준히 잘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