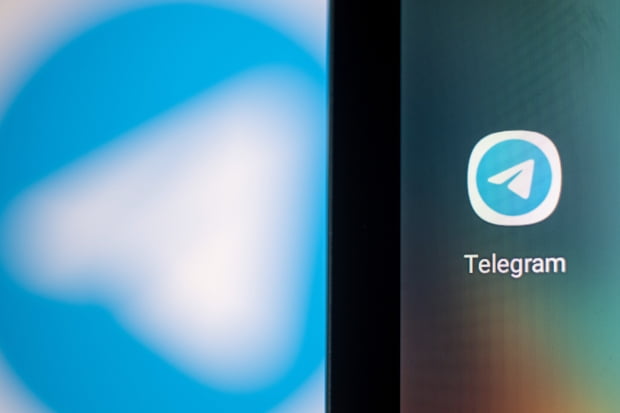
8일 오전 트위터에 '○○' '○○○' 등 이른바 마약 은어들을 입력하자 판매 계정이 주르륵 나타났다. 불과 5분 전부터 몇 시간 전까지 하루에도 수십개 이상 판매 게시글이 보였다. 한 게시물에 접속해 안내된 텔레그램 아이디로 "○○ 파나요?"라고 대화를 걸자 2분 만에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구매 의사를 밝히면 판매자는 계좌 입금을 받은 뒤 은밀하게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이른바 '던지기'라는 거래 수법이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온라인에선 마약 판매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보안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곤 한다. 간단한 검색 한 번으로 구입 직전 단계기까지 총 소요시간이 5분도 채 안될 정도로 빠르고 간편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온라인에선 마약 판매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보안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곤 한다. 간단한 검색 한 번으로 구입 직전 단계기까지 총 소요시간이 5분도 채 안될 정도로 빠르고 간편했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마약 유통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총 7887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글을 적발했다. 매체별로 SNS가 5783건(73%)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일반 홈페이지가 2089건(26%), 카페·블로그가 15건으로 1% 미만으로 집계됐다. 과거에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유통경로로 마약이 확산했으나 최근에는 이처럼 접근성이 뛰어난 SNS가 주요 유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SNS뿐 아니라 다크웹 등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20대 젊은층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 지난해 9월 기준 9422명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2030 연령층의 비율이 과반에 달했다.
해당 기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총 1만501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만3750명, 40대 1만2071명, 60대 이상 8438명, 50대 8301명, 10대 1128명, 미상 96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69명에서 104명(2018년)→164명(2019년)→241명(2020년)→309명(2021년) 수준으로 최근 4~5년 사이에 3배가량 껑충 뛰었다. 비밀리에 거래되는 마약류 범죄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마약사범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마약이 SNS를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지만 단속 및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이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를 모니터링한 다음, 방송통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사이트 차단·삭제 조치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마약 광고·판매를 점검하고 있다. 처벌이 필요하면 경찰 등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단속하는 입장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불법 유통 계정을 일일이 파악해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찰에 특정 아이디에 대해 수사의뢰를 요청해도 플랫폼 업체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회원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거절하면 그만"이라며 "수시로 계정을 옮겨가며 거래를 하거나 차명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현실적으로 모두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특히 주요 유통 플랫폼으로 지목되는 텔레그램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제공조가 쉽지 않은 데다 시간이 많이 소요돼 적시 처벌과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트위터 역시 마약 및 규제 약물 등에 대해 심각성 등을 고려해 최고 계정 영구 정지 등 조치를 취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익숙한 SNS 등을 통해 호기심에 마약류를 구매하는 10대 청소년들이 최근 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마약을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로 14살 여중생 A(14)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같은날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역시 마약을 투약한 10대 4명을 검거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우리 사회에 마약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SNS를 통한 비대면 유통 증가로 10~30대 젊은 층에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마약류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