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설의 시작은 다소 충격적이다. 주인공 란이가 중학교 3학년이 돼서야 생리를 시작했고, 하필이면 교실에서 그 일이 벌어진다. 옷에 생리혈이 묻은 줄도 몰랐던 란이는 아이들이 웅성거린 탓에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쓰러지고 만다. 도망가버린 엄마 때문에 여자, 정확히 말하면 엄마가 되고 싶지 않은 란이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나팔관 절제를 결심한다. 자녀를 버리는 엄마 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 임신할 수 없는 몸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짐작하겠지만 란이의 생각은 점차 바뀌게 된다.
란이, 임대아파트에 사는 걸 몹시 창피하게 여겨 들키고 싶지 않다. 겨우 마흔 살에 방구석에서 TV나 보며 소일하는 아빠를 ‘그 남자’로 지칭하며 말도 섞지 않는다. 책임감 없는 부모 대신 칠순의 할머니가 집안 살림을 하며 생업 전선에서 뛰고 있다.
클레어, 란이와 같은 반이다. 200만원짜리 몽클레어 패딩을 입고 온 뒤로부터 본명 대신 클레어로 불린다. 최고급 아파트에 사는 산부인과 병원 원장 딸로 모든 아이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다.
민성, 란이가 아르바이트하다 알게 된 조선족으로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엄마는 중국으로 추방되면서 민성이에게 어떻게든 한국에서 살아남으라고 말한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버티는 게 힘들기만 하다.
 오래전 상영된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의 제목을 요즘 버전으로 바꾼다면 ‘행복은 부모 능력 순이 아니잖아요’쯤 될까?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란이와 클레어, 민성이 처한 상황이 너무도 다르다.
오래전 상영된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의 제목을 요즘 버전으로 바꾼다면 ‘행복은 부모 능력 순이 아니잖아요’쯤 될까?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란이와 클레어, 민성이 처한 상황이 너무도 다르다.란이가 생리혈로 인해 기절했을 때 도와준 클레어는 란이에게 산부인과 의사인 아빠를 곤경에 빠뜨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클레어를 돕던 파트너가 아빠한테 계략을 알리는 바람에 클레어는 흠씬 두들겨 맞는다. 클레어는 실상 폭력적인 아빠한테 노상 맞는 아이였던 것이다.
힘없는 아빠를 무시하는 란이, 힘 있는 아빠를 경멸하는 클레어, 아빠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민성. 세 아이를 보면 행복은 성적순도 부모 능력순도 아닌 듯하다.
방 하나와 좁은 거실, 궁색한 주방으로 구성된 임대아파트에 오갈 데 없는 민성이 와서 며칠 지내고, 아빠한테 구타당한 클레어도 이곳으로 피신한다. 미혼모 딸이 죽은 뒤 손녀 콩이와 사는 앞집 아줌마는 밥 먹을 때가 되면 란이네로 온다.
반찬이라고는 된장찌개에 김치, 김과 계란프라이가 전부지만 할머니는 밥통 가득 밥을 해놓고 오는 사람마다 잔뜩 퍼준다. 기운이 빠져서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뜨거운 물에 설탕을 휘휘 저어 먹인다.
파격적으로 등장해 매우 독특한 결심을 한 란이를 둘러싼 환경은 자못 칙칙한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란이네 아파트에 가서 설탕물 한 그릇 얻어 마시고, 식탁에 끼어 앉아 계란프라이와 된장찌개로 밥 한 그릇 뚝딱하고 싶은 풍경에 젖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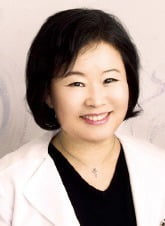 부모에 의해 형성된 ‘차이 나는 운동장’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지만 ‘20대까지는 그다지 차이가 크지 않아 노력 여하에 따라 앞날이 달라진다’는 말은 상당 부분 사실이다. 부모도 임대아파트도 마음에 들지 않는 란이, 고급 브랜드를 휘휘 감고도 부모 사랑이 고픈 클레어, 혼자 버텨내기가 버거운 민성, 힘든 건 분명하지만 파릇파릇한 청춘이기에 희망이 있다.
부모에 의해 형성된 ‘차이 나는 운동장’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지만 ‘20대까지는 그다지 차이가 크지 않아 노력 여하에 따라 앞날이 달라진다’는 말은 상당 부분 사실이다. 부모도 임대아파트도 마음에 들지 않는 란이, 고급 브랜드를 휘휘 감고도 부모 사랑이 고픈 클레어, 혼자 버텨내기가 버거운 민성, 힘든 건 분명하지만 파릇파릇한 청춘이기에 희망이 있다.10대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면서도 유혹이 많을 때다. <창밖의 아이들>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각박하지만 따뜻한 소설이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