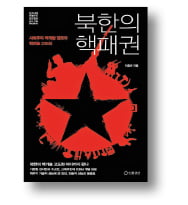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북한 핵과 관련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북핵에 대해 논하는 많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이 어떤 특성을 지녔으며 어떤 경로로 개발됐는지를 도외시한다. 하지만 뭉뚱그려 핵무기 혹은 핵폭탄이라고 지칭하고 넘어갈 때 놓치는 문제는 과연 없을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북한 핵과 관련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북핵에 대해 논하는 많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이 어떤 특성을 지녔으며 어떤 경로로 개발됐는지를 도외시한다. 하지만 뭉뚱그려 핵무기 혹은 핵폭탄이라고 지칭하고 넘어갈 때 놓치는 문제는 과연 없을까.<북한의 핵패권>은 베이징사범대, 베이징대, 중국과학원, 옌볜과학기술대 등에서 활동했던 사회주의권 과학기술 전문가인 저자가 북한의 핵 개발 과정과 현재의 기술 수준,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핵전략을 냉철한 과학의 객관적 언어로 분석한 책이다. 정치적 해석 위주의 북한 핵 담론장에 ‘기초부터 확인하라’고 일침을 놓는다.
북한의 핵은 오랜 개발 역사를 지녔다. 북한이 1990년대 이후 ‘벼락치기’로 핵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일반의 선입견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의 핵 연구 인력들은 1956년 모스크바에 설립된 연합핵연구소(JINR)에 참여해 일찍부터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 1960년대에 이미 300명 넘게 인력을 파견하며 200여 명의 중국을 능가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비서는 “북한의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고 1990년대 초반에 성공했다”고 못 박았다. 마침내 2006년엔 풍계리에서 최초의 지하핵실험을 강행하며 세계에 충격을 줬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감행하는 핵실험은 정치적 의도보다는 핵무기의 기술적 성능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3~5차 핵실험은 핵탄두 소형화와 표준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4~6차 실험은 수소탄 개발과 연관됐다. 남북관계와 대미 전략은 북한에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자는 예상한다. 서방에선 시뮬레이션으로 핵실험을 대체할 수 있다며 ‘핵실험 도발’ 가능성을 작게 본다. 하지만 북한의 진짜 목적은 야포와 지뢰, 어뢰, 항공폭탄, 다탄두, 지대함미사일 등 차기 전술핵과 같은 높은 수준의 핵무기 다양화라며 ‘가상’이 아니라 ‘실습’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다.
책은 전방위적으로 핵무기와 투발 수단을 신속하게 확장하는 북한의 사례를 냉정하게 짚는다. 하지만 건조한 과학의 언어, 사회주의권 핵 개발사에 대한 세세한 기술이 일반 대중이 접하기엔 버거운 측면도 적지 않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