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살고 있는 경기 양평 읍내에 (아주) 작은 LP바를 열었다. 화장실 주방까지 다 합쳐서 15평 사이즈라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서 도맡아 한다. 주문을 받고 음악도 틀고 간단한 안주를 만든다. 안주라고 해봐야 방울토마토나 치즈, 크래커 정도를 내놓는 수준이다. 수목금토 4일만 문을 열기로 하고 소일거리 삼아 그럭저럭 해내고 있다. 입구에는 ‘Jazz Bar(재즈 바)’라고 써놓았다.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작은 재즈카페들을 찾아다닌 적이 있다. 손님 대여섯 명이면 차는 공간에서 자작거리는 LP판을 돌리고 맥주를 내놓는 곳, 빈티지 오디오 사운드가 안주를 대신 한다. 전통식 다방에서 재즈를 듣는 재즈 킷사텐(喫茶店)도 있다. 그때 언젠가 나도 이런 걸 해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양평에서 흐르는 재즈는 어떨까? 내가 문을 연 바에선 모던재즈를 주로 틀고 있다. 현대재즈에 비해 구수한 맛이 마치 사골국 같다. 로큰롤이 세상을 지배한 1960년대를 전후해 재즈도 깔끔한 연주로 단정해졌다. 직전의 비밥재즈가 헝클어진 산발머리 같았다면, 모던재즈는 ‘로마의 휴일’ 그레고리 펙의 2 대 8 가르마 같다. 이른바 하드밥과 소울재즈, 쿨재즈가 모던재즈다. 그런데 사실 모던재즈는 야수의 발톱을 숨겨놓은 재즈다. 그것은 때로 현란한 즉흥연주로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여기까지만 쓰면 지방 도시에서 재즈 바라니, 나름 근사한(?) 걸 하는구나 싶겠지만 아직은 그저 적응 기간이다. 양평 읍내에 딱히 LP바가 없고 더구나 재즈를 본격적으로 들려준다는 곳도 처음 문을 연 셈이다. 그게 신기한지 심심치 않게 손님이 들어온다. 소리가 시끄러워서 조금 있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고 너무 좋다며 단골이 되기도 한다. 메뉴판을 한참 보다가 “국물 같은 거 없나요?”라고 물어볼 때는 난감해진다.
한번은 80세가 넘은 어르신 한 분이 들어오면서 “내가 재즈를 좋아하는데 이런 게 생겼네?” 하며 다짜고짜 곡 신청을 한다. “‘덕 오브 바이’라는 거 있어요. 바비킴이 부른 거” “바비킴이요? 한국 가수 말씀이신가요?” “아니, 바비킴을 몰라? 재즈?” 나도 연식이 제법 되다 보니 까마귀 같을 때가 많다. 그러다 전구가 켜졌다. ‘이분이 비비킹(B.B. KIng)을 찾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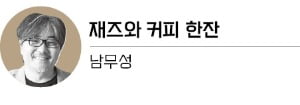 한 날은 젊은 부부가 가게에 들어와서 색소폰 연주자 “행크 모블리의 ‘Soul Station’ LP 있나요?”라고 물어봤다. 멋진 하드밥 앨범이다. 꺼내서 보여줬더니 이 LP의 초판(1960년 발매)을 구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고민 중이라며 외국 사이트에서 300달러쯤 한단다. 간혹 음반을 우표 수집하듯이 모으는 친구들이 있다. 오디오에 빠진 사람 중에도 정작 음악 자체에 비중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소리만 듣는다). 스피커 선 하나에 수십만원짜리를 지를지 말지 한 달간 고민하는 시간에 음악을 적당히 즐기라는 얘기다. 그 젊은 부부가 내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양평 읍내에서의 재즈, 의외로 선수들이 많아서 더 흥미진진해진다.
한 날은 젊은 부부가 가게에 들어와서 색소폰 연주자 “행크 모블리의 ‘Soul Station’ LP 있나요?”라고 물어봤다. 멋진 하드밥 앨범이다. 꺼내서 보여줬더니 이 LP의 초판(1960년 발매)을 구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고민 중이라며 외국 사이트에서 300달러쯤 한단다. 간혹 음반을 우표 수집하듯이 모으는 친구들이 있다. 오디오에 빠진 사람 중에도 정작 음악 자체에 비중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소리만 듣는다). 스피커 선 하나에 수십만원짜리를 지를지 말지 한 달간 고민하는 시간에 음악을 적당히 즐기라는 얘기다. 그 젊은 부부가 내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양평 읍내에서의 재즈, 의외로 선수들이 많아서 더 흥미진진해진다.남무성 재즈 칼럼니스트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