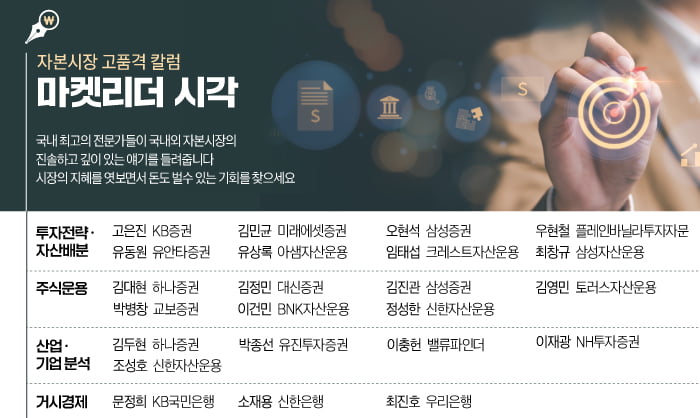최근의 원엔 환율 레벨은 분명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숫자임이 틀림없다.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에 원엔 환율이 745원(2007년 7월)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당시 원달러 환율이 950원 내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날 원달러 환율 1,300원 내외의 고(高)환율 시대에 엔달러 환율 870원이 주는 의미는 새롭지 않을 수가 없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 나타난 원엔 환율 하락에는 원화 강세의 기여도(원/달러 환율 하락)가 더 높았던 반면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나타나고 있는 원엔 환율의 하락에는 엔화 약세(엔달러 환율 상승)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원달러 환율을 살펴보자.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작년 7월부터 역전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10월 FOMC 이후와 미국의 10월 CPI 발표 직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하회하기도 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는 역전되어 있으나,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국가 간 금리 차이보다 위험선호(Risk appetite)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특성을 보이는 통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이제 금리인상을 멈출 것이다”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원달러 환율은 충분히 안정적인 흐름(횡보 또는 하락)을 보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 마지막으로 원화와 엔화의 재정환율인 원엔 환율을 살펴보자. 앞서 추론해본 논리대로 엔달러 환율 추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의 횡보라는 방향성을 대입해보면, 원엔 환율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지금도 충분히 싸보이는 원엔 환율 860~870원대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엔화로 환차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원화 매도/엔화 매수 전략)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힌트는 투자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원엔 환율의 짧은 방향성에는 원화가, 긴 방향성에는 엔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원엔 환율이 900원을 넘어서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산정해 볼 수 있다. 미국이 고금리 장기화를 끝내고 금리인하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거나, 혹은 일본이 완화 방향을 꺾고 긴축으로 선회하는 경우이다. 현재로서는 금융시장에서 메인 컨센서스로 자리잡지 못한 스토리이자 단기간 내 실현되기 어려운 시나리오이다.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로 치부해 버리기도 아쉬운 면이 없지 않다. 과거 미국 금융위기(Crisis)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할 정도의 큰 위기(system risk)는 대부분 기준금리 인상 구간이 아닌 동결 구간에서 발생했었다. 아울러 아직 일본의 엔화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엔화 강세 요인들(무역수지 개선, 미-일 물가 차이 축소)이 부각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원/엔 환율의 장기적 방향성은 엔화가 키를 쥐고 있다고 보는 이유이다. 따라서 엔화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장기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일본 여행 경비를 아끼는 정도의 소소한 즐거움을 노린다면 엔화 매수가 나쁘지 않은 타이밍 같아 보인다.
* 본 견해는 소속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닌 개인의 의견입니다.
관련뉴스



 ※한경 마켓PRO
※한경 마켓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