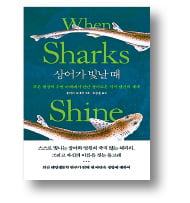 지중해에 사는 홍해파리는 영원히 늙지 않고 안 죽는 영생의 삶을 산다. 홍해파리는 난자와 정자를 분출한 뒤 다시 퇴화해 어린아이 상태로 돌아간다. 세포가 다시 젊어지고 외형도 바뀐다. 이들을 먹어 치우는 천적이 없었다면 오늘날 바다는 미끌미끌한 해파리로 가득 찼을지도 모른다.
지중해에 사는 홍해파리는 영원히 늙지 않고 안 죽는 영생의 삶을 산다. 홍해파리는 난자와 정자를 분출한 뒤 다시 퇴화해 어린아이 상태로 돌아간다. 세포가 다시 젊어지고 외형도 바뀐다. 이들을 먹어 치우는 천적이 없었다면 오늘날 바다는 미끌미끌한 해파리로 가득 찼을지도 모른다.평균 수심 4000m, 지구 표면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광대하고 혹독한 바닷속에는 이처럼 우리가 잘 모르는 신비한 생물이 아직 많다. 독일 출신 해양 생물학자 율리아 슈네처는 신간 <상어가 빛날 때>에서 바닷속에 사는 경이로운 생물에 관한 최신 연구를 소개한다. 심해의 상어에 관해 읽어 내려가면서 두렵게만 느꼈던 상어가 얼마나 오해를 받아왔는지 알 수 있다.
동물이나 식물이 빛을 발하는 능력을 생체 형광이라고 한다. 과학자들은 산호초에 사는 물고기 중 180종 이상이 빛을 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특히 빛이 거의 침투하기 힘든 심해의 물고기들이 형광을 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에 따르면 형광은 바다에서 의사소통, 사냥, 위장 등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 저자는 생체 형광 연구가 생명공학 차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전한다.
돌고래가 휘파람과 같은 소리를 통해 언어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다. 돌고래는 ‘서명 휘파람’으로 불리는 이름을 갖고 있다. 어린 돌고래는 생후 첫 달에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짓는다. 서명 휘파람을 한번 만들면 평생 간직한다. 상대방에게 자신을 소개하거나 말을 걸 때 사용한다.
북태평양 한가운데 봄부터 여름까지 반년 동안 백상아리가 모이는 지역이 있다. ‘화이트 샤크 카페’라고 불리는 이곳은 위성으로 볼 땐 사막과 같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수심 100m 지점으로 내려가 살펴보니 엽록소와 플랑크톤 함량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저자는 이 밖에 해저 화산 속에서 사는 물고기들,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바다, 다양한 해양 곤충까지 마치 외계 생명체를 만난 것 같은 신비로운 해양 생물의 세계를 전한다.
최종석 기자 ellisic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