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는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의 전장이 될 것이다.”
“‘코리아’는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의 전장이 될 것이다.”1880년 여름. 14년 전 불타버린 제너럴셔먼호의 행방을 조사하러 한반도를 찾은 미국 해군 제독 로버트 슈펠트는 이같이 말했다. 슈펠트는 조선이 더 이상 ‘은둔의 왕국’으로 남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의 말처럼 향후 몇 년간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이 벌인 대규모 전쟁의 격전지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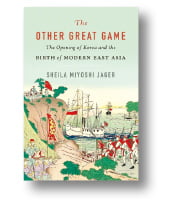 최근 출간된 <또 다른 위대한 게임>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아시아 지역의 기존 세력 균형을 재편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한다. 저자는 셰일라 미요시 예거 오벌린칼리지 동아시아학 교수다. 일본과 네덜란드 혼혈 출신인 그는 버락 오바마의 옛 연인으로도 유명하다.
최근 출간된 <또 다른 위대한 게임>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아시아 지역의 기존 세력 균형을 재편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한다. 저자는 셰일라 미요시 예거 오벌린칼리지 동아시아학 교수다. 일본과 네덜란드 혼혈 출신인 그는 버락 오바마의 옛 연인으로도 유명하다.한국의 중요성은 그동안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연구한 서양 학자들 사이에서 간과돼 왔다. 중국과 일본에 밀려 이야기의 주체로 거론된 일이 드물었다. 하지만 저자는 “한국을 중심에 두지 않고는 1860년대부터 1900년대 초 동아시아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외교학계에서 ‘위대한 게임’이란 주로 19세기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영국과 러시아의 대립 구도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또 다른 위대한 게임’은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오히려 단순해 보이게 만든다. 메이지 일본과 청 왕조, 러시아 3자의 문제뿐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서구 열강의 개입, 조선의 내부 분열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외교와 군사, 문화, 지리를 넘나들며 이런 복잡한 속내를 풀어낸다. 주요 전투의 전개 양상을 풀어낸 대목이 눈여겨볼 만하다. 일본은 두 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는데, 저자는 이를 “일본군의 탁월한 전략과 적군의 무능함이 맞물린 결과”라고 해석한다. 청일전쟁에서 양국 함대가 처음 마주쳤을 때 청 함대의 지휘관은 일본군이 아직 사정거리 밖에 있을 때 발포 명령을 내렸다. 함대는 그대로 역습에 노출됐고, 지휘관이 일본군 포격에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러시아 지휘관의 상태는 이보다 심각했다. 적군의 동태는 둘째치고, 자국 예비군 편대의 위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저자는 러시아의 방심이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한다. “러시아의 니콜라스 2세가 평소 일본인을 ‘원숭이’라고 부를 만큼 열강 사이에서 일본을 얕잡아보는 풍조가 널리 퍼져 있었다.”
일본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여전히 강대국 외교 무대에선 찬밥 신세였다. 청일전쟁 뒤에도 삼국간섭으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듯 말이다. 전쟁으로 나라 살림은 어려워졌는데, 실질적으로 거둬들인 것은 없는 상황. 저자는 이 시점에 “동아시아 전역을 정복하려는 일본의 야망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
내용만 놓고 보면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다룬 역작으로 꼽을 만하다. 저자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여러 세력을 공평한 잣대로 비춘다. 이웃한 거대 제국들 사이에 갇혀서 타의로 휩쓸리는 한국의 설움에도 어렵지 않게 공감할 수 있다. 책은 한국이 프랑스 침략군을 물리친 병인양요에서 시작해 서서히 주권을 상실하는 과정을 조명하고, 의지가 꺾인 마지막 임금이 ‘불평 없이’ 권력을 내려놓는 역사로 끝맺는다.
정리=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