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교수의 주장은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고, 불평등 해소가 각국의 주요 정책 과제가 됐다. 그런데 통념과 달리 부의 불평등이 오히려 덜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말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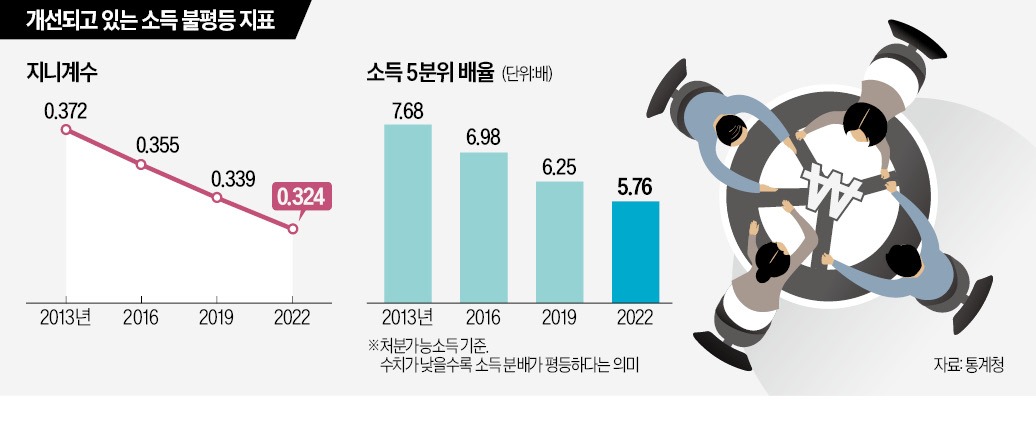
불평등이 해소되려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고소득층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데이비드 오터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가 작년 5월 발표한 ‘팬데믹과 관련된 저임금 노동시장의 변화’ 논문이다.
논문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미국에서 소득 하위 10%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 임금은 6.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10%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2.7% 감소했다.
저소득층 임금은 늘고, 고소득층 임금은 줄었으니 격차가 축소됐다는 것이다. 오터 교수는 2020년 이후 저소득층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지난 40년간 생겨난 임금 불평등의 40%가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오터 교수의 논문을 인용해 이런 제목의 특집 기사를 냈다. ‘대박 난 육체노동자들, 불평등에 관한 기존 지식은 왜 틀렸나.’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피케티 교수에 대해 “마르크스보다 크다”고 평가했으나 10년 만에 불평등에 대한 정반대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미국 재무부의 제럴드 오텐과 미 의회의 데이비드 스플린터가 작년 9월 내놓은 ‘미국의 소득 불평등’ 논문도 흥미롭다. 이들은 1962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상위 1%의 세후 소득 점유율이 0.2%포인트밖에 높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불평등이 심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둘째, 주요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각국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돈을 풀었는데, 저임금 근로자들이 이 같은 정책의 수혜 계층이 됐다는 것이다. 미국 실업률은 2022년 1월 이후 완전고용에 가까운 4% 이하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11월 유로존 실업률은 6.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셋째, 인공지능(AI) 발달도 저임금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AI가 블루칼라보다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웬만한 서류 작업은 AI가 대신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수도관을 수리하고 벽지를 붙이는 일은 인간, 그중에서도 블루칼라 근로자만 할 수 있다.
‘부의 대물림’을 통해 계층이 고착화할 가능성도 크다. 이지은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과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 2월 ‘부모의 소득·학력이 자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1980년대생 중 어릴 적 가구 소득이 상위 10%에 속했던 사람은 하위 10%에 속했던 동년배보다 33%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소득 격차가 줄었다는 것이 격차가 없다거나 크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 등 한국도 불평등이라는 면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유승호 경제교육연구소 기자 ush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