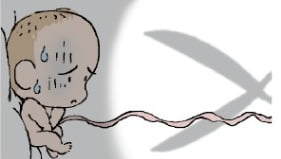 진화생물학에 ‘피셔의 원리’라는 이론이 있다. 성 생식을 통해 자손을 생산하는 대부분 종의 암수 성비가 1 대 1에 수렴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는 남자 아기가 여자 아기보다 많지만,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점차 1 대 1에 가까워진다. 남자아이 평균 사망률이 여아보다 좀 더 높기 때문이다. 일부다처, 일처다부로 사는 동물 종도 군집 내 암수 비율은 대체로 1 대 1이다. 우연을 가장한 자연의 필연적 섭리다.
진화생물학에 ‘피셔의 원리’라는 이론이 있다. 성 생식을 통해 자손을 생산하는 대부분 종의 암수 성비가 1 대 1에 수렴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는 남자 아기가 여자 아기보다 많지만,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점차 1 대 1에 가까워진다. 남자아이 평균 사망률이 여아보다 좀 더 높기 때문이다. 일부다처, 일처다부로 사는 동물 종도 군집 내 암수 비율은 대체로 1 대 1이다. 우연을 가장한 자연의 필연적 섭리다.이런 섭리를 유일하게 거스르는 종은 인간이다. 한국 중국 인도 등 남아 선호가 뿌리 깊은 나라에선 여아 낙태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1980년 105.3명으로 자연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약 105명)와 비슷했던 신생아 성비가 1985년 109.4명, 1990년 116.5명으로 악화했다. 이런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1987년 도입한 게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다.
이 법이 제정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그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임신부나 가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성평등 의식이 확산하고 성비 불균형이 해소된 만큼 부모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태아 성감별 금지는 타당성을 잃었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낙태법 폐지 이후 입법 공백이다. 헌재는 2019년 형법상 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눈앞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20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주며 국회에 대체입법을 주문했다. 하지만 임신 14주, 임신 24주 등 낙태 허용 기준을 두고 5년이 다 되도록 답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태아 성감별 금지법까지 사라지자 비록 소수일지라도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커진다.
헌재가 “낙태죄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만큼 성 선별 낙태 방지는 성별 고지 제한이 아니라 낙태 관련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 이유다. 국회의 직무 유기가 이것만은 아닐 것이다.
유병연 논설위원 yooby@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