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란드 작가 마렉 플라스코의 <8요일>이 2003년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제목은 <제8요일>이었다. ‘8요일’이든 ‘제8요일’이든 포털에서 검색하면 영화 <제8요일> 관련 내용이 일제히 뜬다. 소설 <8요일>과 영화 <제8요일>은 제목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스토리다.
 마렉 플라스코는 1950년대의 암울한 폴란드를 배경으로 인간 본질의 문제를 심도 있게 파헤친 <8요일>을 26세라는 젊은 나이에 발표했다.
마렉 플라스코는 1950년대의 암울한 폴란드를 배경으로 인간 본질의 문제를 심도 있게 파헤친 <8요일>을 26세라는 젊은 나이에 발표했다.‘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갈망의 요일’이라는 점이 각인되면서 <8요일>은 출간 즉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게오르규의 <25시>와 쌍벽을 이루는 획기적인 제목에 의미심장한 내용이 뒷받침되면서 여전히 많은 독자가 찾고 있다. 특히 청년들에게 깊은 울림을 안겨준다. 전쟁과 이념 다툼으로 혼란에 휩싸인 나라가 여전히 많은 데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방황의 시기여서 그럴 것이다.
아그네시카의 오빠 구제고지의 침대는 부엌 한쪽에 놓여 있다. 또 하나의 침대는 좁고 너저분한 부엌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자와즈키라는 남자의 것이다. 이별을 고한 애인 때문에 상심해 거의 매일 술집을 전전하는 구제고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란 연애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 곳일까?’라고 자문한다. 친구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보안 경찰이 들이닥치는 현실 앞에서 구제고지의 절망은 깊어만 간다.
어머니의 성화에 오빠를 찾아 나선 동생 아그네시카에게 구제고지가 토로하는 말 속에 공산화된 폴란드의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공갈 재료인 ‘공포정치’도 마구 휘두르는 이 세계에서 과연 무슨 가치 있는 일이 나타나겠느냐 말이야. 아아, 인공위성까지 창조한 이 세계에서 솔직한 감정과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은 ‘죽느냐, 사느냐’ 이것 때문에 피난처를 발견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
아그네시카는 골치 아픈 현실을 벗어나 사랑하는 사람과 지내고 싶지만 지독히도 가난한 애인 피에트레크는 방 하나 얻을 형편도 안 된다. 둘은 늘 카페나 공원 또는 극장에서 만났다 헤어지곤 하는데, 친구의 방이라도 잠깐 빌려 둘만 있고 싶지만 그조차도 여의치 않다.
아그네시카는 ‘벽, 네 면의 벽, 아니 세 면이라도 좋아. 세 면이라도 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방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럼, 그런 방이 어디 없을까?’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한 면의 벽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을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드디어 피에트레크가 방을 빌려 아그네시카를 찾아오고, 구제고지가 애타게 기다리던 애인이 돌아오지만 충동을 이기지 못한 아그네시카와 절망에 휩싸인 구제고지는 그들이 내민 손을 잡지 못한다.
70년 전 현실을 그린 <8요일>은 주택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요즘 청년들을 떠오르게 하면서 여러 질문을 안긴다. 안온하게 감싸줄 네 면의 벽, 많은 문제가 해결될 듯한 8요일, 결코 만날 수 없는 공간과 시간에 모든 걸 미루는 게 맞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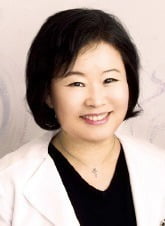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일이 달아나고, 제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이 생기고, 두 가지 허들은 수시로 우리를 가로막는다. 1950년대의 폴란드처럼 국가적인 불행이 내리누르지만 않는다면 네 면의 벽과 8요일은 각자가 만들거나 만날 수 있는 세상 아닐까. 충동이나 절망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일이 달아나고, 제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이 생기고, 두 가지 허들은 수시로 우리를 가로막는다. 1950년대의 폴란드처럼 국가적인 불행이 내리누르지만 않는다면 네 면의 벽과 8요일은 각자가 만들거나 만날 수 있는 세상 아닐까. 충동이나 절망에 빠지지만 않는다면.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