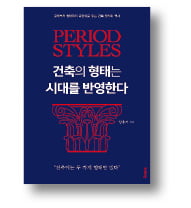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왜 그렇게 크게, 그리고 높이 지어야만 했을까.’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왜 그렇게 크게, 그리고 높이 지어야만 했을까.’최근 출간된 <건축의 형태는 시대를 반영한다>는 이런 질문에서 출발한다. 140m가 넘는 기자 대피라미드는 3800여 년간 인간이 세운 가장 높은 건축물로 군림했다. ‘무덤 주인의 위상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불가사의한 크기가 속 시원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책을 쓴 양용기 안산대 건축디자인과 교수는 그 이유를 ‘사람’에서 찾았다. 태양신을 숭배했던 고대 이집트인들은 해가 지는 나일강 서쪽에 피라미드를 지었다. 반대편인 나일강 동쪽에 마을이 있다는 건 상식이었다. 모래바람으로 시시각각 지형이 변하는 광활한 사막에서, 멀리서 식별될 만큼 거대한 피라미드가 일종의 이정표로써 필요했다는 해석이다.
건축물의 정의는 ‘인간을 위한 공간’이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복잡한 건축 양식도 결국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을 이해하면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책은 이처럼 그리스 신화를 통해 파빌리온 신전의 형태를,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를 돌아보며 로마네스크 양식을 설명한다. 건축에 막 입문한 독자에게 친절한 이정표를 제공한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