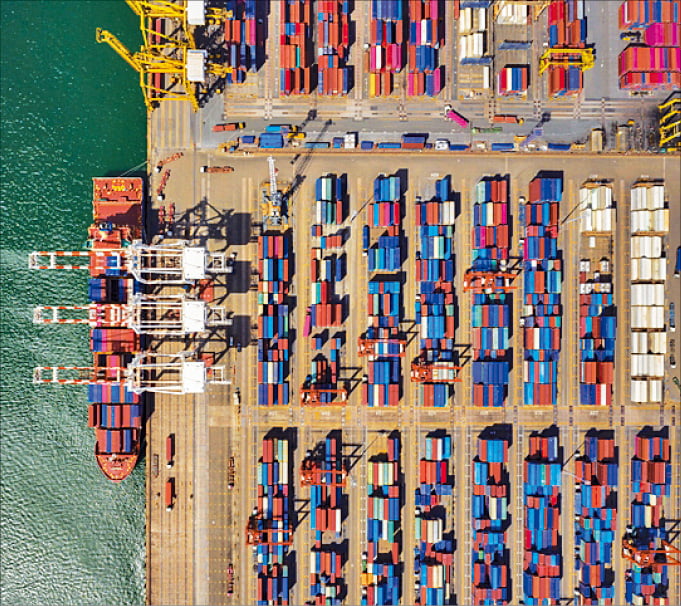
기업은 왜 생겨났을까. 1937년 영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다. 제품 생산을 위한 각종 기능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조달하는 게 ‘거래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기업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분석이지만 기업이 탄생하고 변화한 역동성을 담지는 못했다.
 <기업의 세계사>는 이 부분을 파고든다. 로마시대부터 르네상스시대를 거쳐 동인도회사, 유니언퍼시픽 철도회사, 포드 자동차, 엑슨, KKR, 페이스북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어떤 식으로 사회와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기업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본다. 저자 윌리엄 매그너슨은 로펌에서 인수합병(M&A) 업무를 담당하던 변호사였다. 지금은 텍사스 A&M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상업, M&A, 국제경영 등을 가르치고 있다.
<기업의 세계사>는 이 부분을 파고든다. 로마시대부터 르네상스시대를 거쳐 동인도회사, 유니언퍼시픽 철도회사, 포드 자동차, 엑슨, KKR, 페이스북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어떤 식으로 사회와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기업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본다. 저자 윌리엄 매그너슨은 로펌에서 인수합병(M&A) 업무를 담당하던 변호사였다. 지금은 텍사스 A&M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상업, M&A, 국제경영 등을 가르치고 있다.기업은 원래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기업은 오로지 이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영혼 없는 독립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더 나아가 이익 추구는 당연하고 그것이 기업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모두 틀렸다. 기업은 원래 공공선을 함양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책은 이렇게 공동의 목적을 가진 공동체로서의 기업이 무작정 수익만 추구하는 조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기원전 215년, 로마가 위기에 처했다.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진격하며 로마군을 연이어 격파했다. 로마군은 끈질겼다. 대규모 전투를 피하고 소규모 국지전으로 카르타고군을 소모시켰다. 책은 그 로마군 뒤에 기업이 있었다고 말한다. 3개 회사가 로마 원로원과 계약을 맺고 의복, 식량, 장비를 군대에 공급했다. 로마시대의 역사가 리비우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로마 공화국이 민간 기업의 지원으로 살아났다.”
주식회사의 기틀을 다진 건 영국 동인도회사였다. 동인도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무역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주주에게 나눠 줬다. 그런데 주주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다. 항해별로 주주를 모집하는 ‘개별 항해’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었다. 같은 회사라도 항해에 따라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주끼리 협조할 필요가 없었다. 선원들도 어떤 주주 편이냐에 따라 싸움을 벌였다. 1614년 공동 출자 방식을 택했다. 주주는 회사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소유했다. 이후 동인도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막강한 기업으로 떠올랐다.
책에 소개된 기업들은 저마다 기업사(史)에 족적을 남겼다. 미국 링컨 대통령 시절 설립된 대륙횡단열차 운영사 유니언퍼시픽은 독점의 횡포를 드러내 1890년 세계 최초의 독점금지법이 제정된 계기가 됐다. 포드는 조립 라인 효율화를 가져왔지만 인간을 기계 부품처럼 만들고 소비주의를 드높였다. 석유회사 엑슨은 글로벌 기업의 부상을, KKR은 사모펀드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등장을 알렸다. 페이스북을 통해선 스타트업 시대를 설명한다.
독창적이고 뛰어난 아이디어를 내는 건 개인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건 항상 기업이었다. 저자는 “기업이 경제적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건 사람들은 혼자 일할 때보다 같이 일할 때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기업은 사회에 이익이 되지만 변질되기도 한다. 로마를 대신해 세금을 거둬야 할 기업은 주민을 노예화하고 원로원 의원을 타락시켰다. 동인도회사는 인도부터 미국 보스턴까지 전 세계에 걸쳐 분쟁을 초래했다. 유니언퍼시픽은 미국 정부를 속이고 가난한 농부를 대상으로 철도 운임을 인상했다.
이를 바로잡아온 건 적절한 법률과 정책이었다. 책은 “혁신, 착취, 개혁이라는 사이클은 기업의 역사에서 몇 번이고 반복되었다”고 했다. 진취적인 기업이 기득권을 얻어 타락하고 개혁을 통해 다시 새롭고 혁신적인 기업이 등장하는 식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미래에 등장할 혁신 기업이지 현실에 안주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