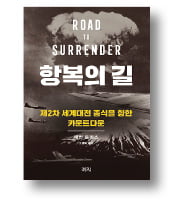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15초, 핵폭탄 ‘리틀 보이’가 미국 공군 B-29 폭격기에서 떨어졌다. 43초 후 폭격기 조종석은 밝은 빛으로 가득해졌고, 아래쪽에선 히로시마가 검게 끓어올랐다. 그리고 약 7만 명이 즉사했다. 사흘 뒤인 9일엔 나가사키에 ‘팻 보이’가 투하됐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15초, 핵폭탄 ‘리틀 보이’가 미국 공군 B-29 폭격기에서 떨어졌다. 43초 후 폭격기 조종석은 밝은 빛으로 가득해졌고, 아래쪽에선 히로시마가 검게 끓어올랐다. 그리고 약 7만 명이 즉사했다. 사흘 뒤인 9일엔 나가사키에 ‘팻 보이’가 투하됐다.원폭 투하 직후 일본이 항복해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본 강경파는 원폭 투하 후에도 전쟁을 계속하길 원했고, 미국 결정권자들은 세 번째 핵폭탄을 고려하고 있었다. 미국 작가이자 기자 에번 토머스가 쓴 <항복의 길>은 몇 주 동안 핵폭탄이 일본의 항복과 종전을 이끌어낸 치열한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세 명의 인물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미국 전쟁부 장관 헨리 스팀슨과 태평양전략폭격사령부 수장 칼 스파츠, 일본 외무대신 도고 시게노리 등이다. 그간 역사에서 이들은 조연으로 여겨졌다. 저자는 “이들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종전을 이끌어낸 인물들”이라며 2차 세계대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그들이 남긴 공식·비공식 기록과 주변인의 증언을 토대로 역사를 서술했다.
스팀슨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할지, 투하한다면 언제 어디에 투하할지를 해리 S 트루먼 대통령과 함께 결정했다. 그는 인도주의 및 윤리적 가치와 국익을 위한 냉혹한 힘의 사용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다. 스팀슨이 서명한 핵폭탄 투하 명령서를 받은 건 스파츠였다. 태평양전략폭격사령부 수장으로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지만, 눈을 감을 때까지 엄청난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다.
도고도 흥미로운 인물이다. 항복이란 단어가 금기시된 당시 일본에서 그는 항복만이 살길이라고 믿었다. 최고전쟁지도회의에 참석한 여섯 명 중 유일한 민간인인 그는 핵폭탄 투하 후에도 전쟁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경한 군인들에게 맞서 목숨을 걸고 항복을 주장했다.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다각도로 조명해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주는 책이다. 미국 정계와 군부가 느낀 압박감과 일본 수뇌부 내부의 대립 등 당대에 교차하던 다양한 입장을 회고록과 일기, 공문서 등을 통해 낱낱이 밝혀냈다. 날카롭게 분석하면서도 담담하고 간결한 문체가 인상적인 논픽션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