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위산업 분야 ‘원청’ 격인 87개 기업의 관리에 집중하는 동안 하청 업체가 모인 ‘바닥 생태계’에서 기술과 인력을 빼가는 복마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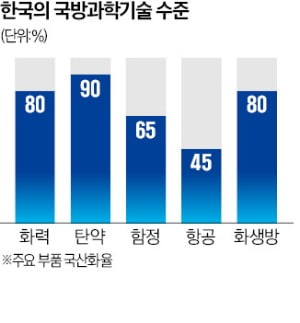 기술을 빼앗긴 K사는 국내 방산 대기업 및 가블러와 일한 업체다. 유출 사실을 파악한 가블러가 T사에 기술 삭제 및 반환을 요구했으나 T사가 무시하면서 국제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검찰은 T사가 거액을 받고 훔친 기술을 다른 국내 기업에 판매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 저장매체에 불법 보관하며 외부로 비밀을 누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기술을 빼앗긴 K사는 국내 방산 대기업 및 가블러와 일한 업체다. 유출 사실을 파악한 가블러가 T사에 기술 삭제 및 반환을 요구했으나 T사가 무시하면서 국제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검찰은 T사가 거액을 받고 훔친 기술을 다른 국내 기업에 판매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 저장매체에 불법 보관하며 외부로 비밀을 누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훔친 기술로 영업하고 해외에 판매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8월 K-2 흑표 전차의 화생방 양압장치 생산업체 S사 전 직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A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빼돌려 중동 국가에 수출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기술을 탈취한 이들이 죄책감 없이 헐값에 기술을 뿌리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80여 개 방산 기업뿐 아니라 수천 개의 기업이 모인 하부 생태계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찰 시 치명상을 입는 보안 감점 제도가 두려운 원청 방산 기업만 기술 유출에 신경을 쓰고 수천 개 하도급사와 재하청, 일반상용물자 제조기업 등에선 인력과 기술 탈취가 다반사인 게 업계 현실이다.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방위사업청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방위산업을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미국처럼 정부 내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방산 전반의 보안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오/정희원 기자 cheol@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