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문화사'·'나는 오늘 결혼정보회사에 간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이번 설 연휴에도 이 말에 시달린 남녀들이 한둘이 아닐 테다.
마치 '결혼하라'는 잔소리 시즌에 맞춘 듯 결혼을 소재로 한 책들이 나란히 나왔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가 알렉산드라 블레이어는 '결혼의 문화사'(재승출판 펴냄)에서 "결혼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치 않을 인류학적 상수(常數)가 아니다"라며 시대에 따라 바뀐 결혼의 풍속도를 소개한다.
원래 사적인 계약에서 출발했던 결혼은 교회가 득세하던 시절에는 교회에서 식을 올려야만 인정받는 식으로 종교 차원의 일로 격상됐다. 그러다 교회법의 힘이 약해지며 결혼은 점차 국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전통적 의미의 결혼이 가장 성행했던 때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50∼1960년대였다. '남성은 부양자, 여성은 전업주부'라는 형태가 대중매체에 의해 일종의 이상향처럼 여겨진 이 시기 법정 혼인 가능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스무 살 여성과 대학생들이 결혼하기 시작했다.
변화는 68혁명 등의 영향으로 이혼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시작됐다. 학업을 마칠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여성들이 속출했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피임약은 '결혼 브레이커'로 작용했다. 1970년대 이후 혼인 연령은 날로 높아졌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었다. 1820년 티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혼인 허가제가 있었다. 가난하고 유산이 없는 국민은 결혼을 제한받았다. 하인, 기능공, 일용직, 노동자, 세입자 등은 결혼하려면 국가의 검열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여성이 결혼하려면 지참금이 필요했던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혼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지참금을 돌려줘야 했다. 이 때문에 이혼은 여성들에게 지참금을 돌려줄 형편이 되지 않는 남편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다.
결혼의 전제 조건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돈이냐 사랑이냐 중에서 좀 더 우세했던 것은 아무래도 돈이었던 것 같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제국에서는 지참금 없는 여성이 남편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반대로 켈트족은 더 많은 지참금을 선사하는 남성이 아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추세는 17세기 계몽주의 이후 문학과 저널리즘을 통해 연애결혼이 이상적인 것으로 제시될 때까지 이어졌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 역시 낭만적이나 열정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이성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영속적인 사랑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사랑이 결혼의 토대가 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윤진 옮김. 304쪽. 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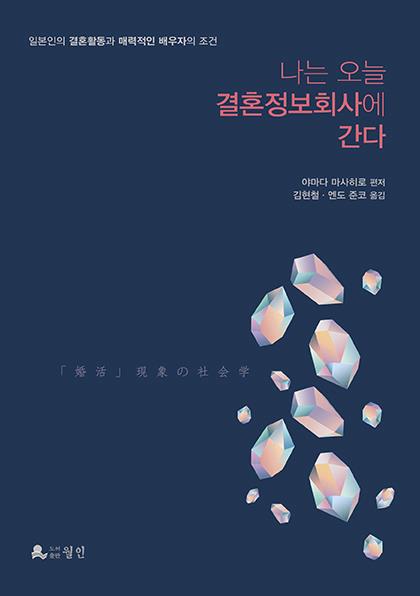
'나는 오늘 결혼정보회사에 간다'(월인 펴냄)는 일본의 독특한 '결혼활동' 문화와 그 배경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한 책이다.
'결혼활동'은 결혼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취직활동에 비유한 용어다. 소개팅·맞선·자기계발·결혼정보회사 가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본에서는 이미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논문이 나오고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결혼활동'이란 용어가 유행하게 된 배경에는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하지 못한 독신자의 증가가 있다. 모든 사람이 적령기가 되면 결혼하는 시대는 끝났고 결혼하고 싶으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는 경제 위기로 장래 생활에 대한 불안이 커지며 고수입의 남성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으로 그 의미가 변질했다.
책은 그러면서 결혼의 조건으로서 '사랑'은 그 가치를 잃어버렸고 이 지점에서 결혼활동의 '로맨틱 러브 이데올로기'는 해체됐다고 진단한다.
일본의 가족사회학 연구자들이 쓴 글을 야마다 마사히로 주오(中央)대 교수가 엮었다. 김현철·엔도 준코 옮김. 264쪽. 1만5천원.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