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개념미술 선구자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갤러리현대서 개인전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가로·세로 각각 2m인 정사각형을 채운 것은 여러 갈래로 뻗어 나간 선들과 색색의 면이다.
그런데도 작품 앞에 선 사람들은 단박에 선글라스를 떠올린다.
"여기에는 선글라스가 없지만, 당신은 선글라스를 봅니다. 이렇게 적게 표현된 것을 보고서도 관람객은 많은 것을 떠올리고 이해하죠. 제 역할은 그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죠."
작품을 바라보던 은발의 작가는 "(사람들이) 눈앞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경탄했다.
반세기 동안 일상의 물건들을 소재로 삶과 예술의 경계를 탐구하는 일에 매달려 온 영국 작가 마이클 크레이그-마틴(76) 개인전이 서울 종로구 사간동 갤러리현대에서 열린다.
1973년 발표한 '오크 트리'는 그가 영국 개념미술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는 출발점이 됐다. 유리 선반 위에 유리 물컵을 올려놓고 '이것은 더는 물이 아니다. 참나무'라는 내용의 메모를 놓아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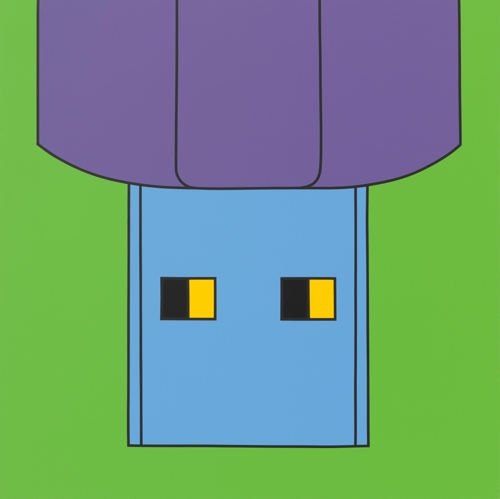

색과 면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작가는 1990년대 회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오브제를 이미지화하면 한계치를 뛰어넘을 수 있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 책만 해도 이미지화하면 크기를 바꿀 수 있고 열었다 닫을 수도 있죠."
갤러리현대 개인전 '올 인 올'(All in All)에는 최근 수년간 작업한 회화 작품 30여 점이 나왔다.
색·면·선에 집중하면서 대량 생산 제품을 소재로 한 점에서는 이전 작업의 연장이지만 아이폰, 노트북, 무선 마우스 등 시대 변화를 보여주는 오브제들이 눈에 많이 띈다.
사물을 과감하게 확대해 일부만을 보여주면서 관람객이 나머지를 채워 넣도록 하는 점도 새로운 접근법이다.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만난 작가는 "한국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는 일상의 물건은 세계 공통의 언어"라면서 "이런 오브제와 그 이미지(작품)는 시대상과 현실, 가치관, 흥미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겉으로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내면은 복잡한 작업"이라면서 "관람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도 아름다움을 느끼게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알루미늄판에 이미지를 프로젝터로 쏜 뒤 윤곽선을 만들고 아크릴 물감을 많게는 수십 번씩 롤러에 찍어 채색하는 작업 과정 자체도 단순하고 간결한 이미지와는 대조적이다.
그는 데이미언 허스트, 줄리언 오피, 세라 루카스, 트레이시 에민 등 '영국의 젊은 예술가'(yBa)로 분류되는 세계적인 작가들의 대부이기도 하다.
이들 모두 그가 런던 골드스미스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키워낸 인물들이다.
작가는 웃음과 함께 "어린 나이에도 벌써 자신만의 언어를 찾아냈던 학생들이었다"며 30년 전을 회고했다.
"우수한 학생들은 많았지만, 그때 유독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 있었어요. 서로 유대감도 좋았고 합이 잘 맞았죠. 데이미언 허스트가 뛰어난 작품을 내면 세라가 그에 못지않은 작품을 내려고 애쓰는, 매우 건강한 선순환 관계가 있었어요."
전시는 11월 5일까지. 문의 ☎ 02-2287-3524.
ai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