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규 첫 시집 '그늘진 말들에 꽃이 핀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삶 못지 않게 죽음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죽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체할 뿐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삶을 구성하는 죽음을 배척할 이유는 없죠."
박신규(45) 시인의 첫 시집 '그늘진 말들에 꽃이 핀다'(창비)에는 죽음의 이미지와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봄비가 내려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곡우(穀雨), 꽃의 죽음에 대한 애도는 삶을 향한 의지와 맞닿아 있다. 시인은 "꽃이 만개할 때는 삶의 절정이면서 죽음의 시작"이라고 했다.
"쏟은 꽃잎을 담을 수가 없었다// 라면 두 박스를 쌓아놓고/ 자취방에 숨어 잠만 잤다// 가랑비 그치는가, 서툴게/ 때를 놓친 꽃들이 서둘러 갔다// 먼 데까지 실비가 내린다" ('곡우' 전문)
죽음에 대한 통찰은 시대와 역사로 시선을 옮긴다. 인간의 야만성이 낳은 죽음에 한국 현대사의 질곡이 새겨진다. '불카분 낭'은 제주 4·3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양민들에 대한 애도이자 인간성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 읽힌다.
"눈감지 못한 수만 눈동자들은 하나둘/ 선흘리로 와서 천년수(千年樹) 이파리로 맺힌다/ 학살로 몰살로 끝낼 수 없는 것이 있다/ 한번 죽은 것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다시 죽일 수 없다,/ 인간도 신도/ 또다시 죽을 수는 없어서/ 타오른다, 피어린 채/ 피어난다" ('불카분 낭' 부분)
서른셋에 먼저 세상을 떠난 아우 정성근은 메신저에 여전히 남아 있다. 대화명 '들별꽃, 지상에 흐드러진 그리움으로'. 요절시인 김관식(1934∼1970)과 "오래된 술친구처럼 마주 앉"는가 하면, 뇌출혈로 쓰러져 누워만 있는 형 김경언의 손을 붙잡는다.
"구년째 의식이 없는 병실에 간다/ 궤도를 잃은 유성처럼 흔들리는/ 그 눈빛에 안부를 물어야 한다/ 촛불을 대신 끄고 손뼉 치며/ 생일을 축하해야 한다/ 늘 웃는 얼굴인 그가 크게 웃으면/ 모두가 환해지던 때가 있었다,/ 놔주기에는 아직 힘주어 따뜻한/ 손이 있다" ('떠도는 손'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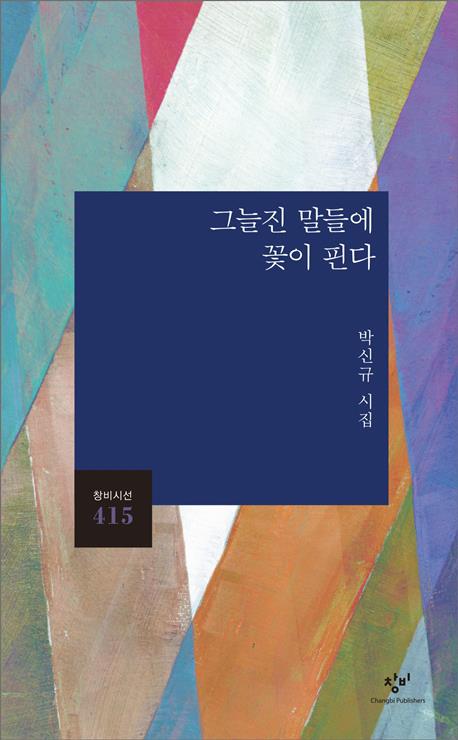
2010년 문학동네로 작품활동을 시작한 시인은 "이번 시집에 제 20대부터 40대까지, 청춘과 중년이 다 들어 있다"고 했다. 시인은 2001년 창비에 입사해 17년째 출판 편집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사옥이 마포구 용강동에 있던 시절부터 2000년대 창비의 역사를 함께 했다. 그동안 그의 손을 거쳐간 시집이 200권에 가깝다.
"갑자기 거대한 마감이 몰아쳤다/ '만인보' 서른권을 완간할 때까지/ 밤늦게 과속하고 지름길을 내달리는 마음은/ 출근길 기차보다 더 바쁘고 만원이었다/ (…)// '만인보'를 읽을 때마다/ 갈피 속으로 걸어가다 멈추는 삶들이 있다/ 속사정을 알기는커녕 말 한마디 건네보지도 못한/ 파지 할머니와 건널목 할아버지/ 또 늘 저만치에 서 있던 회화나무,/ 저만치서 사라진/ 친애하는 나의 배후 세력들" ('저만치에 배후 세력들' 부분)
대학원 시절, 김사인 시인은 강의를 짧게 마치고 "나머지 수업 들어갑시다" 하며 술집으로 향했다고 한다. 그에게 바치는 헌시에서 시인은 짓궂음으로 애정을 표현한다.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 나의 일상은 응당 이러할 것이다/ 그와 한마을 동갑내기로 태어나 이틀 걸러 하루는 드잡이하는 것/ 세번 싸워 두번은 지는데 결정적일 때는 꼭 이기는 것/ 멀리싸기 시함을 하다가 그의 언 발에 오줌을 누는 것/ '말천천히하기' 대회에서 우승한 뒤 날로 경신하는/ 우주에서 가장 느려터진 말투로/ 그의 복장을 터뜨리는 것" ('김사인과 싸우다' 부분) 140쪽. 8천원.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