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축구와 내셔널리즘'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축구는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 더 선동적이다.
축구는 수십만, 수백만 관중을 쉽게 끌어모으고 국가와 사회를 하나로 뭉치게 한다. 하지만 이런 내적 결속력이 바깥으로 향할 때는 강한 대결의식으로 바뀌고 배타성, 공격성을 드러낸다.
신간 '축구와 내셔널리즘'(보고사 펴냄)은 현대 축구에서 드러나는 민족주의와의 강한 상관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오랜 숙적 관계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축구가 어떻게 쉽게 정치 이데올로기화하고 국가 간 대립을 조장하는지를 설명한다.

저자인 일본 스포츠 저널리스트 세이 요시아키는 일본 내 혐한(嫌韓) 조류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데 2002년 한일월드컵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지적한다.
2005년 출간돼 90만 부가 팔려나간 '만화 혐한류'의 제1화 '일한 공동개최 월드컵의 이면: 한국인에게 더럽혀진 월드컵 축구의 역사'에는, 한국 경기에 대한 오심 의혹과 한국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와 서포터의 행동이 페어플레이 정신에 반한다는 비판이 담겼다.
한일월드컵 당시 터키에 패하긴 했어도 16강전에 진출한 일본 대표팀의 성적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질 수 없는 라이벌인 한국이 유럽의 강호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을 차례로 꺾고 4강까지 진출하자 일본 축구팬들은 주체할 수 없는 질투와 분함에 휩싸였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공동개최국의 파트너십을 내세워 한국의 성과를 추켜세운 일본 TV 방송 중계는 일본인들을 더욱 격분시켰고, 갈 곳 없는 분노를 인터넷에 쏟아내게 했다.
저자는 이 같은 현상이 일본 축구의 우경화와 맞물려 있다고 본다.
1993년 일본 프로축구인 J리그의 출범은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로 접어들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축구는 경제난으로 인한 일본인들의 박탈감을 위로하는 출구 역할을 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축구에 뒤틀린 민족주의가 스며들었다는 분석이다.
저자는 경기장에서 일장기를 휘두르며 기미가요를 부르고 거리에서 하이파이브로 응원전을 이어가는 일본 젊은이들의 천진난만한 애국심에서 민족적 배외주의(排外主義)와 차별주의를 읽어낸다.
실제로 일본 대표팀을 응원하는 서포터에는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在特會)을 비롯한 혐한·극우단체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한일전은 축구가 얼마나 쉽게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착색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2013년 서울에서 열린 동아시안컵 한일전에서 안중근과 이순신 장군의 거대한 초상 현수막이 내걸리자 일본 응원단에선 군국주의 상징인 대형 욱일기(旭日旗)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잠시 뒤 한국 응원석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쓴 초대형 현수막이 나왔다.

저자는 축구가 한일 양국 간에 가로놓인 깊은 틈을 뛰어넘기는커녕 골을 더욱 깊게 하는 현실을 우려한다.
비단 한일만이 아니다. 2014년 민족과 영토 문제로 대립하는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의 축구 경기는, 알바니아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을 단 드론(무인기) 때문에 아수라장이 됐다. 양국 선수 간의 난투에 관중들까지 가세하면서 경기는 취소됐다.
유럽 축구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주의와 오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축구 선진국들의 경기장에서도 흑인차별이 일상다반사로 일어난다. 아프리카계 선수를 모욕하는 바나나가 경기장에 내던져지고, 차별적인 응원가와 구호가 등장한다.
극우주의자들이 축구장을 무대로 노골적인 배외주의 활동을 펼치고 파시즘적 성향의 민족주의를 숨김없이 드러내기도 한다.
축구는 부족주의적인 속성이 강하다.
역사서에 축구가 처음 등장하는 건 14세기 무렵이다. 당시 축구는 경계선을 정하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조잡한 공을 서로 빼앗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다치고 죽기도 해서 수차례 금지령이 내려졌다.
축구의 기원은 마을과 마을의 분쟁에서 찾는다. 일설에는 물리친 침략자의 목을 잘라 발로 차던 데서 시작됐다고도 한다.
축구가 오늘날과 같은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된 건 근대국가가 성립된 후 영국에서 정비되면서다.
19세기 산업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나온 수많은 유럽의 노동자들은 축구팀에서 고향의 대체물을 찾아냈다. 그라운드의 선수들은 고향과 마을, 정체성을 위해 싸우는 대리인들인 셈이다.
축구의 이런 뿌리는 지금까지 이어진다.
저자는 축구와 민족주의에는 강한 친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민족주의를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문제는 적의나 배타적 감정을 증폭시키는 '나쁜 민족주의'를 조장하는 데 있다.
축구에 모종의 공동체 의식이 결부되는 것을 막을 순 없어도, 그것이 배외주의나 차별주의에 경도된 국가 단위의 민족주의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실제로 지역 축구클럽의 열성 팬 중에는 국가대표 경기에 흥미를 못 느끼는 이들도 많다.
"축구 서포터는 한 해에 몇 시합이 있는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현지적인 지역의식이 중심이 된 클럽팀의 문화를 우선하는 좋은 예이다. 여기서 내셔널리즘(국가적 민족주의)은 거의 무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항하는 원리로까지 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사회철학자인 하버마스는 국가와 개인의 중간 조직, '개별사회'라는 개념을 제창했는데 실로 이것에 가깝다. 매주 주말 정해진 장소로 향해 마치 신앙을 함께하는 듯한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스타디움은 그 지방의 예배와 같은 의식이다."
신승모 옮김. 256쪽. 1만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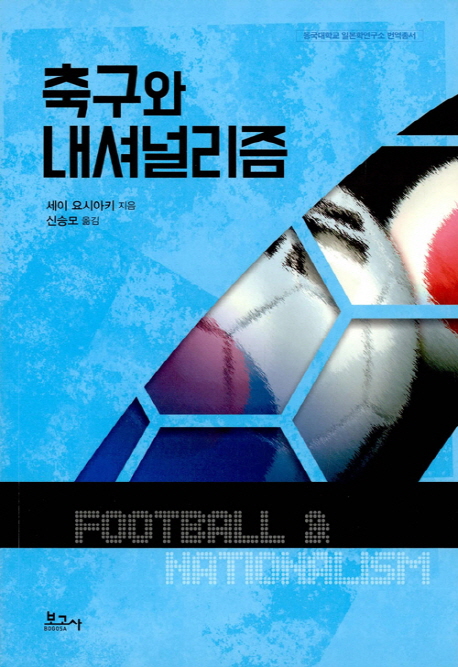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