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천 개의 태양보다 밝은'·'핵과 인간'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갈등을 극한으로 밀어붙여 타개책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핵무기는 현대사에서 어쩔 수 없는 악(惡)이자 변화를 추동하는 지렛대였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 관계에서 그랬고 최근 대전환기를 맞은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듯 핵무기에 관해 지금까지 우리가 미처 몰랐던, 혹은 잊혀 가던 역사를 되새기는 가볍지 않은 책들이 잇달아 출간돼 눈길을 끈다.
오스트리아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로베르트 융크(1913~1994)가 쓴 과학 논픽션의 고전 '천 개의 태양보다 밝은'(다산북스 펴냄)이 반세기 만에 국내 재출간됐다.

미국과 독일 핵무기 개발 과정을 최초로 다룬 이 책은 1956년 독일에서 처음 출간된 뒤 세계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958년 영어판에 이어 1961년 한국어판이 출간됐으나 오래전 절판됐다.
책은 핵무기 개발에 관여한 60여 명의 과학자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쓰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연구성과를 서로 교환하며 국제적 동업자로 지냈으나, 전쟁이 발발한 뒤 미국과 독일, 러시아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각국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소속된 과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겼다.
책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를 필두로 한 독일 과학자들이 인류애를 발휘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반면 미국 과학자들은 전쟁 승리를 위해 핵무기 개발을 완수한 것으로 묘사해 논란을 낳았다.
하지만 1990년대 공개된 연합군 문서에 의해 독일이 핵무기 개발에 실패한 건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계산 오류로 핵무기 제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탓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새로 출간된 한국어판에는 이 같은 정황을 알 수 있는, 초판본에는 없던 하이젠베르크의 편지가 실려 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두 발의 원자폭탄은 태평양전쟁에 종지부를 찍었으나 20여만 명의 민간인 희생자를 냈다.
책은 과학과 윤리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반핵 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이충호 옮김. 580쪽. 3만2천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신간 '핵과 인간'(서해문집 펴냄)은 한반도의 현대사와 국제 관계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1939년 아인슈타인의 편지부터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담판에 이르기까지 약 80년 동안의 핵무기 역사를 추적한다.
저자는 핵무기라는 렌즈로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동서 냉전, 데탕트 등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살핀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조기 항복을 끌어낸 건 원자폭탄 투하가 아니라 소련의 참전이었다는 주장을 편다. 미국의 핵무기 사용은 소련에 대한 무력시위용이었다는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도 두 강대국의 핵에 대한 맹신 때문에 일어났다고 분석한다. 미국은 핵전력에서 뒤진 소련이 북한에 남침을 지시하지 않을 걸로 판단했고, 소련은 미국이 핵전쟁을 불사하면서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책은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이 핵무기를 통해 패권을 유지하려는 쪽과 이에 맞서려는 세력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개됐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과거 한반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될 때마다 어김없이 북핵 문제가 불거졌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이번에도 극적으로 개선된 북미 관계를 미국 강경파와 군산복합체가 용인할지, 대미 불신이 강한 북한이 비타협적인 자세로 되돌아가지 않을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704쪽. 3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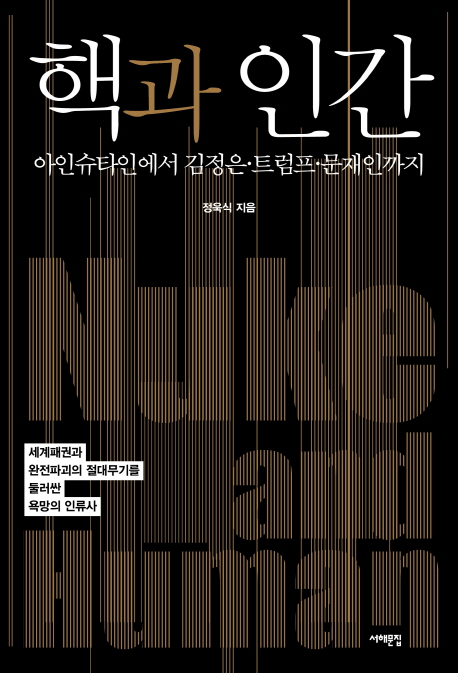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