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저명 학술출판사, '한국어 의미론의 제문제' 간행
파리7대서 한국어·문학 가르치며 후학 양성하다 2013년 별세
아버지는 영문학자 최재서…전미도서상 수전 최 "삼촌 앞에서 무능 느껴"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프랑스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다가 암으로 별세한 언어학자 고(故) 최승언(1945~2013) 전 파리 7대(디드로대) 교수의 유고집이 유럽에서 최근 출간됐다.
15일 부인인 김성혜 씨와 국민대 장석흥 교수(한국독립운동사)에 따르면 최 교수의 언어학 논문집 '한국어 의미론의 제문제'가 최근 스위스의 저명한 학술전문 출판사 '페터 랑'(Peter Lang)에 의해 간행됐다.
언어학자로서 프랑스어와 한국어 의미론을 전공한 고인이 프랑스어로 작성한 논문 모음집으로, 2013년 별세 이후 7년 만에 유고집으로 묶여 나왔다.

논문을 선별해 묶고 서문을 쓴 프랑스국립과학연구원(CNRS) 장클로드 앙스콩브르 교수(언어학)는 "최승언은 유럽에 통용되는 의미론, 즉 발화에 관한 의미론 이론을 한국어에 적용하려 한 최초의 학자"라면서 "철저함과 깊이를 지닌 논문 일부를 추려 본 연구집에 모았다"고 소개했다.
특히 "최승언이 한국언어학에 기여한 바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면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한 위대한 학자에게 이 논문집을 헌정한다"고 적었다.
이번 유고집은 출간 전 논문 심사에만 3년 이상이 걸릴 만큼 꼼꼼한 사전 독해를 거쳤고, 프랑스와 유럽의 한국학 연구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고인은 유럽 한국학계에서는 한국어 의미론 연구로 유명했지만,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한 탓에 국내에서는 이름이 그리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학자였다.
서울대 불문과 졸업 후 1969년 프랑스로 건너간 고인은 프랑스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던 중 언어학으로 전공을 바꿔 학부 과정부터 학업을 다시 한 끝에 1979년 툴루즈2대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1981년 서울대 불문과 조교수로 부임했으나 몇 년 뒤 프랑스 한국학계의 제의로 다시 도불, 2013년 건강이 악화해 숨을 거둘 때까지 파리 7대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학 담당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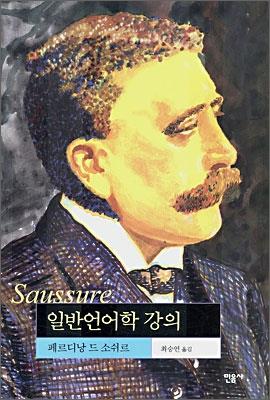
제자로는 파리 7대 마리오랑주 리베라산 교수(한국현대사), 라로셸대 에블린 셰렐-리키에 교수 등이 있으며, 고인의 재직 시기 파리 7대 한국학과는 명실상부한 유럽 한국학의 최대 산실로 성장했다.
고인은 프랑스에서 한국어를 연구하는 한편, 국내에도 서구 언어학의 조류와 기본서를 소개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였다.
그의 번역으로 국내에서 1990년 출판된 페르디낭 드 소쉬르의 명저 '일반언어학 강의'(민음사)는 출간 30년이 지나도록 언어학도들의 필독서로 여전히 널리 읽히고 있다.
고인은 영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인 최재서(1908∼1964)의 4남 2녀 중 막내다. 지난해 미국 최고권위의 문학상으로 꼽히는 전미도서상(내셔널북어워드) 소설 부문을 수상한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전 최(51·한국명 최인자) 프린스턴대 교수가 그의 친조카다.
수전 최는 작년 고인의 제자들이 엮은 추모집 '영원한 청년'(역사공간 간행·비매품)에 보낸 글에서 "그토록 걸출하게 학구적인 가문에서 났으면서도 영어 말고는 다른 언어를 하지 못하는 무능을 부끄러워할 때가 자주 있었는데, 삼촌을 처음 만났을 때 특히 많이 느꼈던 것 같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고인의 제자인 라로셸대 셰렐-리키에 교수도 추모 글에서 "한국 언어학에 대한 연구서가 거의 없던 시절, 선생님의 수업은 한국어 탐구의 '사상'을 강의로 설파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면서 "그의 명철한 분석은 우리를 한국어에 대한 섬세한 지식의 세계로 인도했다"고 썼다.

고인은 세상을 뜬 뒤에도 프랑스의 후학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부인 김성혜 씨의 후원으로 프랑스 한국학계는 2015년 '최승언 언어학상'을 제정한 데 이어 2017년에는 이 상을 '최승언 한국학상'으로 확대, 전도유망한 한국학 박사 졸업생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김성혜 씨 역시 독립운동가 서영해(1902∼1956 실종) 선생이 1929년 파리에서 출간한 '어느 한국인의 삶'을 올해 초 국내 최초로 번역·출간하는 등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남편이 떠난 빈자리를 분주히 메우고 있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