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부 보조금과는 무관한 붐…지속가능성 확보"
美 인플레이션감축법, 지나친 중국 의존은 도전 과제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유럽이 태양광 모듈 생산에 있어 중국업체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추격전에 나섰다.
2000년대 초반 세계 최대 태양광 시장이었던 유럽 최대 경제 대국 독일은 제2의 태양광 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17일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의 45%를 태양광, 수소,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확보하기로 결의했다. 2021년 기준 EU 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2%에 불과한 만큼 매년 100GW의 풍력·태양광 발전시설을 신설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는 하루에 축구장 17개 규모의 태양광 시설과 풍력발전기 20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 독일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독일은 2030년까지 전력 소비의 80%, 2035년까지는 100%를 재생에너지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법에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을 215GW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지난해까지 설치된 독일의 태양광 발전 용량이 8GW였는데, 2026년까지 연간 발전 용량을 22GW씩 늘려 2030년 215GW까지 확대하려면 역시 갈 길이 바쁘다.

토마스 그리고라이트 독일 무역투자청(GTAI) 신재생에너지 담당 부문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2011∼2012년 독일의 태양광 붐은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급속도로 일어났다"고 회상했다.
그는 "당시 독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법을 제정, 태양광을 활용해 전력망에 공급하는 1KW당 정액을 지급하는 법정가격제도를 도입하자 붐이 일어나면서 독일이 단기간에 추격이 불가능한 규모의 세계 최대 시장으로 성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독일에 솔라 밸리가 생겼고, 그곳에 관련 연구기관이 몰려들면서 아주 많은 기술적 혁신이 일어났다"면서 "다만 정부가 예산 부담으로 지원액을 줄이자 시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붐은 사그라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라이트 부문장은 "당시와 비교해 오늘날 태양광은 사람들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 설치할 정도로 저렴하고, 정부의 보조금과는 무관한 이제야 본격 시작되는 메인 스트림"이라며 "이번 태양광 붐은 저지가 불가능한 지속가능한 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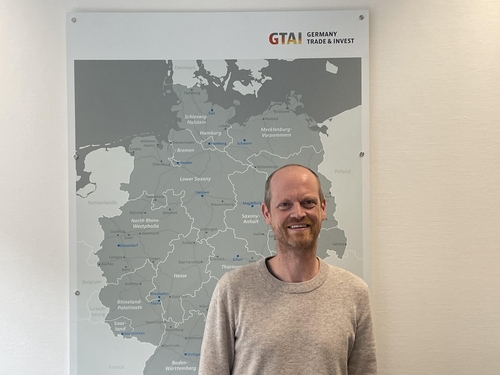
문제는 유럽이나 독일 내 태양광산업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가운데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태양광 산업의 해외 이전을 유혹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라운호퍼 태양광 에너지시스템 연구소(ISE)의 추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태양광 모듈 생산량 중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국과 캐나다는 3%뿐이고, 중국 비중은 75%, 아시아 비중은 94%에 달한다.
독일 내지 유럽의 중국 태양광 의존도는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그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기업들의 태양광 발전 용량 기술개발에 500억 달러(약 64조원)를 지원했다. 이는 유럽의 10배 이상 수준이다.
이에 EU와 독일은 자체 태양광 산업 생태계를 부활시키기 위해 고심 중이다.
EU는 2030년에 태양광산업 자체 생산 용량이 30GW에 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독일 정부도 역내 태양광 생산역량 재구축을 목표로 태양광 모듈 및 핵심 부품 제조 기업들을 유럽연합(EU) 외 제3국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 태양광업체인 중국 론지(Longi)는 이와 관련, 독일에 유럽 내 첫 공장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시장은 론지에 있어 매출 50%를 차지하는 내수 시장에 이어 매출 20%가량을 차지하는 2위 시장이다.
이 밖에 징코 등 다른 중국업체들도 유럽 내 생산공장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독일 한델스블라트는 전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