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도 안 빌리고 '번 돈'으로만 26개사 인수
돈만 좇으면 장사
사회 비합리적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변하는 과정 포착해
기회 잡는 것이 진정한 사업가
기업들이 '전공'만 집중하게
빠르게 변하는 시장 대응할 회계·IT·전략 솔루션 제공
한국기업 DNA 맞춰 컨설팅
[ 김순신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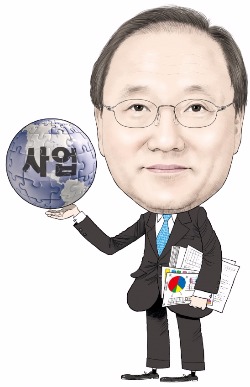 지니 로메티 IBM 회장은 컨설팅부문 총괄 부사장이던 2002년 8월 예정에 없던 방한을 결정했다. 그가 추진하던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컨설팅 인수 작업이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PwC컨설팅코리아 사장이던 최영상 메타넷 회장이 IBM 합류를 거부한 것.
지니 로메티 IBM 회장은 컨설팅부문 총괄 부사장이던 2002년 8월 예정에 없던 방한을 결정했다. 그가 추진하던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컨설팅 인수 작업이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PwC컨설팅코리아 사장이던 최영상 메타넷 회장이 IBM 합류를 거부한 것.PwC컨설팅코리아는 PwC컨설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의 33%를 담당하고 있었다. 최 회장은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한국 지사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뛰어난 인재가 모여 있는 미국 본사의 1% 능력보다 한국 직원의 100% 역량이 한국에선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틀간 이어진 회의에서도 본사의 직접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IBM과 최 회장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최 회장은 과감하게 PwC컨설팅을 떠났다. PwC컨설팅코리아 사장 때 자회사로 세웠던 메타넷을 한국을 대표하는 아웃소싱 전문 기업으로 키우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PwC컨설팅의 글로벌 이사 19명 가운데 합병 과정에서 회사를 떠난 건 최 회장이 유일했다. 그는 “한국 시장과 고객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렵다”며 “콜센터 같은 단순 업무에서 전략 컨설팅까지 국내 기업의 비(非)핵심 역량을 모두 책임질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회사를 나왔다”고 회상했다.
◆IT에 답이 있다
최 회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컨설턴트 1세대다. 컨설팅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1986년 경영·시스템 컨설팅회사인 컨설팅소프트웨어그룹(CSG)을 세우고 세계 유수 정보기술(IT)기업의 솔루션을 국내에 소개했다. 1996년부터 CSG와 PwC컨설팅의 합병을 통해 PwC코리아 사장에 올랐고, 회사를 한국 최대의 독립컨설팅회사로 키워내기도 했다.
최 회장은 과감한 도전정신을 성공 비결로 꼽았다.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이 이룬 성과를 버릴 수 있을 때 더 큰 기회가 찾아온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한국에서 경력을 쌓은 순수 국내파다. 그의 집안 형편은 항상 넉넉하지 못했다. 해군 장교로 미국에 파견됐던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최 회장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얘기다. 그는 “경남 진해라는 시골에서 공부로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연세대 경제학과에 진학한 뒤 공인회계사 시험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981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가 한 해 60명에 불과하던 시절이다. 그는 “딜로이트에서 회계감사와 세무 쪽 일을 주로 했지만 크게 흥미를 느끼진 못했다”며 “주어진 틀에 맞춰 자료를 분석하는 업무보다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에 갈증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에게 기회는 운명처럼 다가왔다. 딜로이트가 컨설팅부문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 그는 주저 없이 자리를 옮겼다. 최 회장은 “맥킨지, 보스턴컨설팅그룹 등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며 경영전략 등 여러 분야 컨설팅이 한국 시장에서 태동하던 시절”이라며 “IT가 세상을 바꿀 것으로 판단해 전공과 무관한 IT 분야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컨설턴트에서 사업가로 변신
회계사에서 글로벌 컨설팅 업체의 컨설턴트로 자리를 옮긴 최 회장은 사업가로 다시 한번 변신을 꾀했다. 자신만의 회사를 차리기로 한 것. 그는 해외에서 개발된 패키지형 IT 솔루션을 국내에 도입하면 사업도 성장하고 국내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확신했다. 최 회장은 “기업들이 자신의 회사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쓰곤 했다”며 “해외에서 개발된 범용 프로그램을 다수 회사가 각자 사정에 맞게 사용하면 기업들이 관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가로서의 여정은 꽃길이 아니었다. 최 회장은 “창업 후 직면한 현실은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던 회사와 상대하던 딜로이트 때와 전혀 달랐다”며 “수억원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에 IT 솔루션 도입의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 매일 발품을 팔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벤처캐피털도 없던 시절 창업한 회사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며 “고층빌딩 맨 꼭대기에서 일하다가 바닥으로 내려온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창업 초기 겪은 경제적 어려움은 그에게 약이 됐다. 우선 무차입 경영의 원칙을 세웠다. 최 회장은 “사업은 무조건 번 돈으로 확장한다는 원칙이 생겼다”며 “그동안 진행한 26개의 기업 인수도 금융권에서 별도의 차입 없이 회사에 쌓아둔 돈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컨설팅 업체같이 기업의 중요한 서비스 부분을 채워주는 회사는 흔들리지 않는 재무건전성을 확보해 소비자 신뢰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의 생각대로 IT는 세상을 바꿨고, 새로운 시장과 수요가 창출됐다. 최 회장은 삼성전자 등 국내 유수 기업의 디지털 혁신 과정에 참여하며 회사를 키워갔다. PwC와의 합병으로 회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컨설팅 조직으로 성장했다.
최 회장은 컨설팅회사가 성공하려면 전략적 자율성과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입 컨설턴트들에게도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지만 한국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문한다. 한국인 컨설턴트는 한국 기업과 시장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하며, 외국의 가이드라인에 동화되면 뒤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국판 액센츄어 만들 것
최 회장은 “돈을 좇는 것은 장사이지 사업이 아니다”며 “사회의 비합리적인 부분이 합리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포착해 기회를 잡는 것이 사업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은 사업가가 머릿속에 그린 그림을 조각조각 채워나가는 퍼즐과 같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PwC를 떠나 메타넷에 집중할 때 전략적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판 액센츄어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메타넷을 국내 최대 독립 비즈니스서비스 전문기업 집단으로 키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려면 핵심 역량에만 집중해도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업의 비핵심 역량이지만 중요한 부분인 회계, IT, 전략 컨설팅을 외부조달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수요는 ‘목’까지 차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여러 분야의 비즈니스서비스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2006년 전략컨설팅 업체 AT커니코리아에 투자했고, 2012년에는 시스템 통합서비스(SI) 업체 대우정보시스템을 인수했다. 지난해에는 IT 솔루션 업체 코마스를, 지난달에는 액센츄어코리아를 인수했다. 최 회장은 “액센츄어가 수행하던 전략컨설팅부문은 AT커니와 합치고, 액센츄어는 디지털 혁신과 아웃소싱을 위한 서비스 및 솔루션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해외 진출을 포함한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는 “액센츄어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하면서 한국에서 메타넷이 제공한 서비스를 세계 어디서든 사후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네트워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사업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은 10년을 보고 세월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2002년 850명이던 직원이 14년 만에 1만명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아직 퍼즐은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최영상 회장 프로필
△1959년 경남 진해 출생 △1981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1981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1982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입사 △1986~1995년 컨설팅소프트웨어그룹(CSG) 사장 △1996~2002년 10월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컨설팅코리아 사장 △2000년 메타넷 회장 △2006년 AT커니코리아 회장 △2006~2011년 전자신문 대표 △2012년 대우정보시스템 회장 △2016년 액센츄어코리아 인수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