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심기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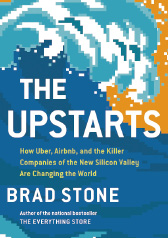 택시 매직, 카우치서핑, 홈어웨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은 우버, 에어비앤비보다 먼저 차량과 주택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치욕스럽게도 ‘퍼스트 무버’라는 호칭조차 지키지 못했다. 기업 가치가 10억달러가 넘는 성공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뜻하는 유니콘의 호칭도 물론 갖지 못했다.
택시 매직, 카우치서핑, 홈어웨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은 우버, 에어비앤비보다 먼저 차량과 주택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치욕스럽게도 ‘퍼스트 무버’라는 호칭조차 지키지 못했다. 기업 가치가 10억달러가 넘는 성공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뜻하는 유니콘의 호칭도 물론 갖지 못했다.이유가 뭘까. 최근 출간된 《업스타트(Upstarts)》는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책이다. 우버를 창업한 트레비스 캘러닉이나 에어비앤비를 설립한 브라이언 체스키가 앞선 회사의 최고경영자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던 걸까.
저자의 주장은 “아니다”이다. 에어비앤비의 초기 회사 이름은 공기 매트리스로 오해하기 쉬운 ‘에어베드(Air Bed)’로 불렸다. 우버는 사업 초기 엉뚱하게도 고급 리무진 서비스를 지향했다.
승패는 실행력에서 갈렸다. 머뭇거림은 혁신을 잃는다는 확신 속에 이들은 공유 서비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정한 뒤 시장을 주도하는 데 집중했다. 시장을 넓히기 위해 초기 손해를 감수했고, 당국의 허가는 기다리지도 않았다.
혁신은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다. 규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른바 ‘사전예방’이라는 원칙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나 신규 사업을 제한하기 마련이다. 두 회사의 성공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하나로 모으는 플랫폼을 활용해 규제와 싸우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규모의 경제’를 창출했다는 데 있다. 저자는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도시마다 사업 승인을 요청하고, 규제당국이 기존 택시나 호텔업계에 의견을 받도록 기다렸다면 폭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의 부제는 ‘실리콘밸리의 킬러 컴퍼니,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세상을 바꿨나’이다.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는 규제되지 않는다. 확신을 갖고 도전하라. 블룸버그통신에서 실리콘밸리의 테크기업을 취재해온 저자 브래드 스톤이 “규제 때문에 못해 먹겠다”는 예비 창업자에게 주는 메시지다.
뉴욕=이심기 특파원 sglee@hankyung.com
관련뉴스














